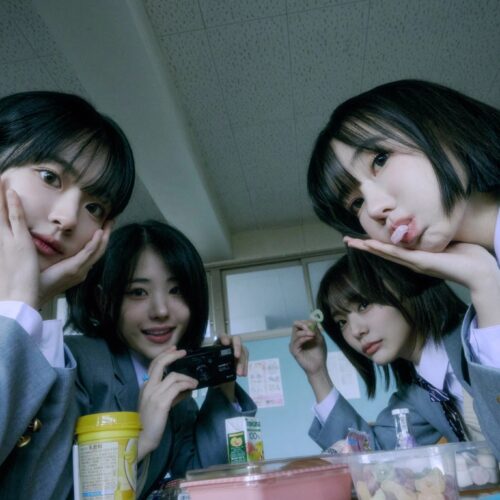7개월 동안 이강모로 살았다. 이제, 이범수에겐 자신만의 세리머니를 즐길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생겼다.

“혹시, 이 컷을 쓰실 거면 제가 자세를 바꿔서 한 번 더 가볼까요?” 사진을 확인한 이범수가 말했다. 그럴 때마다, 얼굴 근육이 조금씩 살아났다.
의상 협찬/ 와인색 터틀넥, 와인색 벨벳 재킷, 검정색 바지는 모두 장광효 컬렉션.
당신을 만나기 전, 몇몇이 일러줬다. ‘이범수 까탈 맞다’고.
나는 좋은 컷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됐다고 하는데 한 컷 더 찍으려고 하고, 이 옷이면 되는데 다른 옷 찾고 그러니까…. 내 표현으로는 ‘귀찮은 사람들’이, 나를 까탈스럽게 본다고 치부한다.
‘울어달라’는 부탁에 2분 만에 훌쩍거렸다. 실례라고도 생각했다.
아니다, 흔쾌히. 배우니까.
‘배우’라는 말이 잔인하지 않나?
외롭긴 하다. 혼자 짊어져야 하니까. 대신할 사람은 없다. 군중 속에 있으면 외롭지 않다. 하지만 주목을 못 받는다. 외로움을 혼자 맞서는 희열을 즐겨야지. 철저한 내 몫, 내 책임.
그럴 때 쾌감을 느끼나?
맞다. 군대라면 총사령관이 결정을 내린다. 반격을 하느냐 마느냐. 하면 일이 커지고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결정들. 옆에선 해라 마라 떠든다. 그때 결정하는 사람이 ‘이걸 어째?’ 그래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안 있으면 되는 거다. 사병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건 주인공만이 느낄 수 있는 거다. 스트레스 아니다. 그게 스트레스라면 배우 그만둬야지.
종방 직후 당신의 연기대상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이 당신에게도 쓰이기 시작했다. 조바심이 일지 않나?
재밌는 거다. 멋을 내고 싶을 땐 뭔가 막 내고 싶다. 근데 잘못하면 추석에 때때옷 입은 것 같을 때가 있다. 너무 의도적이라 뻔해 보인다. 어쨌거나 브랜드도 알게 되고, 멋을 즐기면서 10년, 20년 세월을 보내면, 운동복에 운동화 신어도 스타일이 나온다. 추석 때때옷 같은 패션을 연기에 비유하면 ‘확확’하는 화려한 연기다. 큰 역을 맡고 싶은 조바심이 20대 후반에 있었다. 하지만 난 연기를 전공한 사람이다. 내가 두고두고 연기를 한다면, ‘이번이 멋진 역할 아니면 다음에 맡으면 어때?’ 이런 거. ‘올해 하는 거랑 내년에 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런 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다. 나한테 스스로 감사한다.
그래서인가? <자이언트>의 당신 얼굴에선 뭔가 가셔 있었다. 흥분 같은 게.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누구는 90미터부터 뛰었다. ‘어쩌자는 거야, 지금? 뭐, 시비 거는 거야 뭐야?’ 그런 마음이었다. 누구는 처음부터 주인공이었다. 이유도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아나? “저 배우가 느낌이 좋아서”다. 머리로는 인정했는데 가슴으로는 못했다.
그 ‘느낌’을 용납 못했나?
꽃미남의 기준이 딱 있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꽃미남이 아닌 사람들의 생존법을 공부할 텐데. 농락당하는 것 같았다. 오디션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저쪽이 ‘간지’ 좋잖아” 이러고 가는 거다. 말이 좋아 개성파고 감초지, 안타까움이 왜 없겠나? 나는 액션이든 코믹이든 가진 게 더 많아서 그랬던 거다. 그러다 그쪽은 수학만 잘하지. 나는 영어, 국사도 잘하고 수학으로 붙었을 때도 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다시 한 번 가졌다. 무척 기쁜 순간이었다.
<외과의사 봉달희>?
이게 재밌는 얘기다. 나는 패션을 아주아주 좋아한다. 그런데 튀기 싫어서 사놓고 안 입고 그랬다. 어느 날 옷장을 열었는데 2년 전에 산 옷을 한 번도 안 입어 고물이 됐다. 그때 생각했다. 화려하고 싶어서 이 길을 택했는데, 좀 입어야겠다. 그래서 평소에도 수트를 입게 됐다. 그런 것을 경쾌하게 즐기고 싶었다. 영화배우니까.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싶었다. 패션, 운동, 멜로. 삼박자가 <외과의사 봉달희>에서 맞은 거지. 그러면서 영역이 넓어졌다.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다. ‘아 그 배우, 이웃집 오빠 같아.’ 그건 옆집 오빠를 보면 된다. 그 배우만의 마력, 기운, 설렘 같은 거. 배우는 멋스러워야 한다.
미디어는 당신을 화려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프라다 수트, 페라리….
좋아한다. 100퍼센트 맞는데, 전부는 아니다.
스포트라이트,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 그 희열에 실체가 있었나?
홈런 타자가 딱 때리는 순간, 이건 넘어갔다 싶은 그런 희열이 있다. 정말 감사한 건, 그때 내가 야구의 지존이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다.
그럼 무슨 생각을 했나?
이 순간을 즐기자. 내일 당장 노골만 날릴 수도, 삼진 아웃을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축구선수가 세리모니를 하는 순간, 홈런 친 다음에 그라운드를 돌면서 뛰는 희열은 당사자만 느낄 수 있는 거다. 홈런 치고 겸손해서 막 뒤통수 긁적이는 것도 촌스러운 거고, 골 넣었는데 환호성 안 치고 쑥스러워하면 그것도 촌놈인 거다. 느끼고 즐기고 흠뻑 젖을 수 있는 건, 내가 배우기 때문이다. 프라다든 톰 포드 수트든 입는 순간 즐길 수 있는 거다. 보타이 매고 시상식장의 흥취를 느끼는 건 내가 배우라서 할 수 있는 세리머니다. 하지만 반바지 입고 콜라 사러 가는 내 모습도 사랑하는 거다. 자유롭고 싶어서 배우를 택했다.
재능을 완전히 발휘하면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나?
누가 “너는 왜 영화배우가 됐냐?” 물었을 때, 영혼이 어쩌구 뭐 그러면 나는 헛소리라고 한다. 아니, 그냥 열일곱 살 때 <영웅본색> 주윤발이 멋있어 보였다.
당신은 지금도 열일곱 같은 구석이 있다.
물론. 열일곱 살짜리가 무슨 심오한 뜻이 있어서 배우를 택했겠나? 거짓말이다. 화려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멋. 당시 할리우드 배우들의 당당함. 그런 것들을 흠모했다. 그러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다. ‘연기라는 게 단순히 찧고 까부는 게 아니구나.’ 왠지 모를 숭고함, 사명감, 순수도 있었다. 그러다 사회 나왔는데 또 아닌 거다. 사회가 원하는 건 나 같은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았다.
진심으로 뭘 하려는 사람들이 잘 팔리지는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더 빠르다.
내가 중대 연극영화과에서 <햄릿>으로 막 칭송받았던 건 정말 ‘댁 사정’이었다. 여기서는 대형 기획사에서 만든 이미지가 최선이었다. 혼자 맨발로 뛰는 게 나의 최선이었다. 최선과 최선이 맞붙은 건데, 당시 그런 배우들이 다 주인공이고, 나는 30만원짜리 배우였다. 그래도 그게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았다. 젊은날의 고뇌이고 진심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는 말이다. 그 주인공들이 나보다 연기에 대해 더 많이 고민했고, 고민의 흔적과 결정이 보이고, 나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나 학식이 뛰어났다면 내가 추종했을 거다. 그러지 못했다. 그건 절대적인 거였다. 아니 카페에서, 무슨 당구장에서 일하다가 명함 주면서 너 잘생겼으니까 와 봐, 그런 걸 내가 부러워해야 하는 건가?
그런 우연, 부러워한 적 없나?
전혀. 오히려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빨리 날 알려야 한다 생각했다. 저것이 ‘O’면 여기도 ‘O’라는 것에 대한 주장이고 어필이고 외침이었다.
최신기사
- 에디터
- 정우성
- 포토그래퍼
- 김보성
- 스탭
- 스타일리스트/ 김봉법, 헤어/ 영석(포레스타), 메이크업/ 이가빈(포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