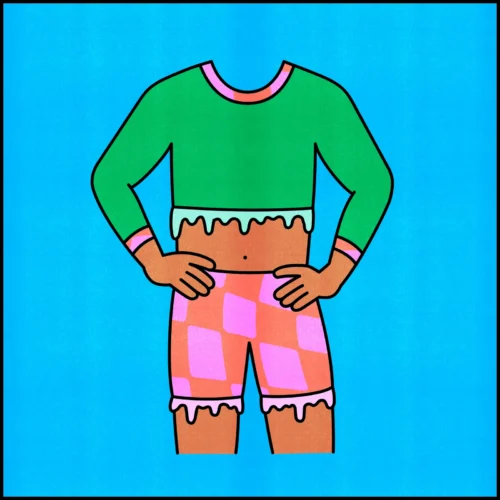“부릉 부르릉! 할리라예!” 김꽃두레가 등장할 때, 보는 사람은 세포까지 웃었다. 그런 캐릭터는 생전 처음이었고, 이렇게 예쁜 안영미도 처음 봤다.

의상 협찬/ 검은 레이스 상의는 에스까다, 속이 비치는 귤색 스커트는 곽현주 컬렉션, 팔찌는 엠주, 반지는 스와로브스키, 레이스 장갑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안젤리나 졸리 피곤한가? 아, 졸리 피곤하다.
당신이 나올 때, 관객들은 이미 웃을 준비가 돼 있었다. 왜 하필 김꽃두레가 그렇게 좋았을까? 내 옆에는 없어도 한 번쯤 만났던 캐릭터라서? 그렇게 생각없고 철없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으니까? 누가 봐도 마르고 한 대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여자애가 막 “할리 타고 왔다” 그러고 터프한 척, 남자인 척하는 게 귀여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미소지나와 김꽃두레의 공통점은 벽돌 같은 자의식이다.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데서 완전 형편없어서 떨어졌는데, ‘심사위원들이 실수한 거다. 난 반드시 톱스타가 될 거다’ 그런 애들 같은. 그들을 보는 심정은 복합적이다. “쟤 왜 저래?” 싶다가도 귀엽기도, 가상하기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하. 그런 것도 있었을 거다. ‘아메리카노’는 유일하게 여자만 있는 팀이니까, 처음에는 측은하게 ‘쟤네들이 할 수 있을까?’ 불안불안 보다가 우리가 확실한 캐릭터를 갖고 연기에 빠지니까 가상하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고.
환호와 미디어의 관심, 이런 인터뷰. ‘분장실 강선생님’ 직후에도 그랬다. 익숙해졌나? 진짜 어색하다. ‘분장실’ 때 너무 힘들었다. 연락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 막 하면서 “너 왜 요새 이렇게 연락이 없냐?” 그랬다. 돈 꿔달라는 사람도 많아지고, 정작 챙겨야 할 사람들을 못 챙겼다. 나는 ‘개콘’이라는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였는데, 버라이어티며 여기저기 나가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꾸준히 하다 깨달았다. 나중에 ‘그때가 좋았어’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쁜 걸 즐겨보자. 어디 언제까지 바쁜가 한번 보자.
마하트마 간디를 오랜만에 찾아봤다. 그 잔 근육…. 안영미 연관 검색어가 간디다.
일상, 여행, 심리 테스트 좋아하는 미소지나와 깡마른 남자 간디, 나쁜 남자 히틀러 좋아하는 김꽃두레의 취향은 미디어가 생각하는 어떤 트렌드에 대한 경쾌한 조롱 같았다. 혹은 대중에 대한 풍자. 약간 마니아적이었다. 우리는 약간 찾아보게끔 만들고, 나만 저 개그를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고고 예술속으로’ 때 그랬다. 마니아가 많았다. 팬카페도 있었고, 디씨 인사이드 가면 ‘안영미 여신’ 막 난리가 났다. 근데 갑자기 분장실로 떠버리니까 그 팬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아, 나만 저 사람 안다고 하고 싶은데, 이제 너도나도 다 잘 아네. 그럼 안 좋아할래’ 그럴 땐 좀 서운했다.
‘아메리카노’는 대중과 마니아가 같이 가는 느낌 아닌가? 그랬으면 좋겠다. 난 마니아적인 게 더 좋다. ‘여배우들’ 보고 대체 그게 무슨 개그냐 그럴 때도 마니아들은 있었다.
김미려, 정주리, 안영미 세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상승작용이 있나? 미려 언니는 정말 세부에 강하다. 외모도, 어떤 캐릭터를 할 땐 평소에도 진짜 그 모습이 돼야 한다. 나는 “어… 간디 작살…’ 했는데 관객이 웃는다. 그러면 거기 완전히 빠져서 계속 애드리브로 간다. “아니 나도, 후… 열흘 굶어봤는데, 그 몸매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애드리브를 난 기억 못한다. 내뱉고 본다. 미려 언니는 대사의 억양, 뉘앙스까지 기억해 둔다. 나는, 김꽃두레를 사랑하게 되니까 더 거기에 빠졌다. 정말 연극하듯, 나한테만 핀 조명이 떨어진 것처럼. 관객이 나한테 집중하는 게 너무 좋았다. 관객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 했다. 한 번도 양세형을 본 적이 없다.
그건 감각일까, 계산일까? 계산해서는 웃길 수가 없다.
<코미디 빅리그>는 개그 무대가 그야말로 진검승부라는 걸 대중이 짐작하게 만들었다. 관객이 코미디를 보는 시선에 존중이 생겼다. 무대에서도 느끼나? 우리도 느낀다. 그런데 개그를 할 때 관객만 보고 하는 건 아니다. 선수들이 보고 웃을 수 있는 개그도 있고, 방송 관계자들이 좋아하는 개그도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웃음을 시도하는 것 같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지는 순간은 어떤 기분인가? 말 그대로 ‘뽕 맞은’ 기분? 하하. 아플 때도, 사람들이 우릴 보고 웃으면 명약이 필요 없다.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리허설 때 못 살렸던 개그를 무대에서 살리는 경우도 많다. 없던 애드리브도 나오고.
김꽃두레도 애드리브로 터진 게 있었나? (눈을 뒤집으며) 유우후~.
정말? 그게? 리허설 때 없었다. ‘간디 작살…’ 하다가 ‘후우… 제임스 본드, 아, 막 우정 끈끈이…’ 하는데 관객이 웃어주는 거다. 이해 못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지 (다시 눈을 뒤집으며) “유우~후~”가 그냥 나와 버렸다. 웃음은 신기한 에너지다.
최신기사
- 에디터
- 정우성
- 포토그래퍼
- 안하진
- 스타일리스트
- 박지석
- 메이크업
- 이가빈
- 헤어
- 윤지
- 어시스턴트
-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