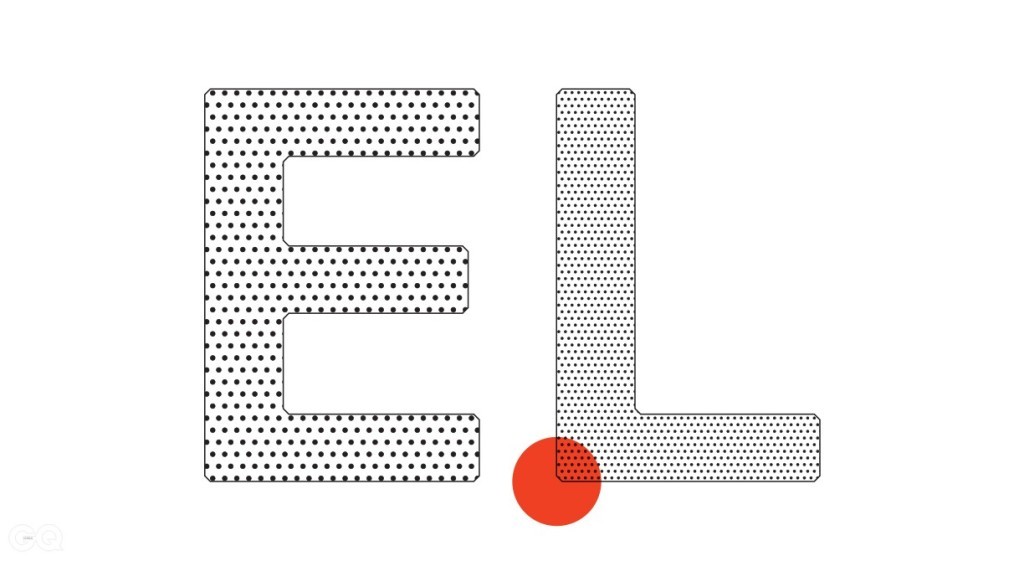1976년, 나디아 코마네치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이단 평행봉을 전기 뱀장어처럼 휘감다가 눈금자보다 정교하게 착지했을 때, 기계체조 역사상 최초(이자 일곱 번)의 만점이라는 위업을 낚아챘을 때, 눈 멀 것 같은 올림픽의 광채를 처음 느꼈다. 졸업식 날 울거나, 밤새도록 축구를 보거나, 공연 티켓을 구하자고 내년까지 줄 설 만큼 열이 많지도 않으면서 벤 존슨, 알랭 웰스, 린포드 크리스티…, 올림픽 100미터 결승 우승자 이름을 다 외우는 게 코마네치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
스타디움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고쟁이까지 벗어 던지진 않겠지만, 올림픽은 일단 시작되기만 하면 확실히 고조되는 어떤 순간이 있다. 모든 인간적 시도의 선봉에 선 이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경외심, 영광의 순간에 보이는 기념비적인 품행, 국가의 자부심과 공존하는 세계적 단결 사이의 모순, 왜곡된 유머, 묘기보다 공교로운 재능, 경기가 끝난 후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순수한 기쁨, 긴장과 스타일의 황홀, 영웅이 악당의 허를 찌르는 순간에 때맞춰 펄럭이는 국기…. 사람들이 스포츠에 진정 열광하는 건 카리스마와 일순간 잡아 끄는 매력일 텐데, 정말 그럴 땐 국적이고 뭐고가 문제되지 않는다. “스포츠 따윈 보지 않는다”는 인권주의자, 수면제 같은 개회식을 전염병인 양 피하는 지식인도 곧 태권도 규칙에 정통한 전문가가 되기 일쑤다. 이런 순간에는 올림픽 이전 준비 단계의 어떤 것 -인권, 오염, 실력을 증진시키는 약물들- 은 경쟁적 드라마의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분명 올림픽은 국가적 촉매제다. 스포츠 성과 측면으론 말할 것도 없다.(금메달 하나를 다른 메달 천 개보다 더 쳐주는 편협함으로) 1984년 LA에서 금메달 6개였던 한국이 1988년 서울에선 12개나 땄다. 심지어 스페인은 서울에서 금메달 하나에 그쳤으나, 4년 뒤 바르셀로나에선 13개나 거머쥐었다. 그러고 보면 올림픽 개최만큼 자국의 스포츠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없다.
한편, 한 나라가 올림픽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얻는 게 고작 ‘과시’ 뿐일 리가 없다. 선수가 더 빠르고 높고 강하라고 압박 받듯이, 올림픽은 국가적 잠재력의 최고치를 요구 받는다.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도시는, 달력에 경기가 열리는 그해의 2주밖에 없는 듯 형질이 변한다.(하지만 올림픽이 끝나도 4년의 나머지 206주가 있다!) 몇 년 후에나 있을 여름 스포츠 행사를 위해 소스라치듯 구조물을 세우고, 콩 구워 먹듯 방임되었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올림픽의 낙관이 경제 전반을 뒤덮는 건 행정가들만의 기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라고 더할 것도 없다. 영국 정부에도 런던 올림픽은 모처럼 국력 신장의 결정적 한 방이다. 여름 관광에 미칠 영향,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익 예측치, 문화적 지평을 덩달아 넓힐 축제라는 통계는 연일 기사화된다. 더불어, 광고 홍수가 지하철역과 2층 버스를 강타할 테고, 올림픽 특수를 맞은 호텔들은 숙박비를 올릴 테고, 안 그래도 도로 사정이 파리나 마드리드보다 후진데 우회로까지 늘어 오토바이조차 진저리를 칠 테고, 온갖 법석이 본즈나 옥스퍼드 거리에 돈을 떠안길 때 죽어나는 건 택시 기사 뿐일 테고….
이 모든 국가적 몰두는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런던 올림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뿌리 깊은 숙제를 마술처럼 지우리라는 것이다. 올림픽은 늘 그 나라의 문제를 마주하기보단 피하게 만들고,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원죄를 가리고, 국가가 떠안기 싫어하는 문제를 대신 짊어졌다. 과연, 기회주의적 정부의 클래식으로서 올림픽과 월드컵만 한 게 없다. 엑스포? 택도 없다. (올림픽은 또한, 시민의식을 갱생시킴으로써 ‘사회 화합’의 지지대로 활용된다. 해가 되는 메카니즘에 봉착해 구태스럽게 정부의 능력에만 기댄 도시도 있고, 시민 참여라는 포퓰리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은 시드니도 있다. 그렇다면 베이징 올림픽의 진짜 별은 ‘새의 둥지’ 운동장이 아니라, 중국인의 열광일 것이다. )
현대 올림픽은 페어플레이를 주창한다. 사람들은 스포츠에 진정한 헌신을 고대한다. 단순성 위에 내면의 심각함이 깃들고, 지적인 이들을 집중시키는. 즉, 올림픽의 성공엔, 그게 웃기는 서커스라는 냉소를 반전시킬 만한 플레이가 필요하다. 베이징 올림픽 200미터 결승에서, 한 세기를 통틀어 가장 큰 영광의 끝자락을 보여준 우샤인 볼트처럼. 하지만 아무리 올림픽의 열기에 델 것 같아도, 모두의 관심 밖인 종목이 있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라커룸도 있다. 운동에는 경쟁이 필수적이며, 여전히 메달 획득에 따른 국가적 위상이 단순한 참가보다 중요한 세태라면, 연민 같은 건 아무 의미 없겠지만….
올림픽이 성공했는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렸다. 그 2주가 개최국을 환골탈태시킬지는 나중 문제다. 모든 발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대체로 거의 언급되지 않은 주제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신기사
- 에디터
- 이충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