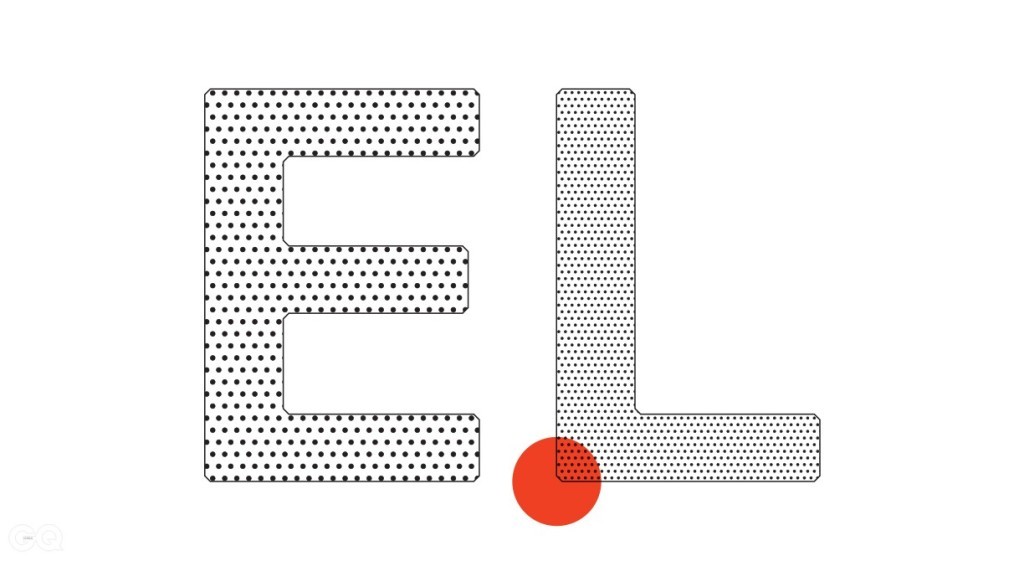이번 올림픽에서 엄청 감격스러우면서도 새삼스러운 광경을 몇 번이나 보았다. 선수들은 환희와 낙담의 순간마다 두 팔을 벌리곤, 단 하나의 몰두로 서로에게 달려갔다. 조성동 감독과 양학선, 정재성과 이용대가 몸을 구부려 불길에 타버리듯이 꼭 껴안을 때, 포옹만큼 남자의 감정을 읽기 쉽게 만드는 행위도 없다는 걸 알았다. 골을 넣고 동료들의 팔 위로 점프한 박주영한테선 포옹만 한 공동체 경험도 없다는 걸 배웠다. 그렇다면 1997년 NBA에서 38점 차로 유타를 이겼을 때 스카티 피펜의 팔에 뛰어든 마이클 조던이나, 같은 해 마스터즈에서 우승한 뒤 아빠 팔에 안겨 울던 타이거 우즈를, 프로페셔널한 선수의 퇴행으로만 설명하진 못할 것이다.
예전엔 공적으로건 사적으로건 포옹은 상상도 못했다. 누군가 슬쩍 제스처만 보이면 도망가기 바빴다. 하지만 이젠 다들 악수나 작별 인사론 배고파한다. 포옹의 집산지, 영화제 시상식은 아니더라도 여자끼리의 약한 포옹, 쇄골과 뺨이 만나는 정도의 접촉은 차라리 심드렁해졌다. 악수가 손을 잡음으로써 무기 은닉 여부를 드러내는 행위라면, 포옹이야말로 완전한 무장해제 아닌가.(그런데 배부른 채 수트와 넥타이 차림으로라면 터질 듯 옷이 당기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포옹은 장려된 캐주얼 산업의 음모 아냐? ’ 혼자 소설을 쓰는 것이다.)
한편 기계적 인사로서의 신체 접촉은 비즈니스 관계를 관통한다. 그런데 그게 정치에서만큼 교묘하고 알뜰하게 활용되는 데도 없다. 얼굴이 개기름으로 번들대는 인간 오일뱅크, 천연 정유재벌 정치가들이 포옹할 땐 속을 드러내지 않고도 웃는 공갈빵의 진수를 본다. 아무튼, 포옹은 분명 개인적 기쁨과 환영의 수단이며, 두 사람이 진정한 우정에 도달하기 위한 경계선을 넘었다는 걸 증명하지만, 액취증 작살인 친구에겐 그게 잘…. 아무리 분리와 통합, 증오와 사랑, 정치에 맞선 개인적 영역과 인종적 역경을 이해한다고 해도, 복잡한 사회 현실에 대한 실용적 타협을 생각할 줄 안다 해도, 별 수없이 차별주의자가 되고만다. 그래도 나만 그런 건 아니었음 좋겠다.
어쩜 포옹은 최신 유행이자 클래식 같다. 하지만 어떤 어른은, 자기 인생엔 포옹이란 두 글자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독립운동 하듯 못 박았다.(우리나라에 그렇게 축제가 많은데도 국민 포옹 축제가 없는 건 그런 분들 때문이야.) 그래도 속으론 매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를 한 번만 안아주세요.’
결국 포옹은 이문화 집단의 거주지 안에서 소수가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행동인 것이다.
제대로 사과하는 법
그쪽에서 먼저 사과를 청했지만, 아직은 안 돼, 거절했더니 곧 다시 사과했다. 내 대답은 “글쎄”가 다였다. 빨리 한 사과는 곤란해. 그걸 받아들이면 쉬운 사람 되는 건 한순간이지…. 그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원체 무신경해 나를 언짢게 할지 몰랐다고 했다. 글쎄? 단순히 그 한 마디로? 내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자 불상사가 일어났다. 내가 사과를 묵인했다고 제 멋대로 맛대로 생각한 것이다. 흠….
나를 화나게 한 딴 친구는 “미안. 근데 뭐 ‘그런 일 갖고’ 그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 일 갖고’라고? 내가 미숙하단 얘기잖아? (“사람이 아니므니다”, 이렇게 말할 걸.) 어떤 술집에선, 웬 여자가 창 같은 힐로 내 왼쪽 발을 짓이겼다. “어머, 미안해요.” 하나도 안 미안한 얼굴. “그걸론 안 되죠.” “네? 그게 무슨…?” 모르는 척하기는. 그 말도 ‘물론 미안하겠지. 그니까 내 발가락에 얼른 빌어’라고 하려다 참은 거다, 이 분아!
상대에게 무심코 저지른 실수건 아니건 우린 늘 불충분하고 부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그때마다 사과의 본성, 후회의 정도, 용서의 한계, 회개의 단계에 대해 고민한다. 결론은, 어떤 사과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 쩔쩔매는 척해봤자 속이 훤히 보인다는 것. 내가 찾은 사과의 핵심은 이것이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그러나 사과하는 태도가 다음 국면을 결정한다.
주유소
주유소 직원이 운전석으로 와 기름을 얼마나 넣을지 물을 때면, 어렸을 땐 왜 그렇게 주유소에서 일하고 싶었을까, 생각한다. 기름이 채워지는 동안 직원은 내 신용 카드를 들고 사라졌다 곧 나타나선 클릭 소리가 나자마자 기름 호스를 확 잡아뺐다. 한여름, 후추 같은 가솔린 냄새가 천지에 휘날렸다.
주유소 직원은 항상 더워 보이고, 유독한 물질을 다루는 데다 시급도 적을지 모르지만, 묵직한 호스와 파이프가 찰스 브론슨의 콧수염보다 멋졌다.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리는 몰랐지만, 차 유리에 비누거품을 내 걸레질을 하거나 보닛 밑을 확인하는 일만큼 거친 일도 없는 것 같았다. 책 만드는 일이 하찮게 느껴질 때도 차에 기름 넣는 일만큼은 인간사에 없어선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진짜 열광했던 건 주유소 일의 능률적인 절차, 순수하리만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전 과정이었다.
그해 여름 깨달았다. 사람들은 기름을 필요로 하고, 유독한 물질을 다루는 힘찬 주유소 직원에겐 고시촌 밥집 아줌마처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최신기사
- 에디터
- 이충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