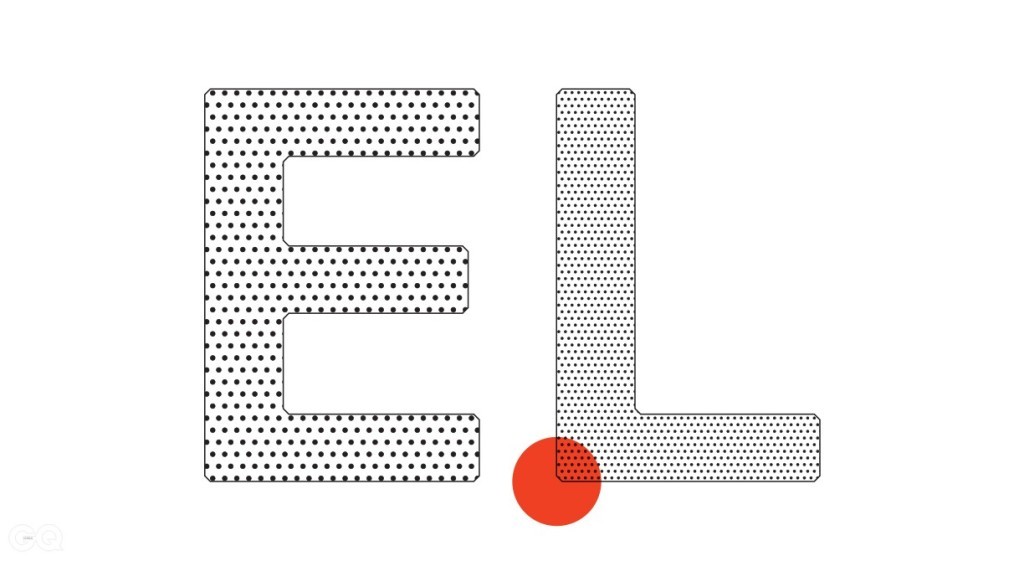비와 당신의 이야기
생각해보면 남자 패션에서 우산만큼 무시되는 아이템도 없다. 자꾸 잃어버리고 툭하면 고장 나서? 하긴, 방금 전에도 택시에 삼단 우산을 두고 내렸다! 그런데 아무리 코트로 치장해도 후진 우산을 든 사람을 보면 왜 갸웃거려지는 걸까? 지팡이가 문화의 상징인 영국도 아닌데 아름다운 우산을 든 사람을 보면 저이는 섹스도 품위 있게 하겠지,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건?
좋은 우산은 펴보면 안다. 일본의 특제 나일론 소재 우산을 펼칠 때, 밤새 내린 눈을 처음 밟는 소리…. 그리고 수작업으로 깎은 목재 축의 우아함과, 손잡이의 쾌적한 감촉. 잘 닦여서 윤이 나는 놋쇠 물미와, 무딘 광채가 나는 은 플레이트의 오묘한 기품.
아끼던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완 참 다르다. 다른 사람이 내 우산을 펼쳐 성난 비바람을 막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애매하게 분한 일도 없지 싶은 것이다.
빅 데이터의 왕국
이제 12년 전 <GQ KOREA> 창간 무렵은 상상할 수 없다. 그땐 너무나 미개했다. 스마트폰도 없었다. 옷과 헤어스타일, 자동차와 식단은 지금과 다르지 않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 모습은 모든 시대와 공존하는 우주적 아우라를 지녔다.
2013년의 시대 정신은 영혼 없는 시간의 홍수 속을 헤맨다. 시간 여행을 위해 구글을 헤짚고, 사력을 다해 더 똑똑한 기계를 찾는다. 기계야말로 제일 순한 비서이며 가장 힘센 구원이라서. 즉, 이젠 모두가 과학적인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포함한 어떤 분야에서조차 중요한 의사 결정은 데이터와 분석에 맡긴다. 세포 단위까지 보는 현미경이 측정법의 혁명이었다면,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실시간 중계하는 데이터는 현세의 현미경인 셈이다.
한때 경험이나 직감은 아주 중요했다. 이젠 그냥 그렇다. 지리도 마찬가지다. 세계 역사는 국가의 운명을 정한 산과 강과 평원 사이의 끝나지 않는 충돌. 충돌을 만든 것은 지리. 모든 영토의 윤곽은 지도에 그려져 있었다. 세상은 인구를 가두는 날카로운 봉우리와 좁은 골짜기, 그들을 풀어주는 넓은 평원과 수로로 이루어진 입체지도였다. 그러나 지도를 따지는 것은 19세기의 박제된 주제이다. 지금 지리는 무의미해졌다. 지도는 더 이상 물리적 영역에 속해 있지 않고, 공간적 인류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대엔 문자가 왕정이나 서기관들만의 권능이었듯이 빅 데이터는 현생 인류의 계기판이자 지도가 되었다. 비유전적인 문화 요소이고, 마케팅 용어인 동시에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며, 금이나 환율 같은 경제적 자산이기도 하다. 이때 소셜 미디어와 모든 매체로 유입되는 데이터는 감정, 욕구, 열망, 관련성을 도표화하고, 전에 없던 인간 상호작용을 대변한다. 그야말로 새로운 사회 발견 아닌가!
수백만 개로 교차하는 작은 세계를 추적하는 지금, 인간 은하계도 저 하늘의 별만큼 빽빽하다. 이게 우리가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끌려가고 있다는 방증인가? 글쎄, 우리는 자신을 통제한다고 믿지만, 통제는 늘 사회의 손에 쥐어진 마지막 분석자료 안에 잠시 쉴 뿐이다. 우리는 곧 자유를 맛보기도 전에 데이터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테크놀로지는 본질적으로 나르시시즘의 형태를 띤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엮여 있다면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 더 단순하거나 더 가벼운 테크놀로지로도 안 된다. 테크놀로지는 전염되는 문화이기 이전에 역사적인 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별의 방식
21세기 초반의 삶, 우리가 바라는 것엔 어떤 표준이 있다. 히치콕 류의 괴물 천재, 무한한 카리스마로 무장한 스타, 미친 위험을 감수한 퍼포머, 자신만의 개념과 형태로 비꼬고 풍자하는 예술가…. 문화가 가랑이까지 열리고 세계가 실성한 듯 혼합되는 요즘,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들엔 특별한 맛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고전 작품의 세심한 목록들, 가장 훌륭한 문화 형태라고 믿었던 것들의 황금시대는 사라졌다. 희비극적인 시대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을 괴롭히는 장대한 비관주의만 가득할 뿐이다.
모두가 서둘러 과거와 이별을 고하는 감각의 제국엔 규칙이 새로 생겼다. 옛날에 대해 말하지 마.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즐거운데 몇 시간 동안 세상과 멀어지게 하는 옛날 것들은 싫어…. 새날은 늘 지난날보다 좋으니 추억은 과거의 시체이며 아무 짝에 쓸데없을 뿐. 그러니 내가 낡은 극장에서 <더 도어즈>를 보며 지옥 문으로 떨어진다 한들 누가 신경쓸 것인가?
하지만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과거는 우리를 다시 끌어당긴다. 욕망 위로 어렴풋이 나타나 또 다른 미래를 만든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문화를 계속 지배한다. 숫자로 압도한 데이비드 보위의 전시, 반전 그 자체인 조용필의 앨범 판매…. 상업 영화가 이미 성공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건 옛 영광이 그리워서가 아닌가.
결국 최신 유행이란 없다. 특정한 시대가 현재를 지배하지도 않는다. 그 보상으로 우리는 어제의 아방가르드를 재현한다. 우리가 원하는 괴물들은 모두 잠이 든 채로….
최신기사
- 에디터
- 이충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