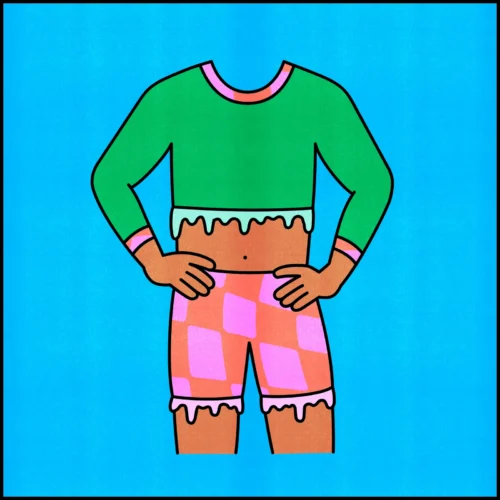이야기를 잘 ‘쓰는’ 작가. 정유정이 그렇다. 정유정이 얼마나 잘 쓰는 작가인가에 대한 소문은 떠들썩하다.

이야기를 잘 ‘쓰는’ 작가. 정유정이 그렇다. 정유정이 얼마나 잘 쓰는 작가인가에 대한 소문은 떠들썩하다. <7년의 밤>을 2011년 최고의 한국 장편소설로 고르는 사람도 여럿이다. 그의 신작 장편 <28> 역시 재미와 흡인력으로 독자들을 한달음에 소설 끝까지 이르게 한다. 이번에는 ‘빨간 눈’이라 불리는 인수공통전염병이 퍼진 서울 인근 가상 소도시 화양이 배경이다. 이야기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자료 조사도 탄탄하다. 정유정의 장점은 여전하다.
하지만 작가의 재능과 소설의 가치가 늘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전작 <7년의 밤>에서 은근하게 드러난 우려가 <28>에서 조금 더 커졌다고 말해야겠다. 이야기의 설정은 더 웅장해졌고, 그 설정 아래 인물과 사건이 기능적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너무 잘 짜려한 탓에 이야기는 곧 뻔해진다. 물론 이런 변호도 가능하겠다. “인수공통 전염병은 설정과 미끼일 뿐이고,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죽음과 맞대면한 존재들의 공포와 광기, 사랑과 존엄, 절망과 희망”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인간내면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작가는 이런 문제를 ‘다수’의 내면 제시로 대신한다. 등장인물들이 내면과 외면에서 분주히 움직이더라도, 어떤 기능에 따라 동원될 뿐이다. 그렇게 <28>의 등장인물들은 평면적이고 전형적이다. ‘설정과 미끼’라는 소설적 낭비가 용인되는 것은 그 낭비를 통해 직면하게 되는 삶에 대한 소설적 발견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개의 낭비는 치장이나 실수, 더 고약하게는 마케팅일 뿐이다. 크게 판을 벌였으면, 어떻게든 수습을 하는 게 좋다.
어느 인터뷰에서 정유정은 말한다. “내가 힘이 세야 이야기를 장악하고 내가 만든 세계에 인물들을 풀어놓고 조절할 수 있거든요.” “힘이 없으면 캐릭터가 제멋대로 돌아다녀요.” 비록 독자가 이야기의 힘에 이끌려 소설을 따라가더라도 인물들을 더 알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는다. 사람은 대개 알면 알수록 알 수 없고, 알 듯 모를 듯하고, 안다고 치부했다가 전혀 모르기 십상이다. 하지만 정유정의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들은 너무 쉽게 인물형이 포착된다. 독자가 생각하고 개입할 빈틈을 주지 않는다는 특성은 동시에 치명적인 단점이다. 이야기를 잘 ‘쓰면Write’ 독자를 소설에 빠져들게 하지만, 잘 ‘쓰지Use’ 않으면 독자에게 여운은 남지 않는다. 헐겁게 잘 짜인 이야기, 촘촘하게 성근 이야기의 가능성을 작가는 아직 못 믿는 것 같다. 이미 충분히 작가적 재능을 보여준 정유정이 “장악”과 “조절”의 욕심에서 벗어나 “캐릭터가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둘 수 있는 여유를 갖기를 바란다.
그리고 <28>과 관련해 ‘광주’를 꺼내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작가가 작업을 얼마나 철저히, 충실히 준비했는가와 얼마나 소설의 의미 지평을 넓힐 수 있는가를 드러내 보이고 싶더라도. 치사율이 100퍼센트에 이르는 인수공통전염병, 그에 따른 도시 폐쇄 조치와 ‘광주’는 어떻게도 닮아서는 곤란하다. 치명적인 병과 광주를 엮어내는 것은 광주를 다른 방식으로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닐까. ‘광주’를 작가 스스로 엮어 말하면, 광주를 마케팅으로 잘 ‘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지도 모른다.
스스로 장악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야기의 기능적 측면에서, 정유정은 누구보다 자신 있겠지만,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넘어선다. 독자에게 다가가고 읽히는 순간 의미의 지평도, 이해도, 해석도, 모두 작가의 손을 떠난다. 역설적으로 이야기의 힘은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두껍고 폭넓게 살아난다. <28>의 인물들은 화양과 함께 이야기 안에 봉쇄되어 있다.
최신기사
- 아트 디자이너
- illustration / Kim So Yeon
- 기타
- 글/ 박준석(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