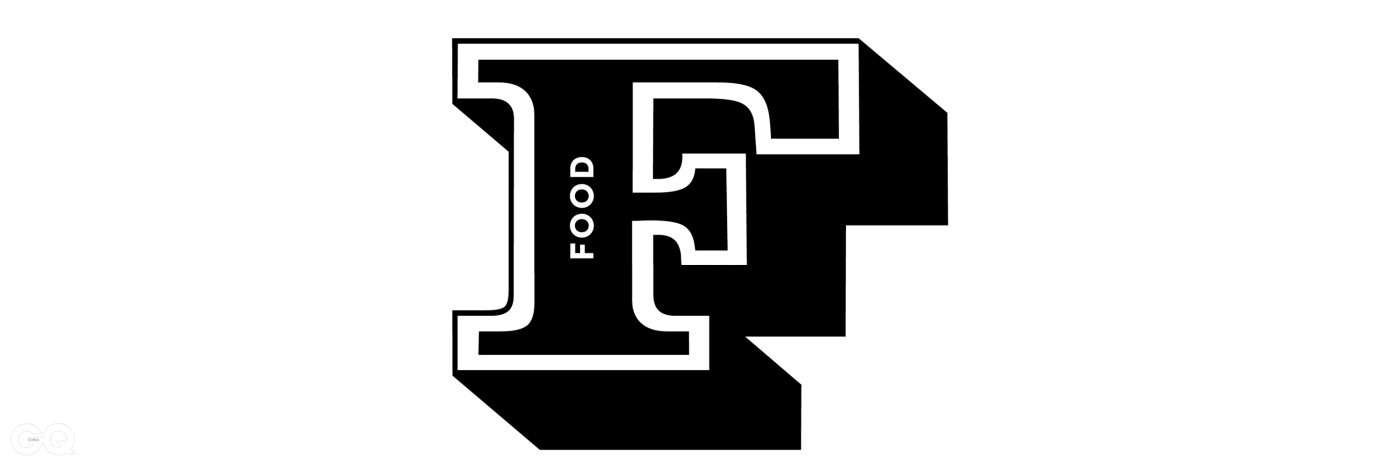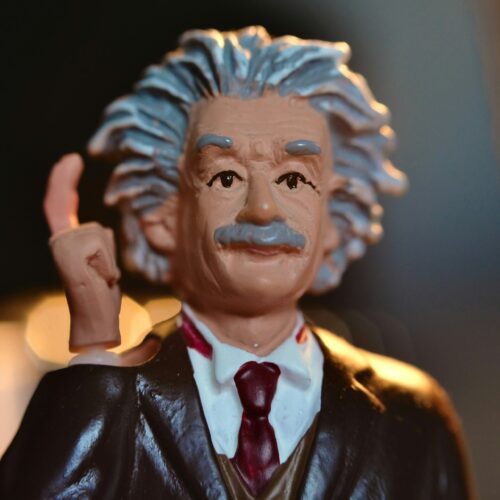술 취해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종업원에게 화를 내는 것만이 추태가 아니다. 모두를 괴롭히는 별별 손님들의 요구에 레스토랑이라는 좁은 공간이 바짝바짝 말라간다.
우아한 중년 여성들이 무리 지어 청담동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걸어 들어온다. 널찍한 테이블 간격, 커다란 샹들리에, 깨끗한 식탁보, 정중한 종업원이 있는 레스토랑이다. 평일 오후 1시가 조금 지난 시각. 중년 여성들의 여유로운 발걸음, 잔잔한 웃음소리, 단정한 옷차림엔 무엇 하나 거슬리는 데가 없다. 메뉴판을 덮고 주문하기 전까진. “이 레스토랑에는 왜 파스타가 안 되나요? 우리 파스타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종업원은 판매하지도 않는 메뉴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한다. 프렌치 요리와 이탤리언 요리의 차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다 언짢은 표정의 손님에게 다시 사과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실제로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몇 번 반복 됐다. 이 레스토랑은 요즘 점심에 한해 파스타 메뉴를 판매한다.
종업원에게 반말하고, 술 취해 상을 엎다가 힘에 부쳐 토하고, 일부러 음식값을 내지 않기 위해 맛을 트집 잡고, 블로그에 올려주는 대가로 공짜 음식을 요구하고, 메뉴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내가 누군 줄 알고”라는 말을 실제로 하고, 양념통이나 기물을 훔쳐가고, 2인분 같은 1인분을 내주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기어이 화장실이 막히게 만들고, 밥 먹다 애인에게 차였다고 잔을 집어 던지고, 이 모든 추태를 부리고 돌아가서 레스토랑 평가에 악플을 다는 것까지….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이런 망나니 행패만이 추태 손님의 전부는 아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들려오는 진짜배기 추태 손님의 일화는, 이보단 우아하지만 한층 더 막무가내인 경우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자신의 취향을 정답인 것처럼 우기는 손님, 음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손님이 응대하기가 가장 까다롭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앞서 예를 든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의 사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한 프라임립 전문점의 셰프는 손님들의 곤혹스러운 요구에 이골이 났다. “로스트 비프인데, 겉면이 바삭하게 익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손님이 꽤 많아요. 스테이크 같은 그릴 요리가 아닌데, 익숙한 음식이 아니다 보니 이해를 잘 못한 거죠. 거기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서도 그릴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프랑스 음식 크레이프 전문점을 운영하다 최근에 사업을 전환한 한 대표는 한국에서 익숙하지 않은 요리일수록 취향을 우기는 손님이 많다고 전한다. “‘내가 아는 크레이프는 이 맛이 아닌데, 이 집 크레이프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평가해요. 한두 번의 경험으로 얻은 취향을 전체로 확장시키는 거죠. 사실 크레이프는 우리나라 된장찌개처럼 집집마다 특색이 다른 거라 그런 말이 성립되지도 않는데도요.” 이런 유형의 손님은 바에도 있다. 특히 요즘 여기저기 생겨나 클럽만큼이나 인기가 좋은 싱글 몰트위스키 바에서는 잘못된 위스키 정보로 바텐더와 말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손님은 지인이 옆에 있으니 자존심을 굽히기 싫어하고, 저는 잘못된 정보를 되묻는데 일부러 틀린 말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전화로 오늘 바에 남자 손님들 물 좋냐고 물어보는 여자 손님들보다 더 골치 아픈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한남동의 한 위스키 바에서 일하는 바텐더가 말했다.
‘나만 소중해’ 정신으로 무장한 채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손님의 경우 피해의 파장이 좀 더 넓다. 레스토랑 예약 문화를 좀먹는 ‘노쇼’ 문제는 지난해부터 서서히 공론화되기 시작해 카드 정보 기재, 선입금 등의 대체방법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는 있다. 하지만 노쇼 손님 위에 나는 추태 손님이 있다. “예약을 할 때 인원수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론 두 명인데 여섯 명이라고 말하고선 큰 테이블을 잡거나 룸을 선점하는 거에요. 왜 두 명만 오셨냐고 물으면, 나머지는 곧 도착한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요. 다른 손님들은 알 바 아니라는 식이죠.” 서초동의 한 대형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매니저가 말했다. 바에서는 하루 저녁에 자리를 대여섯 번씩 옮기는 손님들도 있다. 다양한 자리에 앉아 바텐더의 모습도 즐기기 위해서다. “재킷을 벗지 않고 앉아서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바쁘니까 코스 요리를 한 번에 내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점에서 훨씬 낫달까요?” 한남동 한 레스토랑 매니저가 말했다.
가장 흔하지만, 뿌리 깊은 추태 손님의 또 다른 유형은 한마디로 정리된다. “여긴 왜 안 돼요?” 레스토랑마다 서로 다른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는 말이다. 이건 ‘밥은 오른손으로 먹을 것’, ‘팁을 줄 것’과 같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예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레스토랑에도 영업 방침이 있다. 작지만 엄연한 규칙이다. 이 작은 인식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무심코 추태 손님이 될 수 있다. 당당하고 강력하게 커피나 빵 리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레스토랑 영업 방침에 따라, 커피를 내리는 방식에 따라 리필이 공짜인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6년째 가로수길과 서래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레스토랑의 대표가 말한다 “커피 리필이 마치 모든 식당에서 통용되는 서비스인 양 요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패밀리 레스토랑도 아니고, 패스트푸드점도 아닌데 그건 좀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게다가 안 된다고 설명하면 왜 기분이 나쁘다는 건지…. ” 일행 중 한 명의 생일이라며 케이크를 들고 식당을 찾는 것 도 마찬가지다. 그게 가능한 식당도 있고, 디저트와 케이크류가 메뉴에 올라와 있어 외부 음식이 반입되지 않는 식당도 있기 마련이다. 제재를 가하면 손님들은 쉽게 화를 내고 식당에 불친절 딱지를 붙이고 만다. “몬테스 알파 와인이 도대체 왜 없어요?” “여기 브레이크 타임이 왜 있는 거죠?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콜키지 비용 드린다는데도 왜 와인 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왜 음악이 없어요? 음악 좀 틀어주세요.” “예약하겠다는데 왜 예약제로 운영 안 하시는 겁니까? 예약 없이 갔다가 자리 없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레스토랑의 자체 규율에대한 존중이라곤 없는 말들이다.
물론 레스토랑을 위협하는 별별 손님 이전에, 말도 안 되는 요상한 레스토랑도 존재한다. 도대체 서비스 정신이라는 말은 음식물 쓰레기 통에 처박았나, 싶은 종업원도 많다. 원산지를 속이고, 정량을 속이고, 아예 맛을 속이다 손님들에게 혼쭐이 나는 식당도 있다. 하지만 추태 손님과 추태 식당이 만나 막장 스토리를 펼치는 일은 잘 없거니와 그 자체가 진짜 문제는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괜찮은 레스토랑일수록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에게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더 문제다. 레스토랑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방식이 오히려 추태 부리는 손님을 양산하는 꼴이 될 때도 있다. 이런 손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큼이나 금전적으로도 레스토랑에 큰 피해를 입힌다. 떼쟁이 아이 때문에 어른 등골이 빠지는 격이다. 그 에너지를 온전히 주방으로 돌릴 수 있다면 지금보다 진일보한 음식 문화를 그릇 위에서 확인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최신기사
- 에디터
- 손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