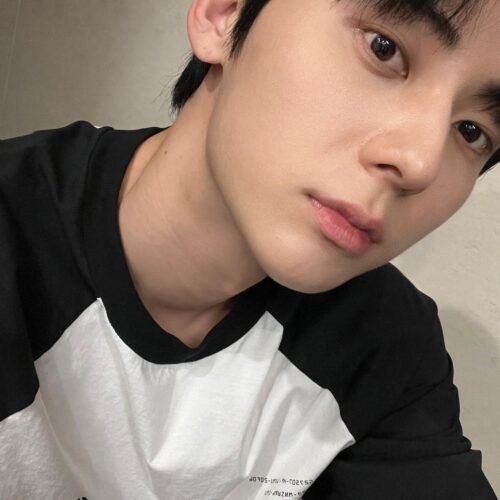벤틀리 컨티넨탈 V8 S를 몰고 미국 샌디에이고를 달렸다. 기존 컨티넨탈 V8보다 힘차고 단단하며 자극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편안했다.

샌디에이고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서부의 도시. 하늘은 일 년 내내 맑고 대기는 건조하다. 기다란 해안을 따라 짙푸른 바다가 넘실댄다. 파도가 유난히 격한 해안엔 서퍼가, 물결이 잔잔한 항구엔 항공모함이 아무렇지도 않게 떠 있다. 이런 경치를 배경으로, 해안가 언덕배기엔 고급 식당과 호화 별장이 즐비하다. 컨티넨탈은 벤틀리의 명실상부한 그랜드 투어러다. 장거리 여정에 잘 어울리는 차라는 뜻이다. 넉넉한 실내와 편안한 승차감, 강력한 성능이 특징이다. 이런 차들은 화끈하게 비싸고 아찔하게 빠르다.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이런 장르의 모든 차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문은 딱 두 개만 달고, 한껏 멋을 낸 호화 자동차다. 쿠페를 기본으로, 여닫을 수 있는 직물 지붕을 씌운 컨버터블도 있다.
엔진은 V8 4.0리터와 W12 6.0리터다. 모두 가솔린 트윈 터보다. 공기를 압축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를 두 개씩 갖췄다. 덕분에 같은 배기량으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벤틀리는 이 두 가지 엔진을 기본으로 출력을 촘촘히 나눴다. V8은 507마력, V8 S는 528마력, W12는 575마력, GT 스피드는 625마력이다. 구색별로 다양한 엔진을 갖출 수는 없는,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의 똘똘한 묘안이다.
시승차는 컨티넨탈 GT V8 S였다. 지난 가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데뷔했다. 컨티넨탈 V8을 기본으로 터보의 압축률을 높여 21마력을 더 뽑아냈다. 항시사륜구동과 8단 자동변속기가 기본으로 장착된다. 앞바퀴 부근의 ‘V8 S’ 배지는 기본적인 V8과 구분할 수 있는 명백한 단서다. 킹피셔 블루와 모나코 옐로는 V8 S에만 적용하는 전용 색깔이다. 다른 모든 세부는 V8과 완전히 같다. 모로 눕힌 숫자 ‘8’과 같은 모양의 머플러도 그대로다. 그릴을 제외하면 W12 엔진의 컨티넨탈 GT와도 차이가 별로 없다. 네눈박이 테두리에 LED를 촘촘히 둘렀다.
격자무늬 그릴은 더욱 곧추세웠다. 부딪쳤을 때 보행자의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닛과 펜더가 만나는 곳은 날카롭게 접었다. 벤틀리가 스스로 ‘앞날개’라 칭하며 자랑해 마지않는 부위다. 용접 없이 한 판의 알루미늄을 섭씨 500도까지 가열한 뒤 한 방에 ‘쾅’ 찍어 만드는 방식이다. 실내는 가죽과 원목, 알루미늄 패널로 고루 꾸몄다. 원목은 반짝이는 피아노 블랙으로 칠했다. 큼직한 가죽 시트는 그대로 벗겨서 몸에 걸치고 싶을 만큼 고급스럽고 부드럽다. 손으로 쓰다듬으면 마음이 다 포근해진다. 시트의 모양은 성난 코브라 목덜미를 닮았다. 좌우로 펼친 날개가 허리를 지그시 잡아준다. 열선과 통풍 기능은 기본이다. 뒷문은 없다. 하지만 뒷좌석도 의외로 편안하다. 터치스크린 모니터에는 내비게이션을 띄운다.
시승 코스는 샌디에이고와 줄리안, 팜 스프링스와 데이나 포인트를 잇는 560킬로미터 구간이었다. 그랜드 투어링 카의 특성을 감안한 길고 한적한 동선. 이 코스를 따라 컨티넨탈 GT V8 S를 몰면서는 이 차의 거대한 덩치를 까맣게 잊었다. 들쑤시고 쥐어짜는 느낌 없이 팍팍 튀어나갔다. 컨티넨탈 GT V8 S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 가속을 4.5초 만에 마친다. 최고속도는 시속 309킬로미터다. 한편, 벤틀리의 백미는 역시 변화무쌍한 배기음이다. 가속페달을 밟을 때마다 웅장하고 기름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V8 S의 음색은 W12보다 한층 괄괄하다. 컨티넨탈 GT V8과의 성능 차이는 가속보다 몸놀림에서 두드러졌다. 관절과 근육이 더 탄탄하기 때문이다. 그 단단함이 그대로 느껴졌다. 앞뒤 스프링을 각각 45, 33퍼센트 더 단단하게 다졌다. 그 결과 차체도 지면과 10밀리미터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조였는데도, 컨티넨탈 GT V8 S는 비슷한 성능의 라이벌보다 여전히 편안하다. 여느 벤틀리처럼 자극을 강조했지만 긴장은 도려냈다. 게다가 528마력은 정말이지 강력하다. 가속페달에 얹은 발가락만 꼼지락거려도 압도적인 힘이 펑펑 솟는다. 승차감은 스위치로 조절할 수 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온몸의 근육이 아주 살살 녹는다. 그야말로 ‘궁극의 그랜드투어러’다.
누군가는 이런 성격을 컨티넨탈 GT의 한계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페라리처럼 냉정하게 운전자를 가리지 않는다. 람보르기니처럼 튀는 외모도 아니다. 포르쉐처럼 기계적으로 탐구할 여지도 많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폭넓고 고급스러운 취향과 공격성, 편안함까지 포괄하는 성격이야말로 벤틀리가 부활에 성공한 비결이자 장점이다. 평소에는 스트레스 없이 운전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그 어떤 차보다 빠르다. 게다가 그 성격 그대로 비싸며 화려해서 누구나 가질 수는 없는 차를 원하는 부자는 항상 많기 때문이다. 지금, 벤틀리는 승승장구 중이다. 지난해 1만 1백20대를 팔았다. 창사 이래 최대 기록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의 판매가 살아나고 있어요. 한국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영국 벤틀리 본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로빈 필은 이렇게 말했다. 국내 공식 수입, 판매원은 벤틀리 서울이다. 지난해 1백64대를 팔았다. 2006년 한국 진출 이후 최고 실적이다.
위기를 견디고 얻은 결실이어서 더욱 값졌다. 벤틀리 판매는 2007년 1만 대를 넘기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듬해 주저않았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이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변수여서 충격은 더욱 컸다. 벤틀리 직원들은 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전 직원이 10퍼센트의 급여 삭감에 동의했다. 수당 없이 잔업에도 나섰다. 직원도 더 이상 뽑지 않고 버텼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바꾸지 않았다. 신차 개발 일정이었다. 자동차 제조사가 불황을 헤쳐 나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고급 세단 뮬산이 예정대로 데뷔했다. 컨티넨탈 시리즈 역시 제때 2세대로 거듭났다. 마침 경기와 판매 곡선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신차 효과까지 가세했다. 그렇게 벤틀리는 제2의 전성기, 그 한복판에 있다.

벤틀리의 고향 벤틀리는 영국 크루에서 태어난다. 맨체스터 공항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다. 벤틀리는 뮬산을 뺀 전 차종의 최고시속이 300킬로미터를 넘는 초고속 차. 하지만 만드는 속도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느리다. 조립 라인을 통틀어 로봇도 10여 대뿐이다. 공장에선 하루 20대 안팎의 벤틀리를 만든다. 직원은 4천여 명으로 주 4일만 근무한다. 작업 공정별 시간은 12분에 달한다. 보통 2~3분인 일반 양산차 공장과 크게 차이가 난다. 수작업 공정이 많기 때문이다. 우드 패널 만드는 과정에서 느림의 미학은 절정을 이룬다. 우선 나무 한 그루에서 가장 상태 좋은 부위를 박편으로 썰어 3주간 말린다. 그리고 다시 절반으로 쪼개 0.6밀리미터 두께의 패널을 만든다. 여기에 겹겹이 칠을 하고 광을 낸다. 벤틀리가 명차로 인정받는 건 품질에 대한 남다른 고집 때문이다. 가령 우드 패널은 탈색과 염색을 거치지 않는다. 원래 나무의 무늬와 색을 고스란히 재현한다. 또한, 북유럽에서 방목해 키운 황소 가죽만 고집한다. 피부에 모기가 물거나 울타리에 긁힌 상처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내에서 금속성 광택을 띤 부위는 도금한 플라스틱이 아닌 진짜 금속이다. 벤틀리는 뮬산 한 대의 실내를 꾸미는 데 황소 16~17마리 분의 가죽을 쓴다. 가죽은 37시간에 달하는 바느질을 거쳐 벤틀리의 뽀얀 속살로 거듭난다. 스티어링 휠에 가죽을 씌워 꿰매는 데만 15시간이 걸린다. 나무는 한 그루에서 4제곱미터만 추려 5주에 걸쳐 가공한다. 벤틀리는 나무 한 그루를 벨 때마다 묘목 한 그루를 심어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벤틀리의 승승장구 돈이 돈을 번다. 장사도 부자를 상대해야 큰돈을 만질 수 있다. 월터 오웬 벤틀리는 이 같은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1919년 그는 영국에서 벤틀리를 세웠다. 고성능 경주차와 주문제작 차에 집중했다. 최고의 레이스였던 프랑스 르망의 우승컵을 휩쓸었다. 그런데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됐다. 벤틀리는 직격탄을 맞았다. 사면초가 벤틀리를 껴안은 건 롤스로이스. 구원의 손길은 아니었다. 벤틀리라는 브랜드는 살려뒀지만 롤스로이스의 스포츠 버전으로 철저히 각색했다. 벤틀리의 모진 운명이 시작됐다. 불과 창업 13년 만이었다. 롤스로이스와 벤틀리는 뼛속부터 다른 차였다. 롤스로이스는 정교하고 세련됐다. 완벽주의로 똘똘 뭉쳤다. 벤틀리는 호쾌하고 거칠었다. 그 시절 벤틀리에는 정체성이 없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나 기회가 왔다. 벤틀리는 다시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모기업 롤스로이스의 자동차 사업이 불황을 못 이겨 매물로 나오면서다. 폭스바겐과 BMW가 벤틀리 인수전에서 맞붙었다. 결국 폭스바겐이 벤틀리 상표권과 롤스로이스 공장을 거머쥐었다. BMW는 롤스로이스란 무형의 브랜드만 샀다. 하지만 벤틀리도 백지 상태이긴 마찬가지.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던 롤스로이스를 지워야 했다. 폭스바겐은 벤틀리를 철저히 연구했다. 짧고 강렬했던 여명기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폭스바겐은 벤틀리를 다시 정의했다. 찬연한 후광을 만들어냈다. 폭스바겐 품에서 벤틀리는 대박을 냈다. 지난해는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1만 대를 돌파했다. 성장률이 19퍼센트에 달했다. 60여 년간 정신과 육체를 지배했던 롤스로이스를 보란 듯이 앞섰다. 공교롭게 지난해 롤스로이스도 역대 최고 판매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3천6백30대로 벤틀리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최신기사
- 에디터
- 컨트리뷰팅 에디터/ 김기범
- 기타
- COURTESY OF BENT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