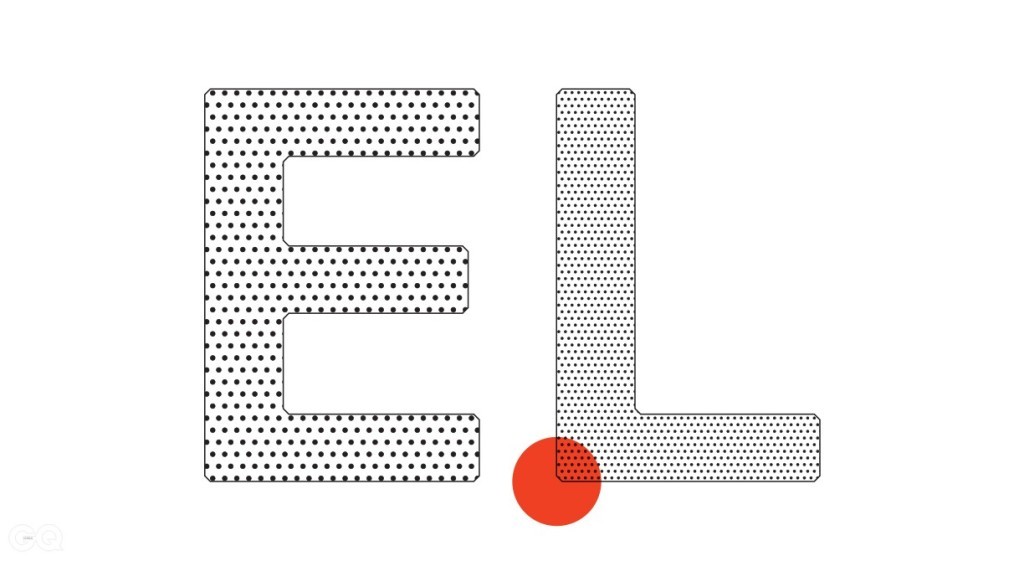올가을, 뜻하지 않게 병을 얻어 한 달 남짓 입원하게 되었다. 그때 느낀 상념은 얼추 이런 것들이었다.
1. 우주가 쏟길 듯이 어지럽다. 침대 기울기를 30도 이상 올릴 수도 없으니 누운 채 눈을 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2. 친구들은 왜 문병이 아니라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소풍을 오는 걸까.
3. 문병 온 에디터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을 생각하니 하나같이 좋아서 퇴원하고 나면 한동안 화내지 못할까 봐 그게 화가 나.”
4. ‘그때 그 사람’이 심수봉에게 “기타를 쳐주고 위로”해주던 병실은 어느 병원에 있을까. 병실이면 의료진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렸을 텐데, 어떻게 기타를 쳤지. 병실이 교회처럼 넓었을까 아니면 산골짜기에 병실 하나만 있었을까.
5.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이 괜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주저하며 노크하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속도, 병실로 들어서는 몸짓의 주춤거림, 전력투구하여 기미를 살피고 그 순간 연민을 드러내는 각자의 방식, 그 와중에도 사랑 받아야 채울 수 있는 문병객들의 결핍과 데미지….
6. 어떤 땐, 문병 와서 자리에 앉는 순간, 얼마쯤 있다가 가는 게 적절한지 헤아리는 친구들의 소극적인 초조도 예뻐 보인다.
7. 환자복도 멋지다는 걸 보여주려면 몸에 딱 붙게 입어야 하나.
8. 위로 혹은 격려하는 법에 서툴러도 너무 서툰 어른들은 하나같이 매력 없는 아저씨 고양이 같다.
9. 왜 간호사 아저씨는 “제일 아픈 게 10이고, 하나도 안 아픈 게 0이라고 할 때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하고 물어놓고, 내가 6.8이요, 하고 대답하니, 뭔 소리 하고 자빠졌냐는 듯이 “네에?” 소리를 지르는 건지.
10. 지금 여기가 우주의 끝인지 지표면 260킬로미터 아래인지, 살아서 온 연옥인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헛것 같다.
11. 다른 사람들이 위에서 부감으로 나를 내려다볼 때,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기만 하는 각도의 이상한 층위.
12. 스티브 호킹보다 내 처지가 좀 나은가 싶었으나 그는 하녀도 있고 기계도 잘 다루고 돈도 많다. 게다가 나는 스티븐 호킹의 우주를 쥐뿔도 모른다. 생각나는 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겠는데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다는 단발마뿐.
13. 나는 발자국 소리 하나, 침대를 툭 치는 무심한 울림 하나에도 머리에 물리적인 타격이 낱낱이 가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들 부주의한 건지, 어떻게 그렇게들 방심하면서 지들끼리 하하호호 즐거울 수 있는지 좀 많이 놀랍다.
14. 매일이 타인을 배려하는 진짜 센스에 대해서 외롭게 탐구하는 시간이군.
15. 한 친구는 말했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동안 보던 것들을 뒤돌아보게 될 거라고. 그 친구는 열두 살. 지혜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16. 단지 서 있기만 한다는 것, 혹은 누군가를 쳐다본다는 단순한 행위에 얼마나 복잡한 메커니즘이 기능하는가를, 당연한 것이 마냥 당연할 수 없다는 진실을 세포 단위까지 느낀다. 세속의 극단을 헤엄치는 나에겐 좀 드문 영적인 시간들.
17. 그러고 보니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오래 술을 안 마신 적이 없었구나. 태어나 제일 믿을 수가 없다. 자다가 깨었다가 다시 기절할 만큼.
18. 내일은 꼭 나는 법을 배워서 날아야지, 하며 앞뒤 재지 말고, 그냥 지금 확 날아야지. 인간은 약하고 결심은 쓸모없고 정신성은 남루하다. 금방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최신기사
- 에디터
- 이충걸 (GQ 코리아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