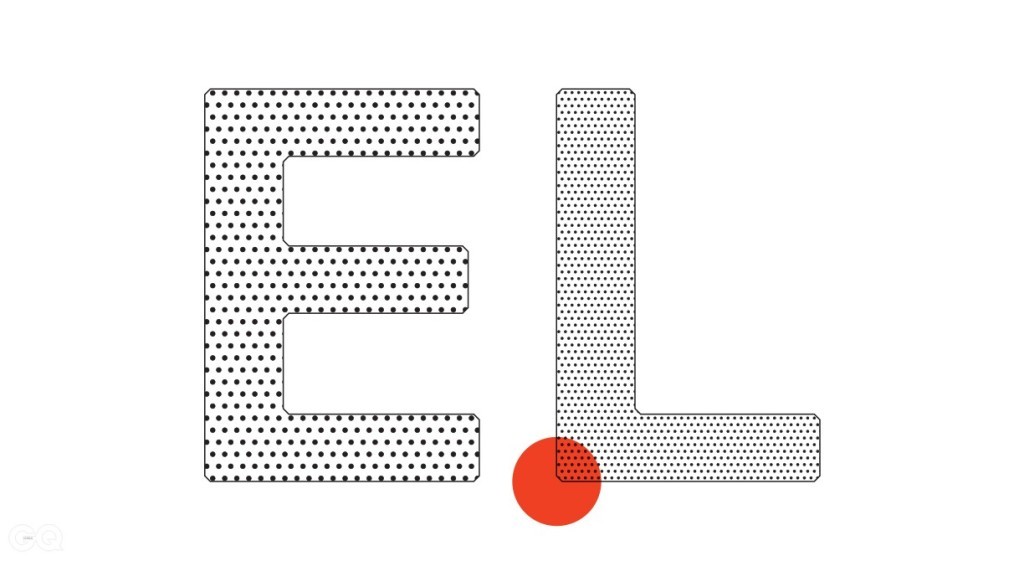잡지를 만드는 시간은 인생처럼 드라마틱합니다. 동시에 인생처럼 하찮고 재미없기도 합니다. 진실은 더 깊고, 더 신비로우며, 어느 면에선 더 끔찍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들여다보며 순간적인 침묵으로 뛰어들어 보지만, 조증 같은 환희도 협심증 같은 감격도 없군요. 지금까지 저는 서기書記로서, 여태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후일담이라거나 모든 추억을 담은 최상의 아카이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GQ가 누구의 발도 닿지 않은 미개척 분야를 긁어 모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영웅처럼 보일까, 모든 짐을 지고 비탈을 오른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망상의 영역, 지하 게토에 살면서 스타일의 세계를 비집고 들어가던 ‘외계인’들을 합법화한 일, 자기 스타일을 찾으려는 평범한 용자를 위해 판테온을 세우던 일도 옛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사라지고 지문도 옅어졌지만, 남자의 세상을 체계화하는 방식, 우리를 이끌어온, 한계를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 잘 검토된 회고, 세속적인 과시, 이유 있는 논쟁과 반증, 다원 주의, 참을성, 매일 마시던 소량의 술은 시계추가 처음 움직이고 우체부의 발걸음이 시작된 14년 전과 다르지 않군요.
어떤 미디어건 독자를 늘리려 합니다. 짧게는 보상이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환상적인 잡지라 해도 환상적으로 지루할 수 있습니다. GQ는 자극적인 사상가이자 담백한 엔터테이너이고 싶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문화적 심사위원의 역할을 해왔다는 건 당신도 알 것입니다. 사물의 경계에서 관찰만 하는 지적인 기회주의나 딜레탕트, 입만 재빠른 선동가의 역할은 매우 불편합니다. 다소 구별되는 관점과 괜찮은 기억력, 수줍음만큼의 박식함으로 사물을 해석하고, 일상의 찰나를 감정으로 남기는 수필을 써왔다는 자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변했습니다. 논리적이고 미적인 것에 대한 혐오와 억압이 산문을 얼려버린 한국 남자의 삶은 대부분 상스럽고 따분해졌습니다. 어깨에 걸친 옷, 손에 든 가방이 성품을 말해준다는 말은 공허해졌고, 무엇을 허락하고 지지해야 할지, 무엇을 사고 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은 지나간 20세기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보다 쓸데없고 보다 무례하며 보다 무자비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모욕에 무감각하고 차별과 공격을 순진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대중, 집단적 본능으로 이리저리 찌르레기처럼 날아다니는 경향, 섹시하지 못한 감수성, 인생의 날카로운 모서리와 역사의 끄트머리에 게으르게 누워 스스로를 방기하는 어떤 안도감, 자기의 미숙함을 인정 못하는 퀴퀴함, 수그러들지 않는 가식, 모순으로 뒤덮인 맥락, 사일로처럼 꽉 막힌 일상적 순응의 상태, 애통할 만큼 둔감한 룩에 둘러싸인 채 누구라도 동경할 이상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양식을 제시할 때, 문득 돈 키호테처럼 묻게 됩니다. 고귀함과 위대한 가치란 망상일 뿐인가?
집에서 옷장에 걸린 수트를 보는 조용한 순간, 운석이 지구를 파괴하는 광경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런 공포는 새로운 관심사만큼 상품화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미디어가 지시하는 대로 옷을 입고, 슬퍼하라는 대로 애도하는. 나의 깊은 두려움은 역시 번쩍이는 외향적 두려움일 뿐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면, 나는 구겨진 사람입니다. 철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얻기 어려운 인품이지만) 지혜도 모자라고, 결점은 더 심해집니다. 내가 내 친구였다면 나를 떠났을 거라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패션도, 모른다고 할 순 없지만 재치 넘치는 건 아닙니다. 행커치프를 포켓 에 꽂는 법은 알지만 자주 하진 않습니다. 갈수록 막 다루어도 되는 옷이 좋아집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인 것처럼 매일 아침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실크 셔츠 대신 올 풀린 스웨터를 집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건 문제 가 아닙니다. 가끔 후진 것도 유행합니다. 애를 써도 마냥 촌스러운 사람에 겐 중요한 얘깁니다. 그러나 재킷의 구조에는 약속이, 자신에게 지킬 약속이 있음을 아는 건 더 중요합니다. 점점 모든 것의 표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사람의 얼굴, 책상의 흔한 나뭇결, 파랗거나 빨간 하늘의 표면. 만두 같은 내 몸을 보면 불안정한 마음 따윈 무시하게 됩니다. 껍데기에 집중하는 삶이 얕은 건 아닙니다. 동요하는 무대 위의 삶입니다. 외적인 것은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미지는 예술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차려 입을 가치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의 빛나는 터널 안에서 자기 에고와 결 혼한 채 치장을 배우는 것은 인간의 유연성을 축복하는 기회이며, 뻔한 존재가 새로운 무한대를 접하는 일입니다. 옷은 긴 휴가, 잊기 힘든 모험이지만 우린 몸으로 돌아옵니다. 몸은 날씨로부터, 젊음으로부터, 통장으로부터 버려져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 시간조차 우리에게서 멀어져 녹아버릴 때, 옷은 영혼이 쉴 수 있는 굉장한 도구가 됩니다.
당신과 나는 서로에게 기반을 두면서 해마다 기록을 깨왔습니다. 시간 밖에 있는 움직이는 공간으로 이동해왔으니 세월과 이미지의 경쾌한 비행인가요. 상자를 처음 연 오래전, 그 상자를 다시 싸는 지금, 내가 잘 아는 당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서로 똑똑하게 또 멍청하게 말해도 되는 친구. 의견에 동조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갈 수 있는 친구. 친밀함에 싸인 말없는 순간. 경계심을 지우는 편안함. 평화롭고도 복잡하지 않은 행복. 이런 드문 결합은 보다 근본적입니다. 일종의 실존적 동감으로서. 우리는 압니다. 이브닝 수트의 가치와 레이몬드 카버의 유쾌함을 토론하는 그 순간에도 진짜 남자다움을 위해 함께 불을 지피며, 상대에게 공감이라는 순수하고 특별한 변명거리를 주리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며,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목격하는 것임을. 이윽고 데이비드 보위처럼 삶이 주는 모든 것에 취하는 것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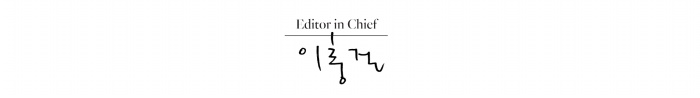
최신기사
- 에디터
- 이충걸(GQ KOREA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