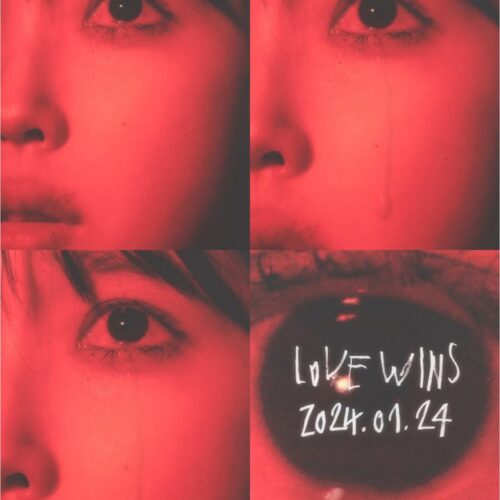전에 <VOGUE> 에디터였을 때, 작고하신 화가 김점선 선생에게 여자의 옷 입기에 대한 글을 청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글의 기조가 <VOGUE>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 그때 지면에 싣진 못했습니다. 그 글을 오래 보관했다가 김 선생의 기일인 3월22일을 앞두고 <GQ>에 공개합니다.

→ 나는 여성복 매장에는 안 간다. 그런데 지난 늦가을 어느 날, 어쩌다 잘못해서 여성복 매장에 갔다. 처음에는 여기가 뭐 하는 덴가 하고 한참 어리둥절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다. 나중에는 혼돈과 엉킴 속에서 무서움마저 생겨났다.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서 빠져나왔다. 그때의 낯섦, 당황, 두려움의 정체는 뭐였을까?
→ 우리 식구는 나 빼고 모두 남자다. 그들은 바깥 활동을 한다. 옷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나는 바깥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옷은 생각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매일 집에서 혼자 일한다. 가끔 바깥에서 혼자 걷는다. 길도 없고 사람도 없는 데를 혼자 돌아다닌다.
→ 내게 옷이란 그저 휴지다. 코 풀어 던지는 물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지녀서는 안 되는 물건. 의미니 가치니 하는 복잡한 첨가물이 붙어버리면 오히려 내게서 버림당하는 물건. 무시당하고 더럽게 쓰이다가 버림받으려고 존재하는 물건. 옷은 그저 내가 홀로 들판을 거닐 때, 하늘을 나는 새가 나를 향해 똥을 떨어뜨릴 때, 내 피부 대신 그 똥을 뒤집어쓰는 껍질이다. 머리칼이나 손발톱처럼 조상님,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룩한 껍질이 아니고 길 가다 아무 데서나 얻고 주운 하찮은 껍질이다.
→ 옷은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쓱 벗어 던져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하찮은 것이어야 한다. 값싸고, 보기 싫고, 매력도 없어서, 던져버려도 잠시도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육교 난간도 쓱쓱 문지르면서 다니고, 지하철역 벽에도 거침없이 기대고, 양쪽 소매로는 슬슬 콧물을 문질러 닦고, 앞자락으로는 코를 푼다. 때로는 일부분을 찢어 종이 대신 메모를 해서 누군가에게 주기도 하고, 아무 데나 펼쳐놓고 주저앉아서 떠오르는 생각을 에스키스한다. 일회용 티슈처럼 수백 장씩, 화장실 구석이나 신발장 위에, 아니면 자동차 트렁크 속에 쌓아둔다. 스페어 타이어처럼, 키친타올처럼.
→ 나는 옷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집도 거지같이 지저분한 것을 좋아한다. 폭격을 맞아서 집의 일부가 날아가고 허물어졌는데도 한쪽에 남아 있는 성한 부분에서 불을 켜고 사는 집. 마당엔 잡초가 키를 넘고, 구멍 뚫리고 허물어진 담벼락으로는 들짐승들이 들락거리는 집. 자동차도 뒤차가 와서 들이받아도 어느 부분이 새로 찌그러졌는지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실컷 찌그러지고 낡은 게 좋다. 사람도 그렇다. 거창한 직함이나 일류학교 졸업장, 뛰어난 미모, 엄청난 돈으로 잔뜩 굳은 사람하고 가까이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힌다. 집, 자동차, 주변인물 따위가 뻣뻣하게 반짝여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 내게는 한 스무 살도 더 어린 친구가 있다. 뉴잉글랜드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되면 한 번씩 내게 온다. 그때마다 커다란 보따리를 하나씩 가져오는데, 그 속에는 깨끗한 헌옷이 가득하다. 그곳 사람들은 자기가 안 입는 옷들을 깨끗이 손질해서 집 앞에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골라서 가져가도록 한다고 했다. 덕분에 터키산, 말레이시아산, 별의별 나라의 낡은 옷들이 내 작업실 한 귀퉁이에 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걸레로 쓰기 위해 차곡차곡 쌓았다.
→ 또 다른 내 친구 순희는 이 세상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닌다. 이거 길가에서 눈에 띄어서 샀어, 그런데 아주 싼 거야, 하고 말하면서 커다란 헝겊 덩어리를 내민다. 순희의 말 속에 ‘길가’라든지, ‘아주 싸다’라든지 하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그 헝겊 덩어리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연회색 코트였다. 목에 여학생용이라고 독일어로 수놓인,
내 긴 팔이 충분히 덮이는 커다란 코트였다.
→ 순희는 나의 덜 자란 감성을, 학생기 이후의 감성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장이 멈춰버린 내 속을 이미 오래전에 읽었나 보다. 길가라든지 아주 싸다라든지 하는 말을 써서 코트의 의미를 가볍게 만든다. 들킨 것 같고, 통하는 것 같고 해서 조금은 기쁘고 안심되면서도, 조금은 쑥스럽다.
→ 마흔이 넘은 나이에 여학생 코트가 생겼다. 십 년도 넘게 그 코트를 입고다닌다. 현관 한쪽 벽에 일 년 내내 걸려 있다. 밖으로 나갈 때 걸치고, 들어와서 현관 벽에 걸어놓는다. 주머니 입구가 뜯어지고, 뒷자락이 찢어져도, 똑같은 색실이 없어 이불 꿰매는 굵은 무명실로 튼튼하게 기워 입고 다닌다. 입고 있을 때 가까이 앉게 된다면 무명실로 된 바늘땀이 쉽게 보일텐데, 그럼에도 나는 그 코트가 편하고 좋다.
→ 먼지가 많은 데를 다녀오거나 코트 자락에 코를 풀거나 한 날은 현관에 걸지 않고 세탁기 속에 넣는다. 걸레, 양말, 타올, 기타 등등의 물건과 함께 세탁하고 헹구고 탈수해서 다시 현관에 걸어놓는다. 다음 외출까지 저절로 마른다.
→ 나는 거의 남편하고 함께 외출하는데 도중에 헤어지게 되면 코트의 안자락에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볼펜으로 써놓는다. 내가 일을 다 보고 나면 나는 코트 안자락을 보면서 전화한다.
최신기사
- 에디터
- 이충걸(GQ KOREA 편집장)
- 글
- 김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