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에 울고, 이미지에 웃는 연예인과 패션 사이의 허탈한 동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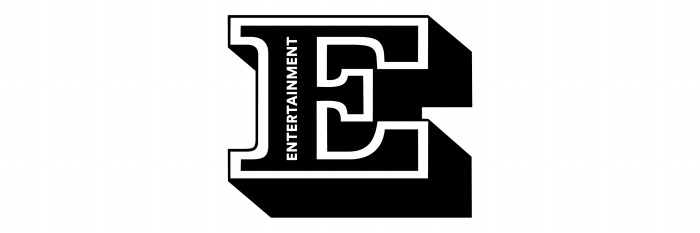
“협찬이 잘 안 되네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주인공의 인터뷰 촬영을 앞두고 스타일리스트가 울상을 하고 있는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다. “A, B, C, D, E, 다 안 된대요.” A, B, C, D, E라면 누구나 쉽게 ‘명품’이라 부르는 그런 브랜드들. 스타일리스트의 토로에 “그럼 F, G, H는 어때?”라고 되물을 수 없었다. 말하자면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벽이었다. 예상은 했다. 이유도 안다. 백이면 백 ‘이미지가 안 맞아서’라고 할 테니. “사실 해당 셀렙의 인기와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온리 이미지가 중요하죠.” A브랜드 홍보담당자가 말한다. 그 ‘온리’가 한국말 ‘절대’보다 강력하게 들릴 줄이야. 어차피 이미지란 만드는 거니까, 이번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은 알아서 자진 삭제했다. 웬 순진한 소리.
“의상이 안 왔어요.” 촬영 전날도 아니다. 촬영 당일, 배우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원래 안 된다고 했는데, 친한 담당자에게 잘 말해서 간신히 두 벌 빼놓았거든요. 근데 오늘 윗선에서 막았대요.” 상황은 제법 긴박하지만 뭔가 좀 희극적이기도 하다. 물론 웃음의 뒤끝은 썼다. 배우가 행여 대화를 듣지 않을까 목소리를 죽였다. 특정 브랜드가 생각하는 한정된 이미지 따위로 소중한 인터뷰이의 자존심을 다치게 할 순 없다. 메이크업을 마치고 나온 배우가 다소 휑한 옷걸이를 본다. 연기 경력 40년이 넘은, 누구보다 화려한 시절을 겪었을, 알 것 다 아는 이 베테랑에게 휑한 옷걸이는 쓸쓸하고 다소 가혹해 보였다. 하지만 뭔가 어울리기도 했다. 겸연쩍게 내가 웃자 그녀도 웃었다. “내가 어깨가 커서 맞는 옷이 잘 없어요.” 그녀의 배포, 그리고 관대함. 이미지? 그게 뭔데.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있다. 지금은 이미지로나, 인기로나 톱 중의 톱이 된 한 남자 배우는 신인 시절에 친구들과 왁자지껄 어울려 한 속옷 브랜드의 화보를 촬영했다. 굳이 비유하자면, ‘테리 리처드슨풍’이었달까? 어땠느냐면 신선했다. 연예인이기 전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괜히 폼 잡지 않는 분방한 청춘을 만난 것 같았다. 흡사,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복제품 천국에서 모처럼 제멋대로 부는 휘파람 소리였다. 하지만 톱스타가 된 뒤, 즉 엄격한 이미지 관리에 들어가게 된 뒤, 그는 오직 캐릭터로만 존재하는 듯 보인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인터뷰조차 드물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성격도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까칠한가요?” 뻔한 질문과 하나 마나 한 대답, 어떻게 보이려는 제스처들. 그렇게 별의별 유형의 각본이 철옹성같이 그를 둘러치는 동안 인기는 인기대로 더욱 치솟았다. 사실 당연한 얘기다. 연예인은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대중은 이미지든 무엇이든, 자신이 알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좋아한다. 기왕에 말쑥한 이미지라면, 말쑥함만 유지하면 된다. 팔색조 이미지를 내세울 게 아니라면, 그저 한결같이 보여줘야 광고도 재계약이 들어오는 식이다. 좋은 이미지를 얻은 자, 거칠 게 없으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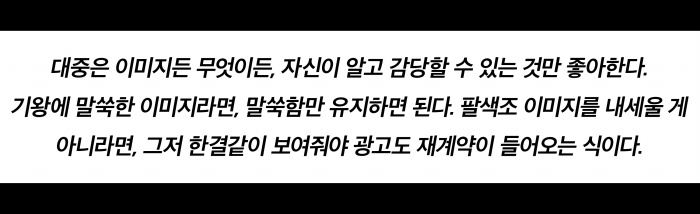
패션 신에서 연예인의 권세는 계속 강화되는 중이다. 1990년대, 슈퍼모델이 도배하던 패션지 미국 <보그> 표지를 할리우드 스타 위주로 바꾸기 시작한 안나 윈투어 편집장의 촉은 세기를 건너뛰어서도 내내 유효한 전략이다. 세계적인 흐름이 우선 그렇다. 공항 패션이니, 드라마 협찬 의상이니, ‘어디꺼’ 같은 꼭지 기사가 스포츠 신문을 차지하는 매우 한국적인 상황까지 가세하면서 연예인과 패션의 관계는 더욱 노골적인 방향으로 가는 추세다. “예전엔 순수한 의미의 협찬 정도가 많았다면, 요즘은 아예 브랜드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느낌이랄까요?” B 브랜드 홍보 담당자가 말한다. 과거, 시상식처럼 시선이 모이는 행사에 옷을 협찬하는 정도의 관계를 벗어나, 지금은 아예 브랜드와 일종의 계약을 맺는 식이다. 해외 브랜드 디자이너가 직접 배우에게 호감을 표하며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는가 하면, 파리 본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서 아예 임원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도 있다. 해당 브랜드의 ‘얼굴 마담’ 정도로 국한됐던 연예인의 역할은 그렇게도 달라지는 중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소문. C 브랜드의 이미지는 물론 매출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스타가 군입대를 앞두게 되자, C 브랜드 홍보실이 그 대타를 찾느라 전전긍긍한다니, 과연 자연스러운 얘기다.
“그럼요. 당장 매출이 달라져요.” A 브랜드 홍보 담당자에게 공항 패션이니 뭐니 하는 뉴스가 실제로 영향이 있느냐고, (순진하게) 물었 다가 돌아온 대답은 확신 그 자체였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내내 잘 입던 옷도 누군가 같은 옷을 입으면 입기 싫어지는 법 아닌가? “누가 그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게 바로 이미지예요.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좋아하는 스타인지, 그런 건 안 중요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패셔니스타로 불리느냐, 그게 중요해요. 자기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으니까요.” 얼마나 쉬운가. 이쯤 되면 패션과 스타일에 대해 “자신만의 것을 찾으세요” 해왔던 우아한 교조는 ‘공항 패션과 매출’ 앞에 꽤나 무력해 보인다.
한 번은 흔한 말로 ‘비호감’이라 불리는 이를 인터뷰하게 됐다. 촬영과 인터뷰는 두루 순조로웠는데, 화보가 공개된 후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그 ‘비호감’이 촬영 때 입은 셔츠가 문제가 됐다. 해당 브랜드에서 항의가 들어온 것이다. 얘기인즉, “우리는 협찬한 적이 없고, 협찬할 생각도 없다”는 것. 맙소사, 그건 ‘비호감’ 본인의 옷이었다. 내가 내 옷을 입고 내 옷이라 말할 수 없는, 무슨 홍길동 같은 황당한 에피소드.
이미지에 울고 이미지에 웃으니, 적어도 패션과의 쾌적한 동거를 꿈꾸는 연예인이라면 장바닥을 뒤져서라도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는 막강한 권력이 된다. 요즘 거물급 스타일리스트는 연예인의 스타일은 물론 한 브랜드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갖게 되었으니, 극소수의 패션 잡지 편집장만을 초대하는 이벤트에 그들의 이름이 먼저 명단에 오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 셀레브리티의 시대잖아요. 브랜드들은 당장 그들이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스타일리스트는 자신도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것이 목표임을 숨기지 않는다. 그가 어느 홈쇼핑 채널에서 호스트를 도와 물건을 파는 장면을 봤다. “이번 시즌 이런 핏이 트렌드예요.” “올여름엔 이런 데님이 트렌드예요” “요즘 대세 트렌드가 바로 이거예요.” 그의 입을 거치면 모든 게 트렌드가 됐다. “이 백을 들고 공항에 가면 바로 공효진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화보가 되는 거죠.” “이 구두는 리한나도 신고 김나영도 신었어요.” 바람대로 그는 점점 유명해지고 있다.
“어차피 아사리판.” 패션에디터로 스타일리스트로 20년 가까이 업계를 뛰어다닌 선배는 이렇게 일갈했다. 그런데 이 말은 듣기에는 시원할망정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갈 아픈 부메랑이 아닐까? “패션이 아름다운 뭔가를 추구하고 이룩하는 시대는 20세기에서 끝난 것 같아. 영화 <생 로랑> 봤어? 그런 건 이제 없지 않을까? 누군가는 여전히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지. 하지만 온통 트렌드와 스피드에 짓눌려 있지. 개나 소나 다 베스트 드레서 소리를 듣는데, 나만 못 들으면 억울하니까 나도 한번 베스트 드레서가 되어보자, 꾸역꾸역 뭔가를 걸쳐. 그래 놓고 우기면 돼. 누가 알아주기 전에 스스로 선언하면 돼. 내가 베스트 드레서다! 다 같이 망할 순 없으니 다 같이 연기를 하는 거지. 심지어 그게 연기인 줄도 모르고 즐겁게 연기를 해.” 나오느니 허탈한 웃음이었다.
“내 옷을 입을게요.” 한번은 촬영장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 연극배우 박정자는 준비한 의상을 정중히 사양하고 본인의 옷장에서 손수 꺼내온 검정색 원피스를 입겠다고 했다. 디자이너 지춘희가 만들어줬다는 그 원피스엔 자디잔 단추가 아래로 쏟아지듯이 매달려 있었다. “지춘희 씨가 이 옷을 나라고 생각한 거겠죠? 배우라면 나만을 위해 만든 옷을 입는 기쁨을 누려도 좋지 않을까요? 이게 내 옷이니까.” 그 말을 생각한다. 백날 천날 ‘이미지타령’만 듣다가, 딱 한 번 멋에 대해 들은 순간이었다.

최신기사
- 에디터
- 장우철
- 일러스트
- 문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