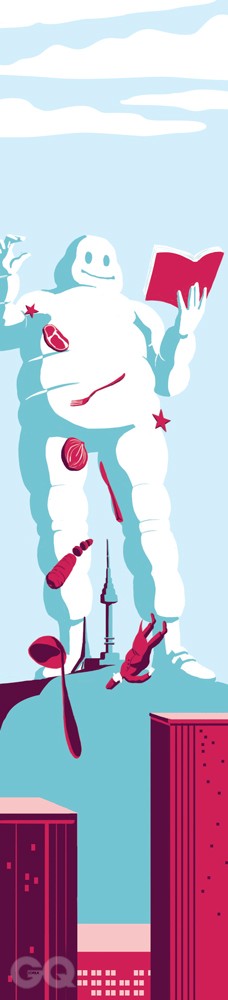3월 10일, ‘미쉐린 코리아’가 온전한 영어식으로 표기를 교정하며 < 미쉐린 가이드 > 서울판 발간을 공식화했다. 서울판은 2017년판부터 발간되고, 발간 시기는 올해 중이다. 다른 도시의 < 미쉐린 가이드 >와 같은 기준으로 레스토랑을 평가하고, 별을 주고, 픽토그램으로 레스토랑에 대한 압축된 정보를 전달한다. 일정 가격을 상한으로 캐주얼한 식당들을 소개하는 ‘빕 구르망 Bib Gourmand’은 별이 없는, 별 밖의 레스토랑을 소개한다.
그리고 소동이 시작됐다. “얘기 들었어요? 어제 OO 레스토랑에 미슐랭이 와서 명함 주고 인터뷰도 하고 갔대요.” 서울에서 누가 < 미쉐린 가이드 >의 이름으로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지는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는다. 서울판을 위해 한국인 평가원을 충원했다는 것만 확인된 바다. 더군다나 < 미쉐린 가이드 >의 별을 정하는 것은 평가원만의 일이 아니다. < 미쉐린 가이드>의 편집자들 역시 발언권을 갖는다. 비밀주의는 어쩌면 대중으로부터의 비밀주의다. 그들이 누군지, 당연히 누군가는 알게 되지만, 왔어도 봤어도 모른다고 하는 그들끼리의 숨바꼭질이 펼쳐진다. 애타는 것은 술래뿐이다. 특히 아직 미쉐린을 만나지 않은 업계 종사자들은 절실하게 애가 탄다. 소문이 격렬한 이유다. 모두가 최소 2스타를 예측하는 청담동 모 오너 셰프가 가장 현명한 답을 했다.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모 오너 셰프가 아직 오지 않은(것 같은) 평가원 방문에 대비해 그릇을 다 갈아치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레스토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했던 호텔 업계는 더더욱 소문에 매달린다. 실무자에게 별을 따내라는 압박이 내려온다는 소문도 나돈다. 미쉐린 별에 대한 갈급함이 모든 소문의 연료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허둥지둥 급조한 그릇 따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가장 큰 오해는 < 미쉐린 가이드 > 서울판이 내수용 콘텐츠라는 생각이다. 본질적으로 < 미쉐린 가이드 >는 미식에 특화된 여행 가이드북이다. 3스타를 설명하는 명제인 “요리가 매우 훌륭해 맛을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Exceptional Cuisine, Worth a Special Journey)‘에서 생략된 주어는 내국인이 아니라 여행자다. < 미쉐린 가이드 > 서울판에 서울만의 기준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물론 한국어판과 영어판으로 나란히 나오지만, 실제로 어느 쪽이 더 많이 팔려나가는가와 전혀 무관하게 < 미쉐린 가이드 >의 콘텐츠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음식 문화에 프레임이 맞춰져 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특수하다. < 미쉐린 가이드 >의 대의 명제이자 표면적인 평가 기준은 요리 재료의 수준, 요리법과 풍미의 완벽성, 요리의 개성과 창의성, 가격에 합당한 가치, 전체 메뉴의 통일성과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 등 다섯 가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전이 숨어 있다. 그 모든 장점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좋은 서비스가 있어야 하고, 기물에서 인테리어까지 레스토랑의 전체적인 공기가 완성적이어야 하고, 음식의 맛과 흥을 돋울 양질의 주류 리스트도 필요하다. 비단 < 미쉐린 가이드 >에만 해당되는 이면 가치는 아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그 이면 가치를 배제한 채 여기까지 흘러왔다. 좋고 나쁜 문제는 아니다. 특수한 현재일 뿐이다. 온정은 온데간데 없이 욕만 남았거나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시급 수준에 걸맞거나 둘 중 하나인 서비스를 견디는 배려심, 매캐한 연기가 내년까지 온몸에 배는 비위생적이고 허름한 시설에서 기어코 정감을 발견하는 불필요한 관용, 맛이 어떻건 질이 어떻건 술은 아무튼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맹 목적인 옹호. 우리는 그 모든 불편과 부당을 인고하고 순응하며 지금의 음식 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면 가치를 모두 못 본 체하며 음식만으로 식당을 평가하려 애쓰고 긴 줄을 서곤 한다. 물론 마음씨에서 솜씨가 나오는 법이라 양단을 모두 갖춘 식당들을 떠올려보면 그것이 전체의 일은 아니다.
정부와 관광업계가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 미쉐린 가이드 > 서울판은 위험한 호재다. 한식이 세계적인 발효 음식 트렌드를 잡아탄 타이밍은 좋았다. 동시대의 한식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단계라는 점이 되레 위험 요소다. 심지어 정부조차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다. < 미쉐린 가이드 >는 그들 나름의 한식을 정의해야 하는 셈이다.
< 미쉐린 가이드 >의 타깃 독자인 여행자들은 한국 음식 문화 이면의 감성적인 사정 따위엔 관심이 없다. < 미쉐린 가이드 >의 별과 빕 구르망은 그간 우리가 쌓아온 정과 관계없는 관점으로 대다수 대중에게 이물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 미쉐린 가이드 > 서울판이 서울의 특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 온도차를 어떻게 대류시킬 것인가가< 미쉐린 가이드 > 서울판에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이자 태생적 약점이다. 무엇보다도, < 미쉐린 가이드 >가 사회 경제적으로 딱 50퍼센트 선에 기준한 대중적, 평균적인 음식 취향을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별에는 가격 장벽이 있다. 빕 구르망도 파리 35유로, 뉴욕 40달러, 도쿄 5천엔이 기준이다.
그리하여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실용적인 미식 가이드는 이미 TV에 만연해 있다. “< 수요 미식회 >나 보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듣고 싶진 않을 116년 역사의 미식 가이드북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지 궁금하다..
최신기사
- 에디터
- 글 / 이해림(푸드 칼럼니스트)
- 일러스트레이터
-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