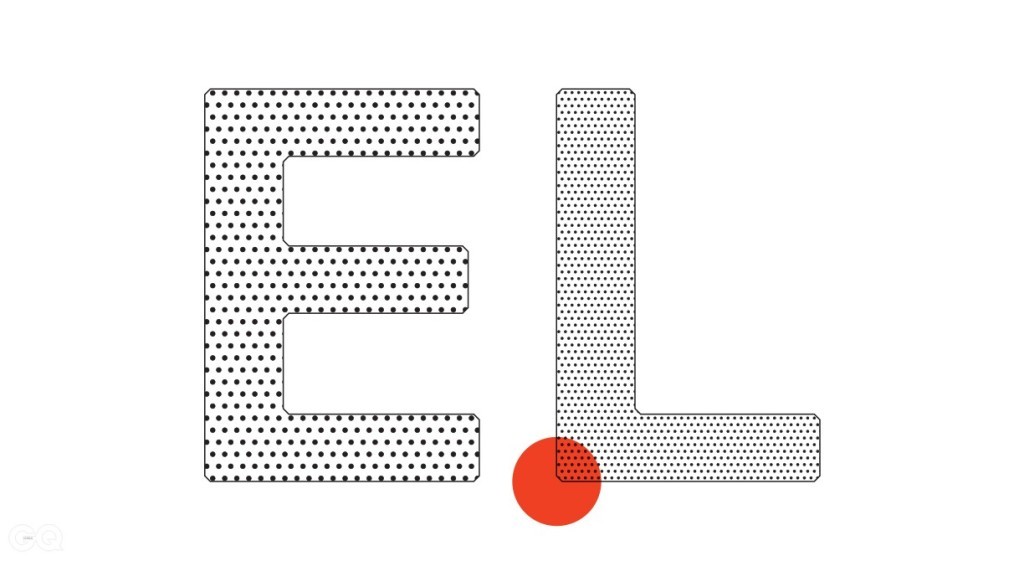존경하는 편집장님. 창간 9주년을 맞은 <GQ KOREA>에 헌사를 바칠 기회를 주셔서 고맙단 말을 하고 싶지만, 안 되겠어요. 당신은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스스로의 부르짖음에 몸을 못 가누겠지만, 내 입 안엔 할 말을 다 못해 부러진 이빨만 가득하니까요.
9년 동안 나는 <GQ KOREA>를 봐왔어요. 당신의 충직한 독자로 그 미끈덕거리는 잡지 속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모든 사색과 판단, 소통을 지큐의 지령에 따랐죠. 하지만 당신이 건넨 잔을 들이켜온 지금은 거의 독살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간의 내 인생은 ‘순수한 비참함’ 의 긴 역사란 걸 알았으니까요.
이젠, 갈수록 퉁명스럽고 빈정대는 듯한 편집장의 글에 진저리 처져요. 도대체가 심란한 데다 비논리적인 질서로만 선택된 문구들은 눈으로조차 우물거릴 수 없어요. 에디터들의 거만한 기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정중’ , ‘단정’ , ‘소회’ , ‘명민’ 이란 단어밖에 모르는 집단은 생전 처음 보았어요. <GQ>의 ‘언어 발작’ 을 야유하는 글도 꽤나 봤죠. 꼭 그렇게 써야만 맛이냐, 그게 ‘지큐쏘쿨체’ 의 윤리며 기준이냐, 잘난 척 좀 그만 해라. 물론, 지큐 크리틱이 다들 하찮아 하거나,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를 다룬다는 건 알아요. 말해야 할 사안을 덮으면 더 상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타인을 다치게 하는 덴 어찌 그리 무정한가요? 나 같음 누굴 베어버릴 모욕적인 말을 해야 한다면 제일 적은 자극만 줄 것 같아요. <GQ>는 직설적인 술자리의 충고가 대기업 이사회에서도 통용되기라도 하듯 가차 없잖아요. 가끔 정치적 언어로 시위하기도 하는 당신이니까요. ‘뭐가 옳은지 알면서 그걸 하지 않는 건 최악으로 비겁하다’ 던 중국 철학자 흉내를 내는 거죠? 당신이 무슨 공자예요, 유관순 누나예요? 하긴, 당신은 동그란 큰 눈을 가진 산골짜기 소녀를 흰자위 후덜덜한 섹스 심벌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봤자 속물의 최전방에서 새로운 게 이로운 거라며 그 비싼 물건들을 와장창 실어재끼는 트렌드 제조자, 도덕적 비겁자일 뿐이면서…
맞아요. 처음엔 <GQ>에 나오는 모든 걸 따라하고 싶었어요. 테두리가 밤색인 면 포켓치프, 끈 달린 갈색 구두, 가는 골이 진 캐시미어 양말… 그땐, 한 켤레 값이 도시 근로자의 세 달치 임금인 구두를 신는 치들은, 아주 살짝 돌았거나, 치매 졸부거나, 출장 온 외국인이겠지 그랬죠. 이젠 뭐가 진실인지 알아요. 그건 일개 잡지의 호사스러운 칙령이 아닌, 모두의 청빈함을 뛰어넘는 탐욕이었어요. 결국 지큐는 분리를 가르친 셈이에요. 실질 경제에 있는 이들로부터, 비싼 걸 살 수 있는 능력자들로부터, 그런데도 과시하지 않는, 더 화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분리한 거죠. 이 말이, 저 낮은 곳에서 서식하는 평등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적인 테러인가요? 하지만 당신은 자꾸만 돌연변이 하는 괴물처럼, 소비란 형태를 변화시키는 예술이라고 우기겠죠. 변명도 어쩜 그렇게 ‘하이브리드’ 한지요?
그때 <GQ>가 주창했던 말은 ‘신사’ 였죠. 스탠드업 코미디나 권투장에서나 살아남은 의미 없는 추임새, 남자 화장실 문짝에 붙은 채 오줌발 속에서도 조소하게 만들던 단어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9년을 자아 존중감이 있는 남잘 만들자고 계몽해왔건만, 때와 장소에 맞춰 입는 사려 깊은 남자가 늘기나 했나요? 제 몸뚱아리만 꾸밀 줄 알지, 배려라곤 아예 찜쪄먹은 옷차림, 문란함으로만 채운 풍속, 무분별과 게으름과 단순한 무례가 뒤섞인 버릇없는 애들만 보이지 않아요? 인간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언제쯤 알 건데요?
이해해요. 편집실은 당신을 위한 ‘피터팬 무법지대’ 이며, 마감의 검은 말들이 젖 먹여 키웠던, 당신의 잃어버린 아이 중 하나일 에디터들은 아수라장 속의 웬디니까. 운동 선수? 심판이 뭔가 강탈해가죠. 경찰관? 타당한 존경심을 받지 못해요. 의사? 늘 과로 상태 아니에요? 운전자? 허구한 날 파업 중이고. <GQ> 에디터? 폐차처럼 지친 데다 발진 같은 적개심이 지글지글하겠죠. 당신이 그 뻣뻣한 목을 따라 흘러내리는 승리의 전율을 느낄 때, 에디터들은 교수대로 걸어가는 이교도의 모습을 한 채 임기응변이 창궐하는 마감에 먹히고 말죠. 당신의 감색 컨버스를 문구칼로 내리 찍는 상상을 하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가 가진 ‘사명’ 의 진짜 의미가 그리울 땐 당신을 생각해요. 권리 부여란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게 들리지만 당신에겐 웬지 자격이 있는 것 같죠. 적어도 기득권에 반발하는 척하지 않으면서, 지위 같은 건 있지도 않은 현대 삶의 후미진 구석을 다감하게 옹호하니까요. 아무튼, 이제 난 자유예요. 정화된 영혼 속에서 영원히 <GQ>독자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님 평생 보이콧할 수도 있고, 집에 있는 <GQ>를 싸그리 태워 그 재를 당신 책상에 뿌려줄 수도 있죠. 그러니 날 꽉 잡으세요, 창간 90주년까지.
…글을 맺기 전에, 다음엔 편지 쓰는 법부터 배우겠다고 약속할게요. 그게 〈GQ〉가 가르쳐준 인생의 순서이자 정당성 맞죠? 그럼 안녕히 계셔요. 귀찮아도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GQ〉의 첫 번째 독자로부터
Editor in Chief 이충걸
- 에디터
- 이충걸(GQ KOREA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