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켜면 작곡가가 입을 연다. 그들의 얼굴이 익숙해질 무렵, 가수의 이름이 낯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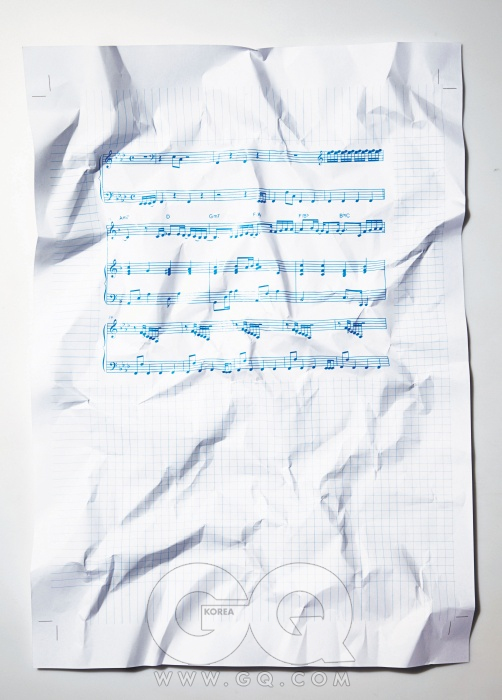
방시혁은 오래된 이름이다. 대중에겐 낯설었을 것이다. 알 만한 사람은 알았겠지만, 그의 노래를 부른 가수들만큼은 아니었다. 이제는 노래뿐만 아니라 얼굴과 목소리도 유명하다. MBC <위대한 탄생> 덕분이다. 신사동 호랭이는 젊은 작곡가다. 독특한 패션과 넉살좋은 입담이라는 유명세를 타기 좋은 조건을 갖췄다. 얼마 전 그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MBC <꽃다발>에선 신사동 호랭이의 신곡 음원을 따내기 위해 여자 뮤지션들이 대결을 벌였다. 고정과 손님이라는 차이는 있었지만, 둘 다 프로그램의 주인공에 가까웠다.
TV 예능을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잠식한 지는 오래됐다. <무한도전>과 <1박 2일>의 PD를 모르는 시청자는 거의 없다. 카메라 안으로 다른 카메라가 불쑥 들어오기도 하고, PD의 얼굴도 여과 없이 노출됐다. ‘리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편집을 거친 완성된 방송이지만,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더 많이 보여줄수록 좀 더 진짜 같았다. 최근엔 거기에 ‘서바이벌’이 붙었다. 대개가 음악 프로그램이었다. 1등을 뽑고, 참가자들의 연습 과정을 보여주고, 멘토링을 하는 식이었다. 예능에서의 PD처럼 프로그램 ‘뒤’에서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했다.
그 자리를 꿰찬 건 작곡가들이었다. PD들이 생각한 적임자였다. “저희는 음악방송 PD라도 음악보단 방송제작 PD에 가까워요. 전문성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한데, 작곡가는 또 시청자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일반인의 입장도 대변하면서, 전문성도 있으니 시청자들이 보기에 눈높이가 더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슈퍼스타K 2> 김태은 PD의 말이다. 음악가가 TV에 나온다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는 아니었다. 전례도 있었다. 윤종신과 김태원은 예능에서 오랜 시간을 버텼다. 처음엔 욕도 먹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음악과 예능을 병행하는 것은 물론 음악에 관한 예능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뮤지션의 정체성을 되살렸다. 작곡가들에겐 별 부담이 없었다.
나와선 줄곧 멋있었다. 독설가 심사위원, 서바이벌 최후의 1인를 가리는 노래의 작곡가, 자기 노래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걸그룹…. 망가지거나 웃길 필요도 없었다. 자연히 그들의 이름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작곡가의 힘이 커진 건 아이돌 위주의 시장 이후로 꾸준했을 테지만, ‘TV에 나오는, 대중에게 익숙한 작곡가’라는 한 층위 더 높은 계급이 등장한 것이다.
<슈퍼스타 K 2>가 끝나고 나선 출연자들의 거취 문제가 이슈였다. 대형 기획사 이외엔 얘깃거리가 아니었던 ‘회사 차원’의 논쟁이었다. 논란의 중심은 작곡가였다. 시청자들은 어느 출연자는 어떤 회사, 어느 작곡가 어울린다며 갑론을박을 펼쳤다. 현재 대중음악시장은 제작사에 따라 작곡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장이다. 판이 좁아서 그렇다. ‘김그림 박보람 조영수가 속한 소속사와 한솥밥’, ‘김소정 이트라이브와 계약 임박’ 같은 기사가 포털사이트 메인에 걸렸다.
TV를 벗어나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올해 초 데뷔한 달샤벳의 홍보 문구 첫줄엔 ‘프로듀서 이트라이브의 야심작’이란 말이 쓰여 있었다. 멤버 소개나 음악적 지향점보다 먼저였다. 이트라이브는 소녀시대의 ‘Gee’ 열풍 이후, <무한도전>의 ‘강변북로가요제’에 출연하며 스타가 되었다. 수많은 걸그룹과 달샤벳을 차별화하기보다, 차별적인 작곡가를 앞세운 것이다.
이런 흐름이 국내 가요계가 프로듀서 위주로 재편되는 것의 방증이라면, 반가운 일일 수 있다. 프로듀서 위주의 시스템은 미국, 일본에선 보편적이다. 가수의 담당 프로듀서가 작곡가에게 악곡을 요구하고 세션과 가사를 붙이는 식이다. 뮤지션 고유의 색깔에 대한 많은 부분을 책임진다. 그러나 국내에선 작곡가가 곧 프로듀서다. 프로듀서란 직함을 달고 있지만, 작곡가의 정체성에 훨씬 가깝다. “용감한 형제가 옛날에 한번 프로듀서 인세를 따로 요구한 적이 있어요. 제작사에선 택도 없는 요구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죠.” 인기 작곡가 A가 말했다. 일본엔 프로듀서 인세란 게 존재한다. 프로듀서는 작곡가와는 다른 독립적인 개체다. 가수의 입장에 서서 더 객관적일 수 있다.
반면 작곡가에겐 스타일이 있다. 그걸 바꾸는 건 알앤비 가수에게 록 창법을 요구하는 일과 같다. 가수가 작곡가를 만났을 때 짐작이 가는 건 가수의 색깔보다 작곡가의 스타일이다. “우리나라 음악시장이 좁은데, 얼마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작곡가 위주로 가게 되면 가수가 독창성을 잃게 되죠. 가수가 돋보여야 되는데, 작곡가 위주로 가면 음악이 다 비슷비슷해져요.” 카라와 레인보우 등의 곡을 만든 한재호-김승수, 스윗튠은 우려했다.
프로듀서 시스템의 장점은 프로듀서에 의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지, 뮤지션이 프로듀서의 분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 신인 뮤지션이 특정 작곡가와 함께 데뷔할 때 작곡가의 전작과 흡사한 곡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빈번한 것은, 작곡가가 모든 전권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한국적 ‘스타’ 프로듀서 시스템 안에서, ‘누구 사단’이라는 말은 히트를 보증하는 인장이기도 하면서 획일화의 위험과 맞닿아 있다.
디지털 음원시장의 안정세 또한 작곡가의 이름을 앞으로 내세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 프로듀서의 음반은 따로 팔기가 쉽다. 한 앨범에서 열댓 명의 대형 뮤지션이 각기 다른 노래를 부른다. 가수들의 발목을 잡는 활동 기간 같은 것도 없다. 음원으로서 완벽한 형태다. 조영수- 디셈버, 용감한 형제- 티아라 같은 스타 작곡가와 인기 가수의 합작 포맷은 제작사에도, 작곡가에게도 달콤한 제안이었다. “저희가 기획을 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완성된 음원을 받는 형태였다면, 이제 유명 작곡가의 힘과 우리의 기획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쉽게는 음반기획사라는 중간 채널을 생략한, 직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아니면, 작곡가와 음원제작사의 공동 제작?” CJ E&M 음악유통팀 팀장 이동훈의 말이다. 조영수 – 디셈버, 용감한 형제 – 티아라의 음반은 모두 CJ E&M을 통해 나왔다. 지난 1월, 조영수 – 디셈버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는 2월 21일자 벅스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Real+>를 발매한 후 5일간 1위를 달리던 ‘대세’ 아이유를 2위로 끌어내렸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작곡가가 음반을 만드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면이 있는 기획사나 제작자들은 작곡가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작곡가가 “가수 가창 한번 시켜주세요” 하면 가수를 선뜻 내주곤 하죠. 이제까지의 도움도 그렇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스윗튠이 말했다.
‘가창 한 번’이란 말은 일견 지금의 가요계를 노골적으로 대변한다. 작곡가의 힘은 막강하고, 가수를 어렵지 않게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다. 원하는 음악을 원하는 가수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작곡가들이 앨범의 성공을 위해서 가수를 이용한 ‘승부수’를 띄우다 보면, 그만큼 가수들의 신선한 느낌은 빨리 소비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작곡가의 앨범은 가수를 이용하는 게 100퍼센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작곡가는 한 번 실패하면 또 쓰면 그만인데, 가수나 기획사는 그걸로 무너져요.” 작곡가 A는 이런 현상을 작곡가의 책임감 결여라고 해석했다.
작곡가는 브랜드가 되었다. 실력자, ‘히트 종결자’ 같은 말들이 그들 이름 앞에 붙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수에게 입힌다. 뜨면 같이 살고, 망하면 가수만 죽는다. 누가 무슨 노래를 들고 나오느냐보다, 누가 누구의 노래를 부르느냐가 중요해졌다. 작곡가의 얼굴이 익숙해지니, 가수의 이름이 사라진다.
최신기사
- 에디터
- 유지성
- 포토그래퍼
- 김종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