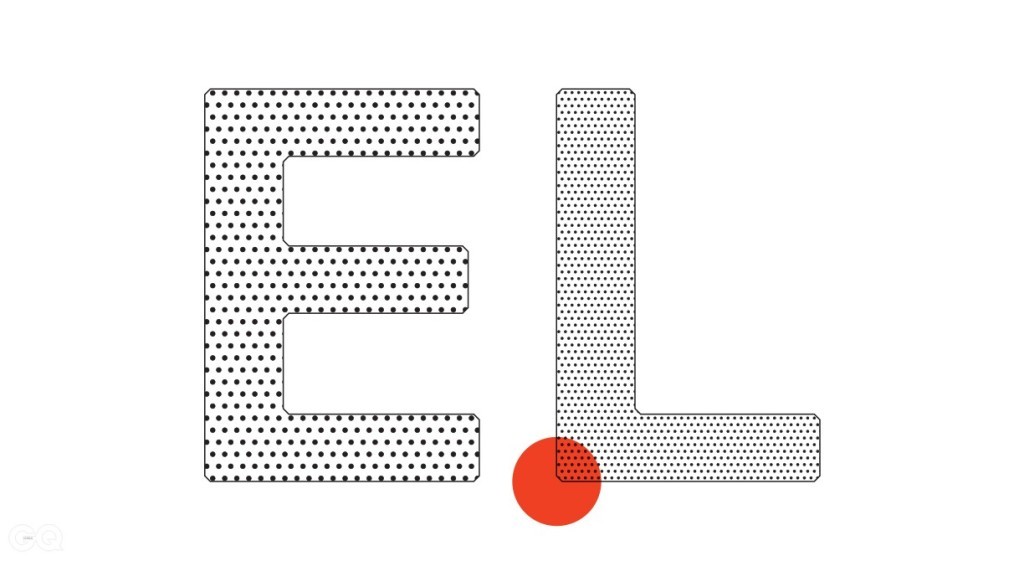짓네 마네, 오락가락하다 좌초된 용산 재개발을 보며 내내 착잡했다. 그건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과 현대 건축의 경향에 대한 질문이라서. 하지만 또한 본능적인 질문이기도 했다.
칭송받는 현대 빌딩은 경계선 너머에서도 도시를 알게 하는 표지가 되었다. 그런데 어떤 고층 빌딩은 사람에게 집을 제공하거나, 여행객에게 전망을 안겨주거나, 이익을 내기 위해 짓지 않는다. 지은 사람이 누군지 세상에 확실히 알리는 것만이 중요하다. 높이는 건축물 자체를 유명하게 만들어준다. 무의미한 만큼 짜릿한 일. 누군가 항상 더 높은 건물을 짓지만, 그게 높이에 대한 강렬한 매력을 감소시키진 않는다. 울워스 빌딩, 시어즈 타워, 타이페이 101은 각각 한 번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 모두 도시 안에서 최고 위치를 공식화하기 위해 올려졌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것이 현재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하고자 하는 바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혹은 ‘세상에서 두 번째로 높은’이란 타이틀의 빌딩은 대개 성숙의 정도에서 교차점이 되는 도시에 세워진다. 그리고 곧 세계라는 무대에 자기 위치를 주장한다. 부르즈 칼리파야말로 모든 난쟁이 건물 너머 하늘에 구두점을 찍었다. 클라이슬러 빌딩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위에 올린다 해도 높이는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지그라트와 피라미드를 갈망하는 화려한 제스처가 현대 도시의 정수가 됨으로써 제풀에 압도당해버렸달까. 불황 속에 지어지는 슈퍼 빌딩들은 지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지속될 하나의 트렌드 같았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청사진을 설명하는 언어는 신탁처럼 신비롭게 들렸다. 금빛 먼지 속에서 휘황하게 반짝이는 불빛은 고대 서사시에나 나올 법한 웅장한 성채로 싸여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생성하거나 그 형태를 다시 변화시켜온 다양한 수상경력의 건축가, 진가를 인정받길 기다리는 과대평가된 건축가가 대거 용산에 유입되었다. 렌조 피아노의 111층 620미터 트리플 원은 국제적 위신 자체였다. 한국의 국가 신조와도 맞물려 있었다. 어쩜 ‘스타트랙’ 의 한 장면 같기도 했다. 지구와 한참 떨어진 행성을 방문한 커크 대장이 된 기분. 한편, 유리 프리즘이 수없이 들어간 커다란 상자에 갇힌 것도 같았다.
이 위풍당당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서울은 런던의 지위로 도약하고, 도쿄 도심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 같았다. 서울은 가스 페달이 바닥에 달려 있어 누르기만 하면 미래로 향하는 타임머신이었다. 주변 모든 것이 용산의 스카이라인을 방해하며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최신 개발을 지지하는 이들과 도시 유산을 보호하려는 이들 사이에서 불꽃이 튄 런던의 예는 안중에도 없었다. 다들 완성된 프로젝트보다 그 다음의 것에 집중했다. 입안 과정은 공개적으론 고상한 수사로 가득했으나, 안쪽엔 도시행정 비즈니스의 실랑이뿐이었다. 어마어마한 국토 변화의 비전은, 실은 도시 건축을 부동산으로 바꾸려는 영악한 변환이자 정교한 난장판이었기 때문에. 용산을 채우는 건 대서사시가 아니라 다른 거대 개발 도시의 모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은 처음부터 따라다녔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건데? 각국의 대도시는 저마다 꾸준히 변해가지만 그 무엇도 용산에서의 일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높은 빌딩은 예쁘건 밉건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할 수 없다. 높이로 손꼽히는 빌딩이라면 사람들은 그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셈 아닌가. 이런 이유로 고층 빌딩을 설계하는 건축가는 우리를 능가하는 힘을 갖는다. 그들은 건물이 도시를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고, 굉장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용산을 보면 자꾸 두바이나 아부다비가 생각났다. 개발자는 구매자가 혹할 제시를 하고, 몇 년이 지나도 공사가 안 끝나고, 입주자는 기다리고, 건설업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신념의 건축가조차 시스템의 이익을 얻으면 파우스트적 인간으로 변한다. 프랭크 게리도 무시무시한 아틀란틱 야드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뒤부턴 전혀 예술가로 안 보인다.
빌딩은 높게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건축은 구름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넓게 펼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기념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용산은, 에펠이 19세기 기술을 탐닉했듯이 현재를 민첩하게 활용한 21세기 에펠탑이 될 수 있었으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과열로 주저앉아버렸다.
도시의 자부심은 그 안의 다양성과 이질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의 대도시는 대대적인 주름제거술의 과도기를 겪는 중이다. 뉴욕은 가까운 미래에 사회 기본 시설들이 드리운 그림자에 먹힐까 봐 무섭고, 파리 중심은 순결이라는 강박에 중독됐으며, 서울에는 부자를 위한 놀이터만 번쩍인다. 하지만 헬싱키가 아름다운 건 그 안에 역사를 포함하기 때문 아닌가. 세계 2차 대전 때 맨해튼이 얼마나 진정한 도시의 위용을 담고 있었는지, 60년대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제는 다 안다.
중요한 순간이다. 어떤 환란으로부터도 살아남은 강인하고 융통성 있는 서울이 계속되어야 하는 순간이자, 다른 도시와 똑같아지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하는 그런 순간인 것이다.
- 에디터
- 이충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