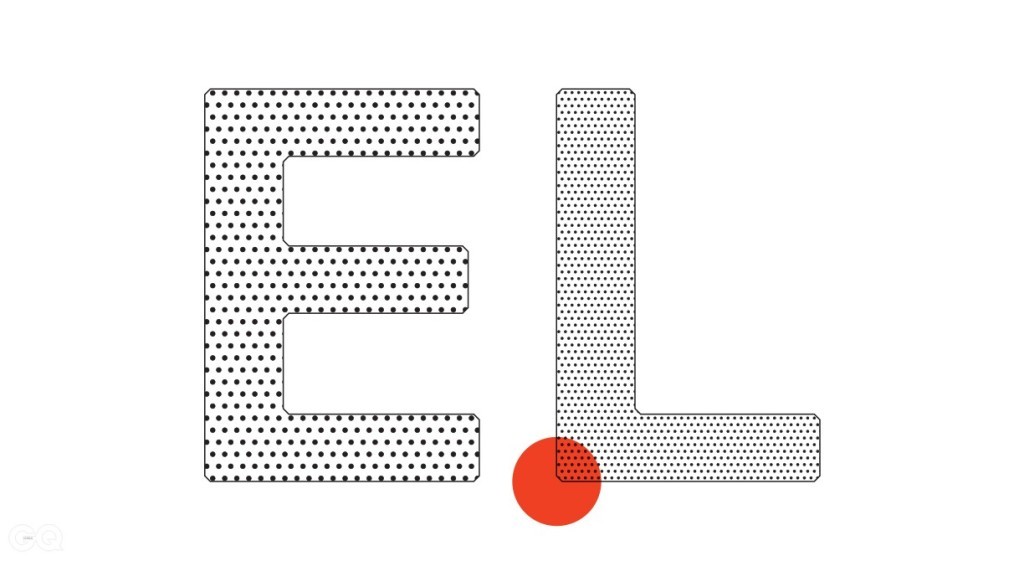분명 기쁜 일도 있었는데, 올 한 해를 정산하면 딴 길로 샌 생각, 숨은 뜻도 없는 중얼거림, 만성적이고도 사소한 분노의 상태로 자욱하다. 그 사이사이의 일상은 한심하고 진부한 것으로만 채워져 있고…. 고역스러운 도로, 그게 그거인 자리, 매일 입는 옷의 무의식적인 교대, 출근까지 남은 날의 불규칙한 관찰, 그것을 엮는 맥빠진 연습, 안 봐도 그만인 사람들, 좋아 하지도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찬 집, 21세기의 불운을 입증하는 사회적 질문들, 살이 상속하는 병들의 위협, 주변을 둘러싼 감시 카메라, 언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신조어, 뼈와 골수에 침입한 프라임 타임 뉴스와 엔터테인먼트의 허접함, 부질없는 부담, 쓸데없는 긴장, 무력한 걱정…. 이렇게 불가해한 빛의 포도주처럼 시간의 바다로 미끄러져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시간의 독재 아래서 밤낮 꿈틀대봤자 아무도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겠지? 그래봤자 아무도 듣지 않는 잔소리를 퍼부으며 이런 식으로 오래 살면 또 뭐 하겠어? 장수는 현세 최고의 상품이지만 시간을 부정하는 어리석음, 지나친 감상, 보답 없는 세월의 마일리지 아닌가….
덧없는 의구심은 내가 포함된 시대의 고질병이 되었다. 당신 삶도 정확히 그럴 것이다. 누군들 이런 잡다한 것들과 무관하단 말인가. 매 순간 나를 꾸짖는 운명에 맞서는 인내심 따윈 원래 없었다. 무시당하거나, 집중 할 수 없거나, 원하는 걸 말하기 애매하거나,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시시한 하루하루의 일들 때문에 분개하거나, 마침내 참을성이 바닥날 때마다 내 가 생각하는 건 오직 지금. 지금이라는 즉각적인 외침. 다음은 필요 없다. 지금만이 불꽃을 튀기며 대기를 갈라놓는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도, 현재 이해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냉정한 판단 때문이잖아? 지금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 지금만이 인생의 모든 것이야….
계절이 바뀔 때, 부드러운 바람이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담요처럼 화사한 태양은 어느날, 열대만큼 뜨거워진다. 기온, 습도, 공기의 색깔은 매일 달라진다. 가만히 앉아 있기 힘들게 만드는 초여름의 냄새, 가을의 감상적인 태양빛,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는 날카롭고 매서운 공기. 하지만 그 변화는 일 년에 딱 며칠만 사무치게 또렷하다. 오감은 따로 움직인다. 같은 주방장이 만든 요리도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 그때의 몸 상태, 식당 분위기,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맛이 다르다. 봄바람이 훅 끼쳐서 바다에 가고 싶고, 나무 사이로 들리는 풀벌레 소리만큼 기분 좋은 게 없으니 숲에 가고 싶고, 비 냄새를 맡으며 따뜻한 우엉차를 마시고 싶은 마음은 논리적인 게 아니다. 불확실하거나 모호해 보이 는 것들엔 이유가 아닌 감정이 깃든다. 생각 없이 쌓인 것들에 희미한 기쁨이 감돈다는 진실까지.
비논리적인 감각, 짜증나는 즉흥성, 더운 장소에 있을 때 온도를 더 높이고싶은 마음. 너무 추워서 실성하는 한이 있어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충동, 똑똑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욕구, 덧없는 기쁨을 날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은 삶에서 각질처럼 떨어져나간다. 그래도, 지금 이 갈망이 직접적이건 아니건, 절실하건 말건, 본성이 움직이는 대로 살 수 만은 없다. 매일 오감이 시키는 욕망을 다스리느라 지쳐서. 번번이 그것들을 판단해야 해서. 하고 싶은 걸 추론만으로 붙잡으며, 욕구를 끝까지 금하느라고. 게다가 늘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기다린다. 결국 양립할 수 없는 상태로부터 도망가도록 셔터를 닫아버린다. 인생….
그런데 머리를 막고 온몸의 감각을 거부하는 건 더 쉽나? 언젠가 편안해질 날이 오겠지, 더 기운을 차리면 그때 실컷 돌아다녀야지, 공상만 하다가 기진맥진해질 텐데? 몸은 아무리 쉬어도 만족할 수 없고, 심장은 점점 말라간다. 오감으로부터 오는 기분 좋은 감각은 나타나자마자 이내 사라진다. 계속 유지되거나 끝까지 남는 행복은 없다. 미각을 통해 느낀 것들은 배가 차면 남지 않는다. 촉감은 축적되지 않고, 더러 불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믿는 확실한 것들과 아직 고대하는 것들은 간신히 찰나에만 머물 뿐이다. 위인이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의 담담함을 참조하고, 저 구름 위의 신성한 숨결과 만난들, 일상의 무의식으로 돌아오면 금방 잊는다. 굶주린 오감을 위해 잠깐씩 비싼 음식을 사먹고 쇼핑을 반복해도 감각은 반쯤 닫혀 있을 뿐이다.
행복은 타인의 평가로 측정될 수 없으며, 자기가 바라는 게 뭔지는 다들 잘 안다. 그런데도 자기가 지금 어디를 딛고 있는지 아는 사람, 정말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그다지 본 적이 없다. 교수대에서 시간에 이별을 고하는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떤 단어를 내뱉고 싶은 걸까? 이 유별난 세상에서 광기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꾹 참는 것뿐일까?
아무도 꽃을 보지 못한다. 꽃은 아주 작고, 들여다볼 짬도 없어서. 하지만 친구를 만들 때처럼 꽃을 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 에디터
- 이충걸(GQ KOREA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