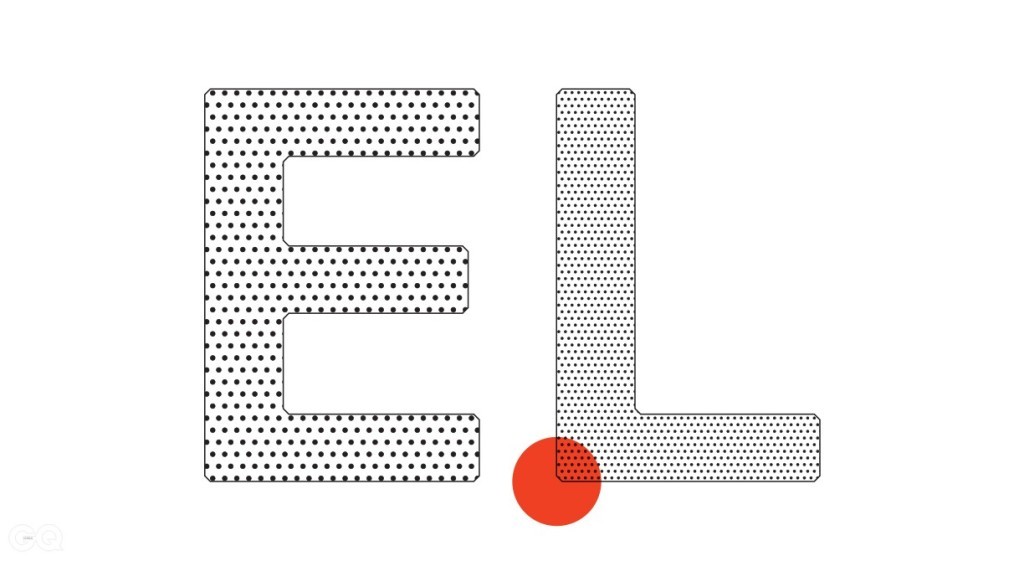실체와 같건 말건 고정관념은 흔히 도표화된다. 국민성이 제일 그렇다. 이탈리아인은 화려하다 못해 현란하고, 독일인의 엄격함은 청결벽으로 이어지며, 영국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다는 식. 한편, 일상을 이어주는 행위로서의 쇼핑은 나라마다 또 어떻게 다를까?
(누구도 타인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평등에 대한 믿음은 스웨덴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배한다. 대형 원스톱 숍 사이에서 H&M과 이케아의 존재감이 우뚝한 건 그래서다. 두 브랜드의 철학은 국가 정신과 닮았다. 너와 나, 우린 모두 패션과 인테리어를 누릴 자격이 있다! 평등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는 럭셔리 혐오에 이른다. (세금 엄청난 걸 보면 다 나오지.) 샤넬을 든 스웨덴 사람이 그렇게나 드문 건 그들에게 샤넬은 자기 것이 아니라서다. 이성적이다 못해 갑갑한 민족성, 정연하다 못해 냉담한 질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건 분별 있게 조직되어야 한다는 가치에서 오는 것일 테다.
명동의 저가 화장품 가게와 구찌 매장을 동시에 채우다 말고 제주도에 땅을 사러 가는 중국인의 쇼핑처럼 복잡하고 호쾌한 게 뭔가. 시장 중심의 유물론과 그 가시적 상징물인 쇼핑몰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분방한 소비를 불허하던 중국인들이 럭셔리 시장에서 불이 붙었다. ‘명품’은 지위의 고속도로! 그들은 도시를 메운 메가 브랜드를 나라가 흥하는 증거로 본다.
일본의 쇼핑은 감각의 폭격과 같다. 패션은 사소한 재미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다. 패션 자체에 중독된 스페셜리스트들에겐 라벨로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일생의 요소가 되었다. 그들은 잡지를 성경처럼 챙기고, 갖고 싶은 걸 위해 당연히 굶는다. 그리고 티셔츠에 대한 순수한 집념! 규범으로 뭉개진 사회가 아찔한 경험을 통해 오다쿠의 나라가 된 것 이다. 한국보다 국민 소득이 월등한 데도 별로 있어 뵈지 않는 건 소금에 절인 매실 하나로 반찬을 대신하던 전쟁 때를 늘 상기하기 때문에….
러시아인의 체질은 극단적으로 나뉜다. 금욕과 탐닉. 공산주의 시절의 통큰 소비자, 지주들은 방금 출시된 모자를 사오라고 ‘쇼핑 대행 비서’를 파리로 보냈다. 하위 계층조차 말 타고 가다 멈춰 롤스로이스 주변을 애절 하게 배회했다. 러시아가 상품과 벅찬 사랑에 빠진 건 최근. 지금도 생계가 절실한 러시아의 텅 빈 선반을 채운 건 새 브랜드들이다. 엘리트나 전문직 종 계층은 도래한 지 20년도 안 된 신인류. 럭셔리 모스크바, 뉴 모스크바 는 백화점 문밖에서 다섯 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게 만들었다.
이탈리아인들은, 악명 높은 축구 마니아나 도로 안전에 대한 기사도적 매너, 제 엄마를 거의 신성시하는 태도로만 유별난 건 아니다. 무솔리니 통치 때조차 겉치레의 퍼레이드로 찬란했던 일상을 지배한 건 정부가 아니라 가족 체제의 독립적 브랜드들이었다. 늘 최고의 외관을 지녀야 하는 이탈리아식 체면은 거의 국가적 취미다. 점심 한 끼가 저녁까지 이어지는 네 시간짜리 이벤트인 사람들에게 영국인의 절제란 속 터지는 노릇. 옷들이 자길 사라고 돌림노래를 부르는데 어여쁜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치진 못하지.
물가가 잔인하다 해도 런던은 예전부터 쇼핑객의 도시였다. 영국은 가게 주인의 나라라고 나폴레옹이 말해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런던에서의 쇼핑은 영국인만 빼고 다 좋아한다. 미국과 달리 자본주의와 부조화 한 청교도 정신이 돈에 관한 뿌리 깊은 수치심을 남겨서? 낭비하는 자로 비칠까 봐 얼마인지 안 밝히고 가격을 낮춰 말하는 건 영국식 억제일까? 사실 죄의식 때문에 비싼 옷을 안 산단 말은, 능력은 돼도 옷 말고 정원을 꾸미거나 연금에 투자하겠단 의미다. 그냥 간이 작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누가 방금 산 페라리를 자제 없이 자랑할 때, 미국인은 그의 소득을 추리한다. 돈 얘긴 생활. 연봉 과시는 상식. 가격도 껌처럼 구사한다. “네가 침을 묻힌 이 셔츠가 지금 얼만 줄 아니?” 소비주의의 본향이자 상업주의의 진정한 신전이며 막강한 생산성을 독려하기 위해 소비가 미덕이란 말을 만든 나라지만, 국민은 지출과 저축을 위한 돈을 구분한다. 주말마다 우편함엔 판촉용 10센트 할인 쿠폰이 쌓인다. 계산대 줄이 늘어지는 건, 계산원들의 손이 느려서라기보단, 주부들이 쿠폰을 너무 많이 내놓아서….
이스라엘의 쇼핑은 정치적 자장 안에 있다. 이스라엘 디자이너가 만든 화사한 파스텔 색 옷조차 얼추 소박해 뵈는 건 그 때문이다. 50년간의 분쟁을 미루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를 약속했던 한때의 협정 기간엔 그들도 쇼핑에 적극적이었지만, 안식이 끝나자 중산층은 부자의 영역으로 진입하거나 빈민으로 전락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
프랑스인은 창피한 줄 모르고 “그거 완전 비싸”라고 말한다. 세금관리소에 가선 과다 청구된 세금을 자주 하소연한다. 그건 지지리 궁상이 아닌 소박한 생존의 구실. 남의 돈엔 관심없다. 자국의 세기적 브랜드는 외국에 가치를 파는 비즈니스일 뿐. 젊은 여자는 중년이 돼도 슈퍼마켓에서 화장품을 사고, 지식인은 같은 옷으로 한 철을 보낸다. 3대째 쓴 가구, 백 년 된 포크, 때묻은 인형, 이 빠진 찻잔은 프랑스 가정에선 먼지처럼 흔한 일.
어느 나라건 사회적·경제적 흥미, 세대별 거리, 국가와 개인 사이의 가치는 때로 일치하고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니저러니 해도 한국 사람처럼 남의 돈에 눈 돌리는 민족도 우주에 없다. 여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두는 남들은 얼마를 벌까, 딱 그거! 백수조차 “요즘 아파트 5억 갖곤 못 사. 한 8억쯤?” 대수롭지 않게 내뱉는 건 그게 다 남의 돈 얘기라서다. 하지만 비교 심리는 청소하는 성자도 면벽한 스님도 어쩔 수 없으니, 끝내 신세 한탄이 이어진다. 남의 돈 8억은 우스워도, 내 돈 80만원은 치사한 현실이라서.(그나저나, 이젠 부자도, 부자의 소비도 부럽지 않다. 우선 취향부터 되게 별로고, 또 하나같이 나보다 못생겼기 때문에.)

- 에디터
- 이충걸(GQ KOREA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