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그렇게 싫었는데, 정말 어쩔 줄 몰랐는데, 인간이 변했다. 게으른 어느 저녁, 문득 온화한 바람이불면 풍 맞은 듯 와인 오프너를 찾는다. 관 속에서 뻣뻣하게 굳어가지 않는 한 여름마다 무념무상, 무릎 위에 올려둔 리즐링 병의 코크를 빼야지…. 어째서일까? 쿰쿰한 마감의 갈피마다 화이트 와인을 한 말 마시고 싶은 충동이 석유처럼 솟구치는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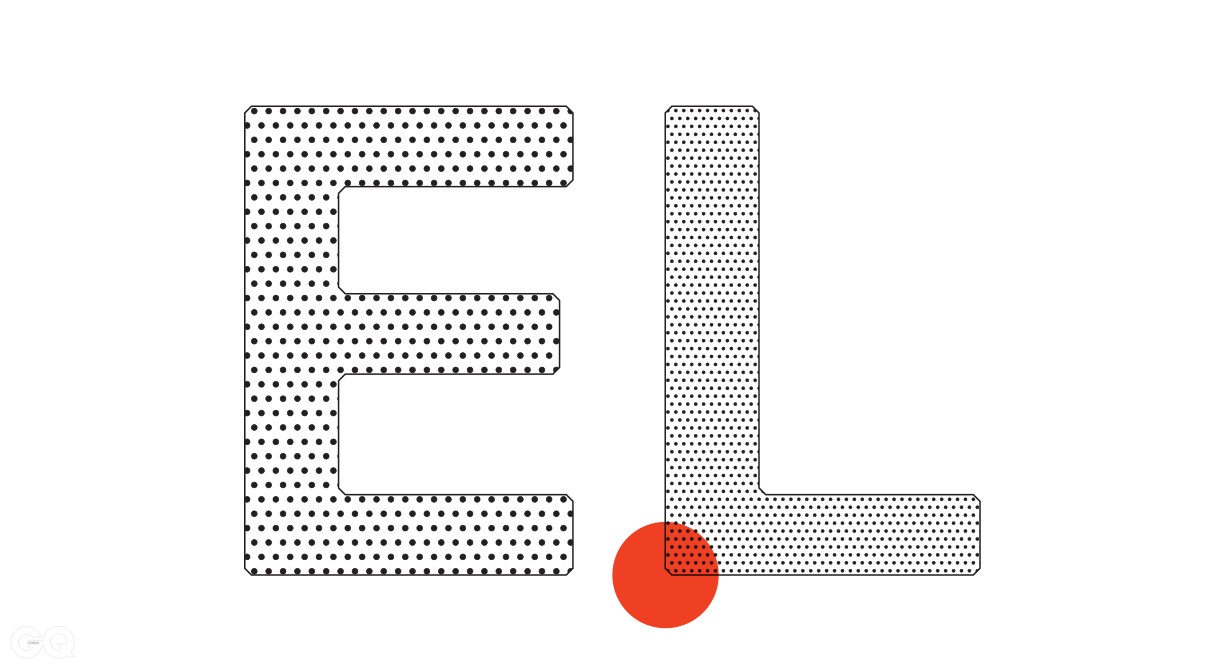
와인 고르는 건 사랑보다 어렵다. 마트의 한코너, 임립한 와인의 만리장성 앞에 서면 “니가 날 알아?” 한 병 한 병이 각기 사천왕상처럼 눈을 부라린다. 그럴 땐 아, 하나도 모르겠다….” 거의 자살에 가까운 속삭임.
나는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모든 관계엔 힘의 균형이 있는 건데, 약속만 하면 나더러 장소를 정하고 와인을 고르라고 해서 항상 골치 아프다. 일일이 장소의 주도권, 주문의 주도권을 갖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 모두의 비위를 맞추고 돌봐야 하는 비굴한 삶. 하지만 앞에 앉은 사람이 “난 와인, 잘 몰라서… ” 두루 눈치 보며 메뉴 아래 싼 가격대로 눈길도 못 주는 걸 보면 뭔가 확 치민다. 와인 리스트는 지도 같아서 때로 멈추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표정 자체로 거들먹거리는 레스토랑 주인, 비싼 것만 한 아름인 와인 리스트, 이상한 경멸을 풍기며 내려다보는 소믈리에, 겨우겨우 싼 와인을 찾으면 진작에 떨어졌다고 냉큼 뱉는 웨이터, 죄 지은 것도 없이 쩔쩔매는 손님 족속들, 웃기긴 막상막하다.
밖에서 와인을 잘 다루는 게 교양 있어 뵈는 풍습 때문에, 와인에 대해 모를 여유조차 가질 수 없다니. 와인은 한국의 술 소비 시장을 오래 전 전해왔고, 매체마다 점유율이 늘었다고 떠들고, 와인 셀러 브랜드가 더러 보이는 데도 와인에 대한 논의 자체가 공포라니. 와인 크리틱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아무튼 누가 와인에 대해 설명하면 잘난 척한다기보단 뭔가 갸웃해진다. 꼭꼭 씹히는 타닌, 신선한 미네랄, 아카시아 꽃과 마지판 향취, 시가 박스 냄새, 갈린 후추 향, 유칼립투스를 연상시키는 어둡고 새카만 맛…. 하지만 그건 거대하고 웅장한 지들의 미뢰일 뿐이잖아? 좋은 와인엔 특별한 흙의 기운이 담긴, 영혼을 충족시키는 맛이 난단 말도 너무 포괄적이고 하나마나한 소리다. 와인 향이 라일락 같단 말은, 론 계곡의 좋은 와인을 맛본 사람에겐 보라색 꽃의 향을 설명하는 적절한 묘사겠지만, 솔직히 세뇌의 힘 아닌가. 하지만 와인 서너 병이 겨울 서리처럼 얼어 붙은 마음을 한여름 라일락 들판으로 데려가 준다면 뭐가 문제지? 넘치는 캐릭터, 코가 폭발할 것 같은 말린 허브 , 안장 가죽과 장미 꽃잎…. 진판델에 대한 로버트 파커의 팽팽한 설명보다 거북한 건, 와인 사업가들이 불쌍한 고객을 속이려 들지만 자기만은 투명하다고 강변하는 태도다. 그러나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구루를 원한다….
가장 합리적인 가치를 가진 와인은 론 강 주변의 와인 같지만 그런 말은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해변이 모두 대서양에 있단 말과 다를 게 없다. 뭐, 모두가 와인 전문가일 필요가 있나? 입천장 가까이에서 포도를 뭉개자마자 어디서 자랐고 어떤 통에 담아야 하는지 줄줄 꿰면 얼추 멋져 보이겠지만, 우린 제조자 이름보다 포도가 어디서 자라는지가 더 중요한 부르고뉴 애호가는 아니다. 전 세계 포도 품종이 모두 몇 개인지, 어떤 포도밭 매니저가 빈야드 주인 아내와 외도해 와인 맛이 닥터 페퍼처럼 변했는지, 푸이 퓌세는 샤도네이지만 푸이 퓌메는 왜 아닌지, 수확, 분류, 압착, 펌핑에 대한 세부 지식이 얼마만큼인지는 여름밤의 짧은 만족으로 족한 사람과 무관한 일. 가끔 상표를 보며 수입사나 배급사, 와인을 정한 사람을 찾을 때는 있다. 관료주의적이면서도 예리한 미각은 그런 건가 싶어서.
누가 “부르고뉴 마실래, 보르도 마실래?” 하고 물으면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고민이 돼도 두 와인을 같이 마실 순 없어서. 그러다 보니 자꾸 규칙을 만든다. 규칙은 사슬이 되어 맘을 묶는 데도. 그래도 사연 많은 와인은 싫다. 바디감은 필요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피곤한 와인, 복잡한 제조 사이클이 알알이 잡히는 강박적인 와인, 너무 튼실해서 지나치게 살아있는 와인, 구조와 아로마틱한 우아함으로 무장한 와인, 숨이 멎게 비싼 옥션에서 입찰돼 그 자체로 상전인 와인, 존재감을 가져야 하지만 충분하다 못해 압도적인 와인은 별로. 그런 와인에는 내가 할 것이 거의 없다. 굳이 필요하다면 아주, 아주 조금만 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건 쉬운 와인. 과일 향이 적극적이고, 싸고, 알코올 도수가 낮지 않고, 맛이 복잡하지 않은 와인. 어제 병에 담긴 듯 선선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와인. 높이 떠 있는 기분을 주는 와인. 스트리퍼 같은 화끈한 느낌보다 옆집, 깨끗한 피부의 소녀처럼 부드럽게 둥근 와인. …폭스브룩 화이트 와인을 처음 마셨을 때, 12분 동안 입을 닫고 앉아 있었다. 비 내린 여름 냇물을 그대로 떠 마신 듯한 순수(순수란 포도밭에서의 일이지만), 은은한 존재감이 한지를 투과하듯 알 수 없는 어딘가에 스몄다. 그럴 때 높은 산도의 리즐링인지 순도와 품위의 샤르도네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나에게 와인의 정의는 우아함보단 기쁨. 서둘러 두 번째 잔을 따르고 싶어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소더비에서 종일을 살건 말건 우리 마음속엔 오래된 포도나무가 살아서, 땅의 가치를 극한으로 이끌 만큼 뿌리 내리기까진 시간이 걸린다. 나의 포도나무는 악기. 땅은 악보. 와인 농장의 진실이 존중받지 못하면 테루아르가 무슨 소용인가? 농부로서의 나의 의무라면 포도나무가 테루아르를 순전히 표현하게 하는 것…? 이런 시어詩語는 뇌 속을 홍수처럼 떠다니는 시대정신일까. 화이트 와인이 주는 최소한의 죄의식, 엷은 퇴폐일까. 어쨌든 오늘도 같은 소리를 듣는다. 좋은 말할 때 술 좀 그만 마셔라?

- 에디터
- 이충걸(GQ KOREA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