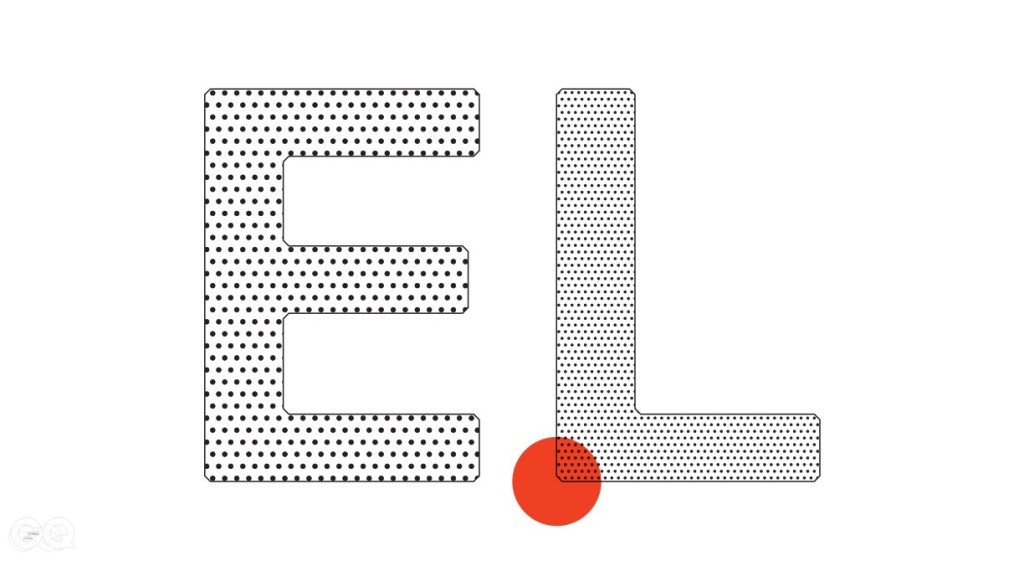열두 살 때 친구 집에서 보낸 크리스마스가 생각나. 작은 아이 세 명이 모여선 초코파이에 연필보다 가는 초를 몇 개 꽂고 환타를 땄어. (그때도 간간이 소주는 마셨지만 맛은 좀 없더라.) 옛날 크리스마스는 담벼락이든, 거실의 인조 소나무든, 아들 딸 방의 촛불이든 집집마다 불빛으로 칭칭 감겨 있었어. 입김을 뿜어내는 순록과, 호호호 웃는 산타와, 그 모든 것의 어리석음은 계단을 타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 새벽엔 볼이 빨개진 교회 애들이 남의 집 대문 앞에 모여 새벽 송을 불렀어. ‘그 어리신 예수.’ 일찍 깨어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보온병에 미리 뜨겁게 담아둔 커피를 마시게 했던 엄마 마음은 지금도 헤아리기 힘들어.
거리엔 버전도 몇 개 없는 캐럴이 기다리고 있었어. 상점마다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을 사람을 위해 상품을 진열한 것 같았지. 그건 누구의 꿈속이었을까. 손님을 개무시하는 재수 없는 가게라도 캐럴이 들리면 늙어 퇴직한 독사 선생을 마추친 듯 힘준 눈이 스르로 풀렸어. 어른들의 음정 그르친 찬송가조차 아이 우는 소리처럼 순수하게 들렸지. 팻 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오천 번 들어도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펄펄’은 고사하고 미세먼지만큼이라도 날리면 다들 강아지처럼 천진해졌어. 사람들은 순해진 얼굴로 모든 우화를 받아들였어. 그때만큼은 타인에게 간섭 따윈 하지 않았어. 비난도 삼갔어. 가슴이 뱉고 싶은 말은 축복뿐이었거든. 학력고사가 끝나 맘이 몽글몽글해져서였을까. 크리스마스는 커다란 집단 포옹과 같았어. 오직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당황스러운.
한 해의 첫날과 마지막 날 사이의 이름 없는 날짜를 생각하면 크리스마스처럼 중요한 순간도 없었어. 하루의 삶이 일기장, 얇은 종이에 깔려 납작해져도 크리스마스 때만큼은 빵처럼 부풀었단 말이야. 회한을 미뤄둔 채 지운 전화번호를 찾고, 찢어버린 관계를 붙이다 보면 녹지 않던 얼음도 녹더라.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은 중요한 게 따로 있어.
실은, 크리스마스는, 베들레헴의 작은 아기가 나의 메시아건 아니건, 새 장갑을 선물하(고 받)기 위한 구실이야. 자기 아들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걸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겠어? 현자들이 선물을 가져왔을 때 아냐? 그들은 만민의 왕이 나신 곳에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 시간을 내 쇼핑을 했단 말이야. 유향은 30퍼센트 할인 받았다고 해도 정말 귀한 거였다고. 몰약을 살 때 사막에 필요한 사은품 마스크가 끼워져 있었다면 그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기 예수도 말은 못했지만 선물을 한 아름 받곤 속으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두고두고 선물 때문에 시달리게 될 줄은 몰랐겠지. 물질 따위 아랑곳하지 않을 것 같은 제니스 조플린도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그랬잖아. “주님. 저 벤츠 한 대 사주세요. 친구들은 다 포르셰 탄단 말이에요. 절 사랑한다는 증명으로 컬러 TV도 사주세요. 완전 믿어요.” 이 노래 어디에 사상의 무게며, 중산층 물질주의의 풍자며, 현대 문화의 정신성을 대체하는 소비지상주의가 보인단 말이야? 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간구를 착란된 방식으로 응답하신 거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때 맘에 걸리는 게 좀 있어. 친구가 자기 선물이 별거 아니라면서 죄책감 섞인 홍조를 보일 때. 아니, 크리스마스에 날 생각해줬다는 것 만한 선물이 어딨어? 하지만 그때 상대를 위로한답시고 “헐 대박 사건!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맘을 잘 알아? 너 어서 미아리에 돗자리 펴라! !” 이딴 소리나 하는 내가 미워.
그렇게 매년, 별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어. 올해는… 나열할 필요조차 없네. 연옥이 시시할 정도. 내 동의 없는 황당함만 천지를 덮고, 상상도 못한 펀치에 실신하기 바빴지. 매일이 팔꿈치로 헤쳐나가야 하는 세로의 벽이 되어선…. 산문은 얼어붙고, 에피소드는 저급하며, 무능함은 수치화할 수도 없었어. 기댈 데라곤 사는 게 다 그렇다는,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밑도 끝도 없는 싸구려 아포리즘밖에 없었다니.
성황당풍 네온 간판이 눈화장처럼 번지는 거리. 캐럴 변주곡들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 두루 침투하고 있군. 하지만 이젠 잘 안 들어. 나이 든 이상 산타의 무릎에 앉을 수도, 그가 성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수염을 당길 수도 없어. 이젠 알아. 하늘의 영광이 비추지 않는 내 인생은 단지 수백만의 것 가운데 하나고, 모든 사람의 것만큼 제멋대로고, 곧 이름 없는 것이 될 이름 있는 임차권에 불과하다는 걸.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이면 예수가 권하던 당신의 붉은 피, 포도주를 마셔. 새벽에 엉거주춤 깨 성모 마리아를 찾지만 후회해도 늦지. 다음 날 어떤 기분일지 매번 겪으면서도 의미를 찾는 중독자처럼 원천으로 되돌아가니까. 그때마다 영원히 이런 반복에 갇힐까 봐 무서워. 끝에 다다라서까지 어떤 형태도 없는 – 더 정확히는 현재에 속해 있다는 것 말곤 아무것도 없는 – 인생이 될까 봐. 그래서 자꾸 혼자 묻게 돼.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줄까…. 물론 비탄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신의 권능(이자 오만)을 대하는 옳은 태도가 아니야. 악몽과 더 어두운 악몽은 구별해야 돼. 그래서 더 믿고 싶어. 어둠이 짙어도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 진실은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가치 있다는 말. 꼭 칼릴 지브란의 잠언 같지만….
지금 희미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건 강렬한 수분 부족의 후유증일까? 어쩌면 천사의 장엄한 날갯짓 소리는 아닐까? 유튜브에서 뿜어내는 오르간 연주가 날 어루만져. 충분히는 아니야. 하지만 살짝 죄의 짐을 벗은 기분이 들어. 결국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란 무엇으로부터든 누구로 부터든 잠시라도 쉬고 싶은 사람을 위한 작은 호의 같아. 근데 그건 그거고, 아기 예수가 어서 자라서 나쁜 사람들을 불로 싹 태워버렸음 좋겠어.
- 에디터
- 이충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