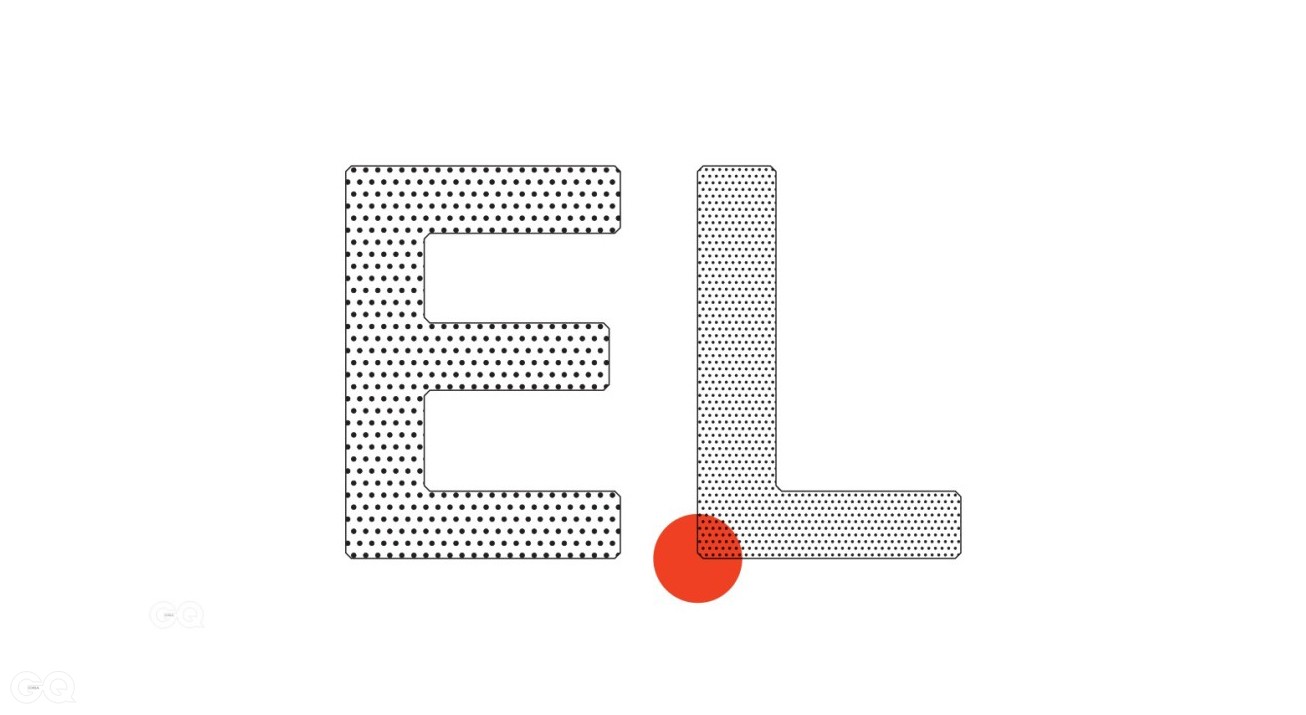열대 위의 적도선 같은 상상 속 경계선이 레스토랑 문화와 그것을 완전히 뒤집은 폭식 세계를 가르고 있다. 문화마다 화려함과 평범함, 부와 가난을 분류하는 금이 그어져 있기 마련이지만, 레스토랑만큼 풍부함과 초라함, 고상함과 천박함의 경계를 간결히 나누는 곳도 없다.(소금기 쩌는 캐비어, 풍부한 푸아그라, 잘 숙성된 브리 치즈처럼 기막힌 음식과 맛없는 음식 사이엔 아슬아슬한 줄자만 있다.)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먹기보단 감상한다. 관심을 갖는 만큼 관심 받고 싶어서…. 한편, 먹는 (스펙터클한) 광경은 쳐다볼 수밖에 없다. 먹지 않으면 죽을 바에야 먹는 행위야말로 생명을 이어가는 본능의 기초면서 인생론을 폭로하니까.
음식을 구강으로 퍼붓는 사람을 보면 저분, 혈거인이야? 매너의 소멸이야? 그랬는데, 모두 그걸 복있게 먹는다고들 하고, 또 그 사람은 그렇게 먹는 것으로 자기를 모든 방향에서 브랜드화하는 권세를 가지니, 사는 게 도무지 어리둥절하다. 그러건 말건 누군가 성인을 위한 식사 예절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 사업을 선점하면 내년 안에 빌딩 세 채 짓는다고 장담한다.
우린 빠른 89니, 4개월 선임이니, 위아래 따지는 덴 처절히 훈육되었지만, 식사 예절에 대해 딱히 교육받았달 건 없다. 어른이 먼저 수저 들기를 기다려야 하고, 밥 먹을 땐 쩝쩝 소리 안 내야 하고, TV 보며 먹지 말라는 것 정도? 식당 바닥에 떨어진 포크는 직접 줍지 말고 웨이터를 부르라거나, 팔꿈치는 테이블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상식은 자연스럽게 익혔다. 와인 잔을 부딪칠 때 눈을 맞추란 얘기는 이따금 들었으나 안구끼리 하는 프렌치 키스 같아서 그건 좀 부끄럽다.
레스토랑에 갈 땐 두려움이 하나 있다. 세상이 다 아는 새 규칙을 나만 모르면 어쩌지. 현실적이고 친숙한 논쟁은 매번 다른 형태를 취하지만, 처음 배운 예절 본능을 따르면 웬만해선 실수하지 않는다. 여자가 디저트 코스 전에 테이블에서 립스틱을 바르거나 콤팩트를 두드리는 건 괜찮다. 나이프를 거울처럼 들고 입 안을 살피는 건 귀엽다(고 해야 하나). 사실 수프에 빵을 담가 먹는 게 아직도 ‘불법’인지가 더 궁금하다. 식사 중 자리를 뜰 땐 냅킨을 어디 놓지? 테이블에 걸치나? 의자 위에? 붐비는 레스토랑에선 어떻게 신경 곤두선 웨이터를 부르나? 호칭도 스트레스야. 이모? 사장님? 여기요? 이모라 부르는 거야 그렇다 쳐도 이모가 왜 돈을 받지? 타이를 안한 나를 입장 불가 선언으로 정중히 낙담시킨 매니저에겐 뭐라고 한 소리 하지? 그래! 내가 죽일 놈이다! 장렬히 쏘아붙이고 딴 데 가나?
특별한 미식의 특정한 장애는 테이블 세팅이다. 스푼, 나이프, 버터 나이프, 3개나 되는 포크, 버터 그릇, 와인 잔, 냅킨을 식기들이 내는 음향 속에서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햄릿 독백쯤은 우스워진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꼭 수술 도구 같잖아. 대체 뭐부터 써야 하냐고…? 버터 나이프는 버터 접시 위에 올려두는 게 맞지? 근데 날은 어느 방향으로 두지? 오른쪽? 상대편? 아님 나를 향하도록?
주요리는 운전 면허장의 평행 주차 코스 같다. 일자 선에서 반대로, 똑바로, 얼마나 자주, 몇 번 운전대를 돌려야 할까? 누가 프렌치프라이는 포크로 먹어야 한다고 했지? 콩은 나이프로 살살 다루어 포크에 올려 먹으라지만 좀 서커스 같아. 그냥 확 손가락으로 집어 먹고 싶지만, 그건 도구가 아니잖아! 맘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닭고기는 나이프로 살을 바르는 대신 들고 뜯는 게 솔직히 더 맛있잖아….
가장 궁금한 건 포일에 싸인 버터를 다루는 법이다. 버터 덩어리를 나이프로 떼어낸 뒤 포일을 반으로 접어 접시 아래 밀어 넣으면 안 되나? 스파게티가 나오자마자 면 위에 타바스코 소스나 케첩을 뿌리면 날 죽일 까? 음식을 세 개나 시켰는데 각각 한 입만 먹고 남겼을 땐 어떻게 도망치지? 먹다 말고 커피를 따로 시키면 일행들 밥맛이 떨어질까? 코르크 냄새가 심한 와인을 무르는 적절한 말은 뭘까? 수프를 건너뛰고 싶을 땐 뭐라고 하지? 디저트 스푼과 포크는 역시 왼편에 두나? 나, 왼손잡이 아닌데?
레스토랑이란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과 시간을 담보로 음식을 먹는 곳도,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사람들을 가득 채워놓고 그들이 술 마시기만 기다리는 곳도 아니다. 정강이살 한 조각만 해도 사회적·환경적 비용이며 죄책감과 건강 문제며 얼마나 엮여 있는데! 이때, 개명한 레스토랑의 서비스는 유럽식 위계의 요소를 가져와 청교도적 노동 윤리를 섞은 다음, 잊고 있던 혁신적 문화의 요소 위로 던져 넣는다. 평등, 소탈함, 사회적 유동성, 무엇보다 재미. 하지만 손님에게 ‘굴종’하는 아시아식은 알지도 못한 채 오히려 이편을 주눅 들게 하는 유럽식 테이블 담당자는 어떻게 상대하지? 비싼 레스토랑에서 주춤거릴 때마다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뭐가? 하는 외침은 교회 지하실에서 참회하듯 납작 엎드린다. 그렇다고 비즈니스 식사에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 요리 학교라도 다니는 게 맞나? 서양인의 식사 관습을 배우자고 프랑스 보모를 두어야 하나?
수프와 파스타 코스 사이에서 숨을 고른다. 매너가 아무리 매끈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내가 좀 서툴러도 예절의 중요하고 소중한 특성은 관용 아냐? 그걸 설마 내 앞에 앉은 저 멋진 사람이 트집 잡겠어…?
가끔 최악의 공포를 본다. 처음엔 빛의 잔인한 트릭 같았는데 영안이 뜨인 듯 좀 전에 시킨 샐러드가 상대의 앞니 가운데 낀 걸 보면 암소처럼 망설인다. 그러다 그가 이쑤시개를 꺼내 이빨 사이사이를 헤집는 걸 보면, 아이씨, 통쾌하게 지적질해줄걸, 쓰라린 후회가 아롱진다. 그래도 끝까지 입을 다무는 게 어떤 매너보다 최고라고 혼자 생각한다. 시금치 잔해를 마저 씹으며 다음 행선지로 떠나간 그 자는 죽어도 모르는 일이지만.
- 에디터
- 이충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