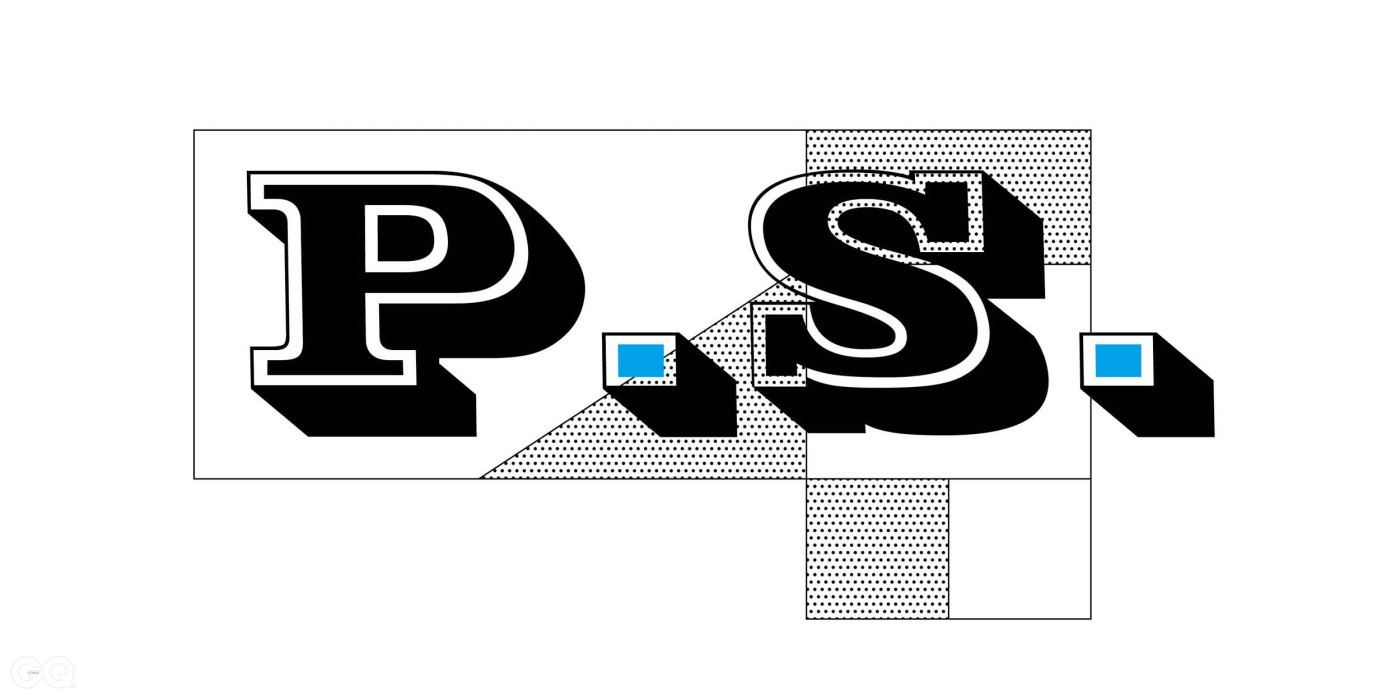작년 4월부터 테니스를 배웠다. 1년 후엔 서초구청장배 대회에 나가겠다는 허무맹랑한 꿈도 세웠다. 한데, 가을에 관뒀다. 비가 자주 왔고, 몇 번 못 나가게 되었다. 돈이 아까웠고, 억울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칠 수 있는 실내 테니스장을 알아봤지만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영 영장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여기저기 실내 테니스장을 알아봤지만 시간이 맞지 않거나, 레슨은 힘들다고 했다. 그동안의 사례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고비가 오면 이제 빠르게 포기하는 일만 남는다. 적어도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테니스만큼은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으로 이용하는 헬스장처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1월, 뭐든 시작해야만 하는 달, 바로 칠 수 있는 실내 테니스장을 찾았다. 레슨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주말 오전뿐. 매일 아침마다 테니스를 치던 내게 주말에만 테니스를 치는 건 어쩐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하필 잡지를 마감하는 날이 토요일이어서 날짜가 겹치기까지. 그러니까 나는 오늘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에 테니스를 치고 다시 회사에 왔다. 쓸데없는 바지런.
생각해보면 공으로 하는 운동만 좋아했다. 구기 운동을 좋아하는 많은 남자들 중 나도 그렇고 그런 한 명이라고 여겼다. 테니스를 처음 치던 날, 코치님이 “처음 치는 거면 엄청 소질 있는 거예요”라고 말해, 주변 사람들은 한 달 내내 말도 안 되는 자랑을 들어야 했다. 그 말이 진짜인지, 두 달 만에 포핸드, 백핸드, 스매싱, 포핸드발리, 백핸드발리, 서브까지 배우는 ‘기염을 토했다.’ 덕분에 나의 자랑은 석 달 넘게 친구들을 괴롭혔고, 테니스는 빠르게 금지 단어가 되었다. 물론 나중에 ‘일단 진도부터 빼서’ 인기가 많은 코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테니스에 대해선 말할 수 없었기에 모두에게 전할 수 없었다.
1월 1일 쿼츠Quartz에 마크 맨슨Mark manson이 쓰고, 뉴스페퍼민트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보다 나은 질문’으로 번역한 기사를 읽었다. 마크 맨슨은 록스타가 되고 싶었고 밴드를 할 것이라고 철저히 믿었지만 무거운 장비를 나르고, 매일 연습하고, 공연할 장소를 찾는 과정은 계속 미뤘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고생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된다.” 말하자면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자신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테니스는 고생을 즐기는 운동이 될 수 있을까? 헬스는 그 절대적인 목표인 멋진 몸이 왜 필요한지 납득이 되지 않고, 그 과정의 지루함도 견딜 수 없었다. 뛰는 것도 마찬가지. 유행하는 말처럼 이불 밖은 위험하다면 굳이 침대를 박차고 나오게 할 만 한 동기는 묘연한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즐겁게 견딜 수 있는 뭔가일 것이다. 테니스만큼은 공이 네트에 걸려도, 시원하게 코트 밖으로 보내도 마냥 웃음이 난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더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른다.
그동안 뭔가를 진득하게 해본 적이 없다고 믿었다. 어렸을 때 바이엘 상上에서 멈춘 피아노 학원, 빌딩보다 높게 쌓인 구몬 학습지, 덕선이처럼 앞에만 까만 <수학의 정석>으로 나를 판단했다. 누구나 하기 힘들지만 나는 해낼 줄 알았던, 반대로 누구나 힘들기에 내가 못해도 당연한 것들이 나를 끈기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냥 난 다수였을 뿐인데도. 그러니까 새해엔 즐길 수 있는 고통을 좀 더 찾기로 했다. 어쩐지 변태 같은 결론.
- 에디터
- 양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