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성은 자기만의 성을 쌓듯 작품도, 취향도 차곡차곡 올려간다. 이룰 꿈이 더는 없다고 말했지만 그건 불행하다는 뜻이 아니다.

원피스, 밧셰바 at 비이커. 시계, 다미아니.

원피스, 슈즈, 모두 디올. 펄 크로스 체인 네크리스, 아이 러브 미 롱 네크리스, 모두 파나쉬 차선영. 펄 레이어드 네크리스, 에스바이실. 팬더 링, 까르띠에.

트렌치코트, 조르지오 아르마니. 슈즈, 쥬세페 자노티. 밸런싱 링, 파나쉬 차선영. 소피아 링, 소피아 베젤 링, 모두 타니 by 미네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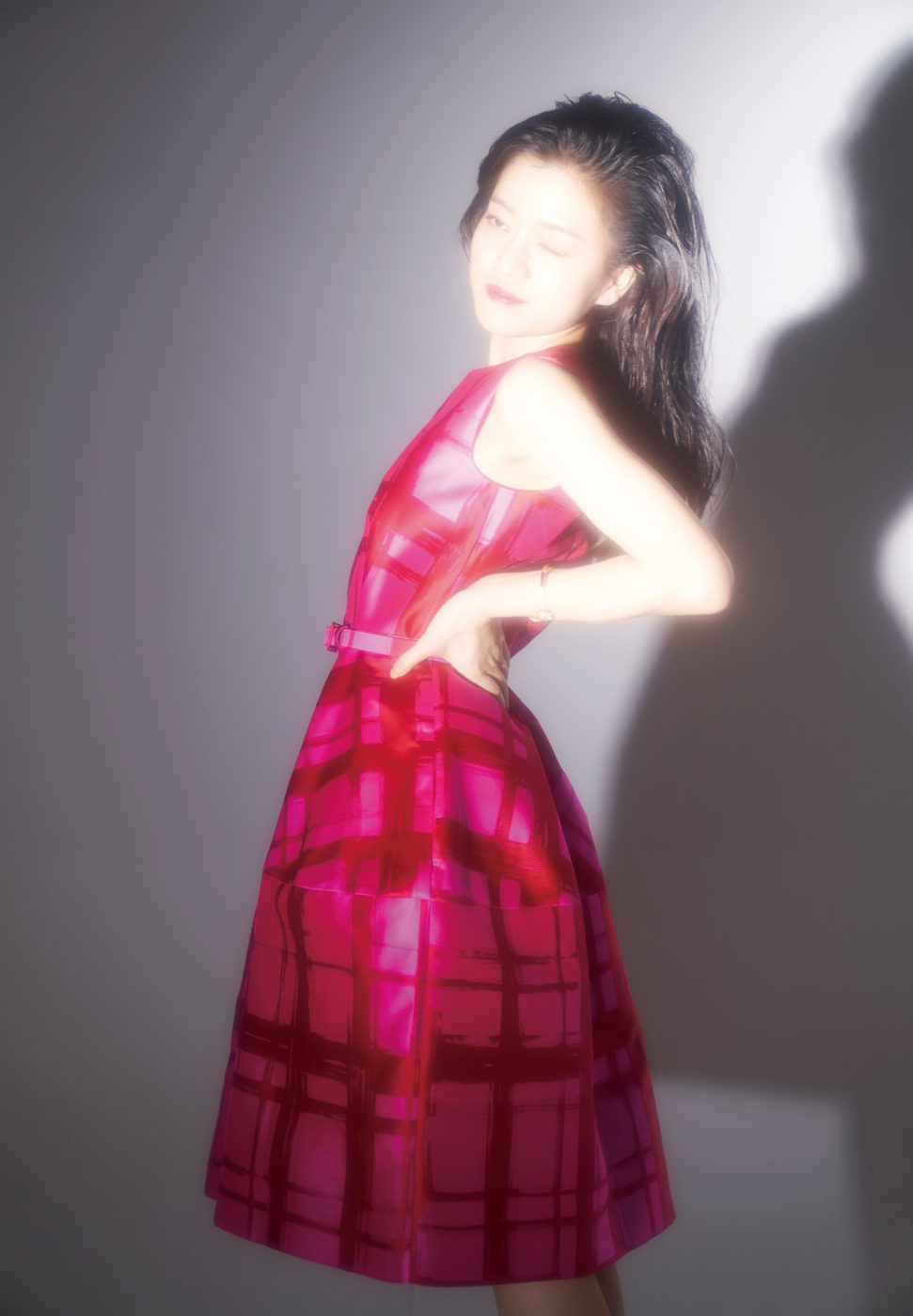
원피스, CH 캐롤리나 헤레라. 뱅글, 아뜰리에 스와로브스키.

원피스, 펜디. 슈즈, 로저비비에. 플라잉 플레인 링, 파나쉬 차선영.

드레스, 제니팩햄 at 마이도터스.

원피스, 에스까다. 몬나타 링, 글라스 젬 큐브 링, 고딕 링, 모두 타니 by 미네타니.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가 백만 관객을 돌파했네요. 축하해요. 무대 인사 다니면서 다 같이 저녁 먹을 때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모두 이런 흥행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유관순을 연기하기로 결심하는 게 쉽진 않았죠? 살면서 이렇게 큰 용기를 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존인물을 연기하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기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무거운 상상이 필요하더라고요. 독방에 수감된 신을 앞두곤 감독님께 5일만 달라고 하고, 그동안 관순처럼 단식을 했어요. 그땐 정말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마지막에 관순이 홀로 남은 신을 찍을 땐 어땠나요? 마지막 신을 마지막에 찍었어요. 다 함께 쓰던 방에 혼자 남으니 너무… 쓸쓸했죠. 하지만 비극적인 엔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독님은 꿈 많던 시절을 상상해보라고 하셨어요. 관순이 과거에 “난 신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라고 하잖아요. 그 순간은 결국, 신에게 가까워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카메라 밖에서 많이 울었죠. 모르겠어요. 왜 자꾸 눈물이 났는지. 울음이 날 때면, 아 눈물이 나겠구나, 인지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울음들은 다 예상 밖이었어요. 그냥 왈칵, 쏟아졌죠.
고아성은 자신이 믿는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본 적 있어요?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들이 그렇죠. 돌이켜보면 제가 연기한 인물들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라이프 온 마스> 나영, <풍문으로 들었소> 서봄, <괴물>의 현서까지 자기 줏대가 있는 인물들이죠. 유관순은 그 정점을 찍은 것 같네요.
4년 전에 고아성 씨를 만났을 때, 제게 “난 자존감은 낮은데 자의식은 높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인간적인 존엄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쉽지가 않아서”라고 했고요. 그 모습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나요? 지금도 배역을 통해 그 존엄함을 배우고 있어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가치를 좇는 유관순 열사를 통해서, <라이프 온 마스>의 꿋꿋한 윤나영을 통해서. 특히 이번 영화는 제가 믿는 걸 더 굳건하게 만들어줬어요.
어떤 걸 믿나요? 옳다고 생각하는 걸 굽히지 않는 것. 그런데 그건, 고집이 아녜요. 오히려 자유로운 거죠. 자기가 믿는 걸 믿을 수 있단 건 자유로운 거고, 관순은 거기에 자기 삶을 다 써요. 초월적인 사람이죠.
최근에 지키려고 했던 존엄성은 뭔가요? 사소한 것이라도. 음, 정말 누가 봐도 잘될 작품인데, 제 캐릭터가 매력이 없어서 깨끗하게 거절했어요. 후회도 됐지만, 어쨌든 제가 지켜오던 것을 지킨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끌리는 캐릭터를 연기하자는.
그때, “대중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사이를 좁혀가고 싶다”고도 했죠. 그간 두 편의 드라마를 통해 대중과의 거리를 좁혔을 것 같은데. <라이프 온 마스>의 윤나영을 맡아서 대폭 가까워졌어요. 수줍은 면도 있고, 그다지 비상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저를 진지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사실 윤나영이 제 실제 모습과 가장 가깝거든요. 그래서 편했던 구석도 있어요.
고아성이 비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네요. 연기만 봐도요. 하하. 아직도 전 이런 칭찬 들으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는 걸 못 고치겠어요.
더 칭찬하자면, <항거: 유관순 이야기> 첫 신에서 머리칼에 가려 있던 얼굴이 드러나며 카메라를 볼 때, ‘이래서 고아성이지’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카메라 너머를 응시하는 듯한, 눈빛이 가진 힘이요. 그 신에선 분명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응시의 힘은 고유하게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카메라와의 교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생각해요. 당신에게 카메라는 어떤 존재인가요? 첫 번째 관객. 어릴 때부터 연기해와서 카메라는 너무 익숙해요. 조금 불행한 점은, 종종 사람보다 카메라가 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영화 홍보로 방송을 하며 느낀 건데요, 같은 카메라인데도 기분이 너무 달라요. 영화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건 고아성의 말과 행동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방송은 그게 아니라 그냥 고아성인 거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고아성에겐 다 내보이진 않으려는, 자기 걸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 보여요. 코어 에고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확실하죠.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혼자 있어야 해요. 특히 부정적이거나 힘든 상황에서 그 경계가 뚜렷해지는 사람이에요. 고민은 혼자 해결하려 해요. 혼자일 때 더 현명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어릴 때부터 거의 모든 시절을 배우로 살아온 고아성에게 연기는 어떤 건가요? 예전엔 단순했어요. 어떤 배우가 한 연기처럼 하고 싶다거나. 그런데 이젠 다른 방향이 됐어요.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으면, 작품 외적인 것도 살펴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자랐고, 공백기엔 뭘 했고…. 정말 예술이란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제 연기는 제 삶보다 더 오래 남겠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뻗어나가면서요.
고아성의 연기는 고아성 이상의 것이다, 라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의 삶은 작품과 달라서, 그만큼 짧고 굵고 아름답기 어려워요. 백 퍼센트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드물걸요.
이전에 “작가가 아니라 작품을 믿는다”고 한 말도 그 연장이겠네요. 독자로서, 관객으로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하면서 겪은 심정이 그렇게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창작하는 입장에서도 작품 속 연기가 아니라 저란 사람 자체를 믿는다면, 부담스러워요. 하하하. 절 작품으로, 연기로 믿어주세요.
최근엔 어떤 책을 봤어요? 여태 허수경 시인님의 시만 읽다가 최근에 산문집 두 권을 읽었는데, 몰랐던 부분이 많이 보여요. 전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로 치면 <무뢰한>. 새벽의 스산한 공기, 아스팔트의 마른 질감 같은 것. 겪어본 적 없는데도 알 것 같은 그런 것에 열광해요. 사실 전 쓸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배우 활동을 하며 학교도 잘 다녔고요.
하지만 배우 자체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일이라서, 숙명적인 외로움도 있지 않나요? <본 투 비 블루>에서 쳇 베이커가 무대로 올라가는 시점 숏이 있어요. 문만 열만 수많은 관중이 기다리는 무대죠. 그 문을 열기 전 줌인을 하는데, 저릿했어요. 그 마음을 너무 알 것 같아서. 혼자 있을 땐 건조하고 색감도 없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사람들의 습기가 와락 쏟아져요. 그 연출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 온도 차, 습도 차. 아, 내가 먼저 표현했어야 하는데. 하하하.
사진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요즘엔 뭘 찍고 싶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아주 큰 사진집을 펼쳤는데, 진짜 늠름한 사진이 한 장 있는 거예요. 줌을 당겨 찍은 숲 사진이었어요. 요즘엔 다 휴대전화로 찍으니까 와이드한 사진에 대한 지겨움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가꿔지지 않은 숲을 찍고 싶어졌어요. 조만간 사진 여행을 가서 70mm로 진득하게 찍어볼까 해요.
고아성의 미감을 관통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bittersweet’에 가까워요. 전 취향으로 사는 거 같아요. 좋아하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요즘엔 뉴욕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강희 사진가의 초현실적인 사진을 좋아하고, 마이클 맥클러스키의 하늘 사진을 좋아해요. 보실래요? 좋아하실 거예요. 르네 마그리트 같죠?
이렇게 취향의 아카이브가 공유되는 것도 기쁜 일이죠. 정말요. 귀한 일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유대감을 느끼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항거: 유관순 이야기>의 배우들도 그랬어요. 무대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ktx 안에서 영화 맞추기 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스케이트 보드’라고만 해도 김새벽 언니가 “<파라노이드 파크>?”라고 맞춰버리는 거예요. 취향이 잘 맞는 사람들이라 좋았죠.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인 심리학을 전공했고, 인간을 표현하는 직업인 배우를 하고 있죠.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많나요? 그 애정은 영원할 거예요. 그런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일 싫어하기도 해요. 그게 오히려 끝없는 원동력이죠. 어쩌면 취향보다 큰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이 제일 재미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영화 홍보 차 찍은 영상에서 지나가듯 “전 꿈이 없는데”라고 한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꿈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해놓은 목표는 다 이뤘어요. 거창한 건 아니었고, 작품을 선택하는 배우가 되자, 그리고 작업실 갖기였죠. 음, 그래서 꿈이 없어요. 하지만 꿈 없이 원동력을 유지하는 법도 알게 됐죠. 어릴 땐 계속 꿈을 향해 나아가기만 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좋아하는 걸 그때그때 좋아하면서 사는 게 가치 있다고 느껴요. 그걸 알고 행복해졌죠.
요즘도 일기 써요? 그럼요. 쓴 지 12년 정도 됐네요. 이젠 일기장들을 감당 못 해서 컴퓨터로 써요.
오늘 일기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즐거웠다”라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 에디터
- 이예지
- 포토그래퍼
- 목나정
- 스타일리스트
- 현효진
- 헤어
- 임정선 at Musee Neuf
- 메이크업
- 서민주 at Musee Neu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