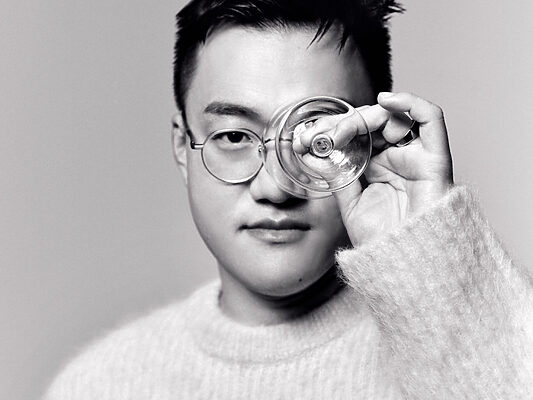장군을 부르면 멍군으로 응수한다.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컴퍼니(이하 디즈니), 아마존, 애플 등 공룡 미디어 그룹들의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 경쟁이 총성 없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곳간에 쌓아둔 돈을 풀고 또 푼다. 경쟁사를 인수 합병하기도 하고, 거장 감독과 계약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산업이다 보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눈 깜짝할 새 코 베이는 현실이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소식 은 디즈니의 훌루 인수다. 지난 5월 디즈니는 케이블 통신기업 컴캐스트와 함께 NBC유니버설이 가진 훌루의 지분 33퍼센트를 사들였다. 최소 2백75억 달러를 컴캐스트에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훌루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것이다. 훌루는 올해 1분기 기준 2천8백만여 명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스트리밍 업체다. “훌루는 최상의 TV를 대표한다. 각종 상을 수상해 작품성을 인정받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포함해 인기 TV 시리즈, 라이브 TV 쇼 등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갖춰, 디즈니의 소비자 취향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것이다.” 밥 아이거 디즈니 CEO의 말대로 훌루의 경영권을 이어받아 두둑한 라인업을 확보한 디즈니는 스트리밍 업계에 태풍처럼 등장했다.
픽사, 마블 스튜디오, 루카스 필름 등 내로라하는 콘텐츠 명가들을 줄줄이 인수하더니, 올해 초에는 5백24억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할리우드에서 세 번째로 점유율이 큰 20세기 폭스를 단숨에 인수한 디즈니의 광폭 행보는 무섭다.(지난해 기준 북미 점유율 1위 스튜디오는 디즈니, 2위는 워너브러더스, 3위는 20세기 폭스다.)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사들인 것을 두고 미국 언론은 “디즈니는 20세기 폭스가 가진 라인업만큼이나 훌루 지분 30퍼센트를 확보하는 게 시급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아성에 도전하려면 훌루를 안정적으로 지배할 힘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디즈니에게 온라인 플랫폼은 그룹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업이라는 뜻이다. 디즈니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를 올해 말 론칭하기로 했고, 2024년까지 25억 달러를 투자해 50편 이상의 오리지널 시리즈, 10편 이상의 오리지널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 5백 편, TV 시리즈 1만 편의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넷플릭스에 디즈니 콘텐츠 배급을 중단한다.
그렇다고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도전자 디즈니에 기죽을 넷플릭스가 아니다. 넷플릭스는 구독자 1억 4천1백만여 명을 보유한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인 동시에 할리우드의 어떤 메이저 스튜디오보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스튜디오다. 지난해 디즈니가 10편, 워너브러더스가 23편의 영화를 만드는 동안 넷플릭스는 82편의 영화를 제작했으니 말 다 했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를 포함해 코언 형제의 <카우보이의 노래>, 폴 그린그래스의 <7월 22일>, 봉준호의 <옥자> 등 거장 감독의 영화를 제작해 비평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매달 8~14달러를 지불하는 충성스러운 가입자는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넷플릭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1억 2천5백만 여 명이 소비한 게임 <포트나이트>를 꼽았다. 헤이스팅스는 “우린 HBO와 경쟁하는 것 이상으로 포트나이트와 경쟁한다”며,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과의 경쟁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구독자의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구독자를 만족시킬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올해 콘텐츠 제작에만 1백30억 달러를 지출한 넷플릭스를 두고 골드만삭스는 “2022년에는 넷플릭스가 연간 2백2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 금액은 현재 미국의 모든 네트워크 및 케이블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투자한 금액 총합과 큰 차이 없는 숫자라 하니 어마어마하지 않은가.
넷플릭스나 디즈니에 아직 비할 바 아니지만 애플 또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정체를 드러냈다. 지난 3월 애플은 새로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TV+를 공개하고, 올가을 전 세계 1백개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다. 미디어 행사에서 공개된 애플TV+ 라인업은 화려하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980년대 인기 TV 시리즈인 <어메이징 스토리>를 다시 끄집어내고, J. J. 에이브럼스는 세라 바렐리스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리틀 보이스>를 제작한다.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심리 스릴러 <서번트>를, 소피아 코폴라 감독은 <온 더 룩스>라는 신작을 연출한다. 제니퍼 애니스턴, 리즈 위더스푼, 스티브 카렐은 토크쇼 제작 뒷이야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 <더 모닝쇼>에 출연하고, 브리 라슨은 여성 CIA 요원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를 제작하는 동시에 주인공을 연기한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플을 통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고,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하루빨리 구축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독료는 필수다. 한편 로버트 앨런 아이거 디즈니 회장이 경제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애플 사외 임원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 디즈니는 애플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디즈니와 애플이 공동 전선을 펼쳐 넷플릭스에 대항하진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
이 밖에도 아마존은 ‘프라임 비디오’라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HBO 드라마를 모은 ‘HBO 나우’나 CBS 드라마 및 TV 쇼를 감상할 수 있는 ‘CBS 올 엑세스’ 같은 제3자 구독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한다. 2010년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아마존 스튜디오를 설립해 오리지널 콘텐츠도 제작한다.
공룡 미디어 기업들이 앞다투어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는 이유는 간단하다.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환경 덕분에 영화나 드라마나 TV 쇼 같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관객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간 또한 늘고 있다. 젊은 관객들은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하는 매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방의 TV나 스마트폰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감상하는 게 더 익숙한 세대다.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영화적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어른 세대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스마트폰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감상하는 젊은 세대들의 만족감을 충족시키려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디즈니, 애플, 아마존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산업 후발 주자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선두주자 넷플릭스가 보유한 구독자 수 1억 4천8백만여 명과 그들의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빼어난 영화를 만들어내는 프로덕션 능력을 뛰어넘기란 쉽지 않다. 새로 뛰어든 기업들이 인지도를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도 그래서다. 한편으로는 넷플릭스와 경쟁자들의 공존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레치먼 리서치 그룹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북미 4천3백만 가구가 이미 1개 이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모두가 보고 싶어 하는 뛰어난 콘텐츠에 대한 입소문이 돌면 그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 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인가’보다는 ‘무슨 콘텐츠를 선보이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가입자 수도, 이 사업에 뛰어든 시기도, 확보한 콘텐츠 규모도 제각기 다르지만, 모든 기업이 흥행과 비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기를 쓰는 것도 단순히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는 것만으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전자들이 넷플릭스의 아성을 뛰어넘든 넘지 못하든, 분명한 건 이 숨 막히는 경쟁 덕에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호강할 일만 남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지금 벌어지는 공룡 미디어 기업들 간의 전쟁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다. 글 / 김성훈(<씨네21> 기자)
- 에디터
- 이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