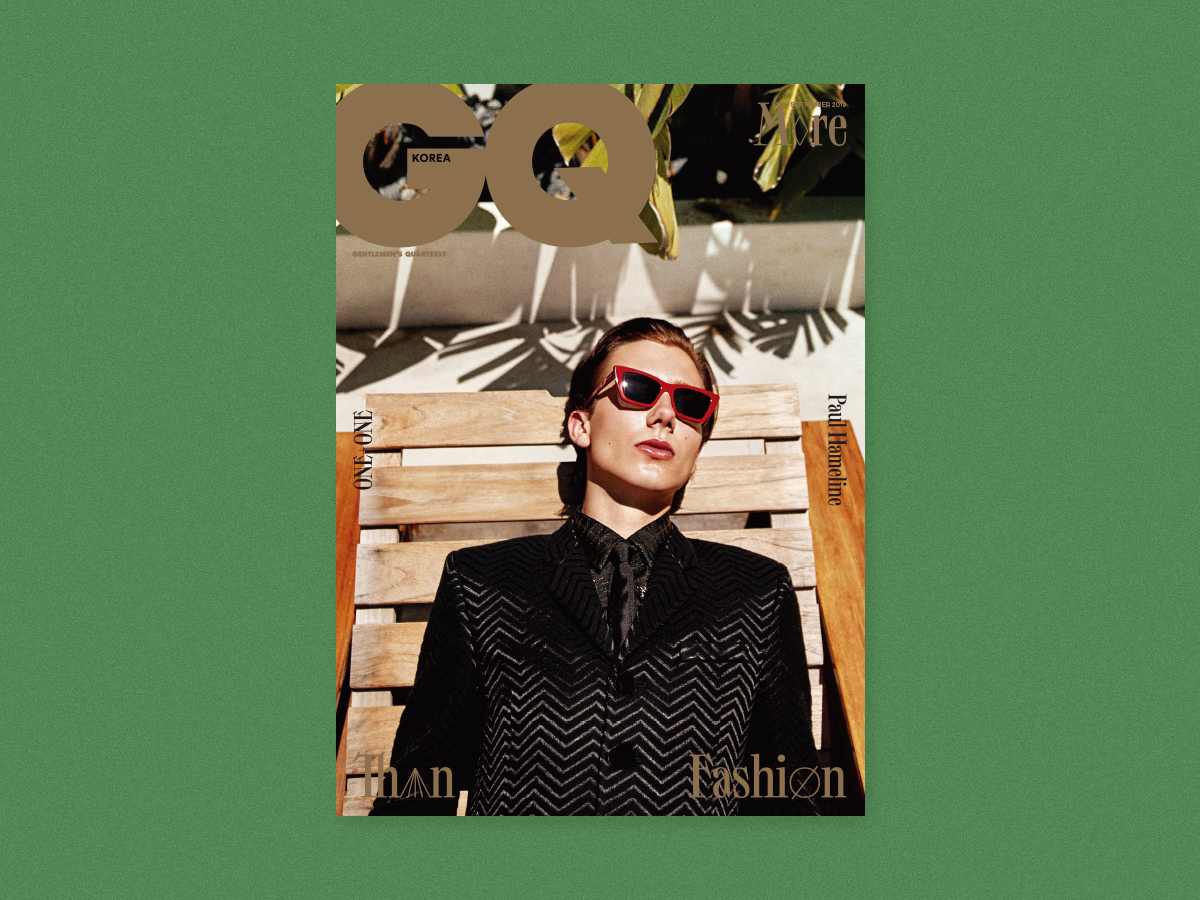
비가 난폭하게 오는 어두운 아침, 데이비드 밀스는 길에서 파는 인스턴트커피 두 잔을 사서 우산도 없이 사건 현장에 간다. 낡은 트렌치는 축축하게 젖어 어깨에 무겁고 검게 달라붙었고, 거칠게 자른 머리에선 물이 뚝뚝 떨어진다. 폭우 속에 내내 들고 있던 커피는, 컵부터 주글주글해졌으니 마시기엔 글렀다. 어차피 맛도 없을 테고.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세븐>을 틈만 나면 보는데 이 장면은 그냥 무조건 최고다. 브래드 피트는 그 전엔 파란 눈으로 예쁘게 웃는 고고 보이 같아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이 영화 이후로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상처 자국이 남은 마른 뺨과 멋대로 자란 수염, 치수가 안 맞는 구겨진 셔츠, 더러운 깁스와 너저분한 반창고. 아직 다 자라기도 전에 버려진 사냥개처럼 광폭하고 맹렬하고 충동적이지만, 연약하고 슬퍼도 보여서 속절 없이 마음이 간다. 영화에선 거의 모든 요일에 비가 온다. 밀스는 뿌옇게 김이 서린 젖은 도시에서 과속 운전을 하고 흐릿한 단서를 찾고 싸구려 피자를 먹고, 흠씬 얻어 맞고 코가 부러진다. 연쇄 살인 사건을 맡은 형사에게 밤낮이 따로 있을 리 없으니, 그는 매일 축축한 채로 밤을 새운다. 그러다 짬이 나면 어디든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잠든다. 영화를 보는 내내 밀스의 피로가 온몸의 신경을 통해 온전히 전달된다. 피곤해 죽겠고 졸려서 눈도 못 뜨겠으며 셔츠는 넝마가 되었고 신발은 눅눅한 데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몸 안에 니코틴과 카페인만 처덕처덕 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고독하고 치열하며 타르처럼 절대적으로 끈끈한 피로. 하도 안됐어서 어서 데려다가 아주 뜨거운 물에 오래 씻긴 후 좋은 냄새가 나는 큰 타올로 닦아주고 싶어진다. 그러고는 무겁고 투박한 잔에 가득 따른 독한 술과 센 불에 구워서 거뭇하게 탄 자국도 있는 커다란 스테이크를 2킬로그램쯤, 혼자서 천천히 먹게 두면 좋겠지. 어느 날, 친구들은 매달 악랄한 마감을 치르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않는 내게 드디어 이유를 찾았다고 말했다. “너는 그놈의 망할 피곤에 중독됐어. 중증이라 약도 없어. 완전 쩔었어.” 얘기를 듣고 보니 과연 부정할 수 없었다. 영화든 소설이든, 특히 빠져서 보는 대목엔 언제나 밤새워 뭔가를 하고 천신만고 끝에 아침을 맞아 눈은 쾡하고 뺨은 꺼지고, 허기지고 힘들고 기진맥진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들에게서 이상하고 아름답고 뜨거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가령, 밤샘 취조를 끝내고 마침내 자백을 받은 형사가 경찰서 밖으로 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에 흠칫 놀랄 때, 담배를 허파 깊숙이 빨아들이고 새파란 연기를 날릴 때, 동트는 걸 보면서 부드럽고 작게 웃을 때, 집에 와서 차가운 맥주를 단숨에 마시고 소파에 앉은 채로 잠이 들 때, 이웃들이 아침을 맞는 부산한 소리가 멀리서 연하게 들릴 때, 그 모든 장면이 끔찍하게 멋지다. 마음속에는 늘, 스스로를 극한까지 밀어붙여 몽땅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폭력적인 욕망이 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 후의 (정작 보잘 것도 없는) 보상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침대에 몸이 꺼질 듯 녹는 기분을 느끼며 잠들고 싶고, 쫄쫄 굶다가 먹는 따뜻한 음식의 풍요로운 맛을 느끼고 싶다. 얼음을 넣지 않은 호밀 위스키를 잔 밑바닥까지 탈탈 털어 피곤에 녹다운된 몸에 콸콸 들이붓고 싶다. 그렇게, 못생기고 고단하고 넌덜머리나는 밤의 끝에 맞는 평범하고 안락한 평화. 얼마 전 알레르기 때문에 눈두덩이가 비정상적으로 부어올랐다. 엄청나게 빨갛고 길바닥에 버려진 중화 만두처럼 기이하게 찌그러져서, 주변에선 가뜩이나 귀염성 없는 얼굴에 또 어쩔 거냐고 걱정이 주렁주렁이었다. 정작 나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건 마치 12라운드에서 케이오승을 거둔 복서 같잖아. 나쁘지 않은데.’
- 에디터
- 강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