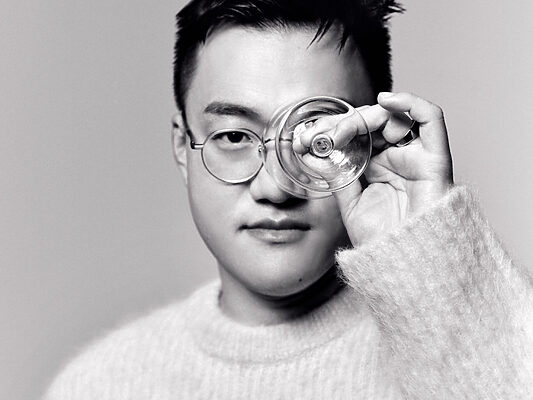원하는 누구와도 일할 수 있을 톱 프로듀서지만, 그는 매일같이 스튜디오에 가고, 바이닐을 모으고, 피아노로 곡을 쓴다. 옛날 사람 같은 말만 하지만 어쩌면 지구에서 가장 세련된 사람, 마크 론슨과의 인터뷰.

체인 로고 가죽 재킷, 루이 비통.

블루 체커 보드 니트, 네이비 팬츠, 옐로 보트 슈즈, 모두 루이 비통.

싱글 재킷, 플리스 피케 티셔츠, 루이 비통. 골드 워치는 마크의 것.

레더 봄버 재킷, 멀티 컬러 니트, 블랙 진, 블랙 보트 슈즈, 모두 루이 비통.

멀티 컬러 윈드 브레이커, 루이 비통.

체인 로고 레더 재킷, 블랙 진, 모두 루이 비통. 블랙 터틀넥은 에디터의 것.


컬러 포인트 화이트 데님 재킷과 카고 팬츠, 모두 루이 비통.

멀티 컬러 윈드 브레이커, 옐로 보트 슈즈, 모두 루이 비통. 블루진은 에디터의 것.

네이비 수트, 블루 셔츠, 블랙 앵클부츠, 모두 루이 비통.


그레이 터틀넥, 스트라이프 울 팬츠, 인더 포켓 선글라스, 모두 루이 비통.

그레이 더블 수트, 화이트 스니커즈, 모두 루이 비통. 티셔츠는 에디터의 것.

멀티 컬러 플리스 재킷, 루이 비통.
파리에는 이번엔 하루만 있나? 패션위크와 <지큐> 커버 촬영. 스케줄이 그렇다. <지큐> 코리아의 스태프들은 멋지더라. 모두 쿨하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편인가? 음, 그렇다. 누구든 잘하기만 하면 된다.
예바, 리키 리처럼 잘하는 젊은 뮤지션은 어떻게 찾아내나? 글쎄,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새 음악을 찾는 과정과 거의 같은 방식일 것 같다. 나는 지금도 디제이다. 처음 디제잉을 시작했을 때 새로운 음악을 발굴해내는 게 정말이지 좋았다. 지금도 그걸 계속하는 것뿐이다. 에이미 와인하우스, 킹 프린세스, 두아 리파…, 나와 처음 일할 때까지만 해도 신에서 그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프로듀싱 과정이라는 건 최적인 사람을 찾아서 최대의 결과를 내는 일종의 해결사 같은 작업 아닌가? 뭔가를 함께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채로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같이 일하는 뮤지션들의 에너지를 고려해서 좋은 기회들을 만드는 일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킹 프린세스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섬세하게, 그렇지만 결국 최대치를 끌어내는 당신의 능력에 대한 언급을 봤다. 괜찮은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보냈던데. 각자 컨디션이 다르니까 그날따라 누군 잘하고 누군 조금 별로일 수도 있는데, 3일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잘 나오면 된다. 결국 그냥 ‘계속 노력하는’ 거다.
자유로운 영혼의 아티스트와 완벽한 비즈니스맨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나?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나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관리해보려고는 한다. 일을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직업 윤리를 배우면서 컸고, 또 아티스트의 자유분방하기만 한 이미지 이면의 삶-매일 스튜디오에 가서 음악을 만들고 뭔가를 창작해야만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에 대해 아는 거다. 아무리 뭐 스케줄이 어쩌고, 기분이 어쩌고 해도 내 뇌가 알고 있다. 해내야 한다는 걸.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당신의 스케줄은 좀 살인적인 데가 있다. 내 매니지먼트 팀이 최소한 말이 되는 일정을 짜주고는 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나가 놀고 술도 더 많이 마셨다. 지금은 그때보단 시간이 많다. 하하. 더 건강해지려고 하고, 명상하고, 운동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신을 관리하는 데 일 외의 시간을 쓰니까 아무래도 생산성이 더 올라가는 것 같다.
그저 널부러져 있는 때는 없나? 물론 나한테도 휴일이 있긴 하다. 그런데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소진되는 느낌은 아니다.
스스로를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하나? 그랬었다. 지금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뭐가 좋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몰아붙이진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진짜 놀라운 게 뭔 줄 아나? 좋아하는 걸 무섭게 많이 한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의 기쁨을 위한 각각의 속도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다. 맹점은 창작의 모든 과정이 드라마틱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오해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실 그냥 꾸준히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저력이 되기도 한다.
당신의 음악적인 세계관은 꾸준하다. 이걸 80년대 감수성이라고 퉁쳐서 말해도 괜찮을까? 난 그 시기가 좋다. 내가 자란 시기다. 내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게 된 이상 다른 걸 만들 수가 없다. 당신은 내 음악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했지만, 내가 영향 받은 모든 요소가 합쳐진 다음에 나를 거쳐 새로운 걸로 나오는 거다.
앨범 <Late Night Feeling>을 냈을 때 인터뷰에서, 이혼 후에 느낀 감정들에 대한 음악이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그건 아주 개인적인 앨범이었고, 개인적이어야만 했다.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과 그 이후의 감정들로 채운 음악인데, 모른 척하고 앨범만 낸 후 입을 닫고 있을 순 없었다. 그리고 더 괜찮은 음악을 만들려면, 그 길을 택하는 게 낫다 싶었다.
인생에서 음악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가장 이른 기억은 내가 어린이용 드럼 셋을 갖고 있었다는 것? 네다섯 살 정도였을 때 부모님이 사줬다. 드럼 다음에 기억나는 건…, 가족들 앞에서 공연하는 걸 좋아했고, 작은 소니 레코더로 뭘 잔뜩 녹음해두곤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난 듀란듀란을 정말 사랑했다.
상당히 많은 악기를 다루는데, 어떤 악기가 당신의 음악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나? 피아노인 것 같다. 나는 목소리가 들어가는 음악을 하기 때문에, 피아노의 소리와 피아노의 언어가 가장 영감을 준다. 개인적인 취향으론 잼도 좋아하고 빅 밴드도 좋아하지만, 노래를 만드는 작업에는 피아노가 가장 적합하다.
당신이 뮤지션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지금도 여전히 악기로 음악을 만드나? 그렇다.
프로그래밍으로도 음악을 만드는 게 가능한 시대인데. 나는 하던 대로 한다.
1990년대 초 뉴욕의 언더그라운드 힙합 클럽에서 디제잉을 시작했던 게 당신의 첫 번째 음악적 커리어다. 힙합에 대한 사랑은 아직도 간직하고 있나? 물론, 당연히 그렇다! 생각해보면 힙합이 많이 변했다. 자라면서 들어온, 내가 사랑한 힙합은 우탱 클랜이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의 힙합과는 많이 다르긴 하다. 내가 좋아한 올드 힙합은 아직도 거의 매일 듣는다.
힙합도 패션도 미디어도 약속이라도 한 듯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구식이 되는 세상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헷갈린다. 가끔 씁쓸하기도 하지 않나? 나는 한 번도 트렌드를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알 필요는 있다. 내가 전혀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해도, 일단 흐름은 파악하고 있고, 다 들어는 본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원하는 걸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거든. 지금 당장 클럽에 가보면 수십 명의 디제이가 엄청나게 많은 유행가를 가져올 것이다. 거기서야 뭐 음악이 진짜건 아니건 춤추는 데 지장이 없지만, 진짜가 아니면 다시 그 음악을 찾아 듣지는 않게 된다.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나? 그저, 오래 한 업계에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배우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거 하나가 남았다.
쇼 비즈니스 업계엔 사기꾼이 많은데, 당신의 깨달음엔 흥미로운 역설이 있다. 그렇다. 그들이 사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내 세계에 그들은 들어올 수 없다.
- 에디터
- 박나나, 허람
- 포토그래퍼
- JDZ Chung
- 글
- 이경은
- 헤어 & 메이크업
- Valiyii at HMC Paris
- 프로덕션
- 정민혜
- 로케이션
- Ritz Par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