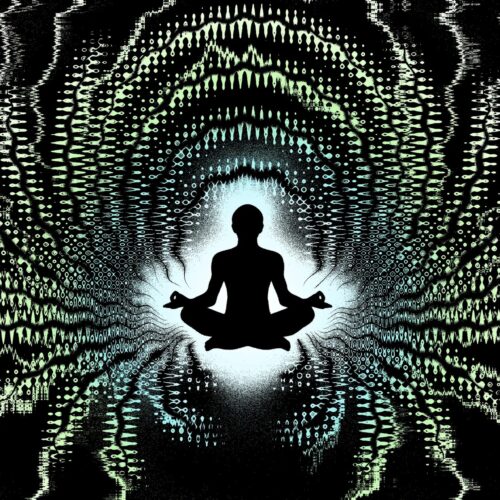추위라면 질색이지만 오로지 코트 입을 생각으로 겨울을 기다린다. 아주 추운 휴일, 두꺼운 머그잔으로 커피를 잔뜩 마시고 큰 종이컵에 한 잔 더 가득 담아서 익숙한 검은 울 코트를 입고 오므라이스나 라구 파스타 같은 가벼운 점심을 먹으러 외출하는 걸 좋아한다. 몇 해 전에 산 구찌 블랙 코트는 남성용이라 어깨가 크고 품도 넓은 와중에 다른 건 그대로 두고 소매 길이만 줄여서 뭐랄까, 로봇 찌빠 같은 복고적이면서도 미래적인, 터무니없는 셰입이 도저한 자랑거리다. 재킷이든 코트든 셔츠든, 윗 옷은 소매를 짧게 입어야 예쁘다고 믿지만, 가끔 수선이 과하게 될 때가 있고 이 코트도 단골 수선집 아저씨의 대범한 가위질에 소매의 반을 속절없이 잃었다. 어쨌거나 코트라면 계절마다 과감하게 사서 제법 많이 있는데도 이 검은 코트를 자주 입는다. 장식이 전혀 없는 수수한 디자인도 좋고 캐시미어와 울이 반쯤 섞여 소프트하면서도 적당히 견고한 형태는 더 좋다. 무엇보다 검은색의 농도가 아주 마음에 든다. 세상엔 무수히 많은 검정이 있지만 이처럼 세련된 검은색은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 코트 안에는 거의 매번 낡은 록 밴드 반팔 티셔츠와 그레이 진을 입고 첼시 부츠를 신는다. 옷들은 자주 세탁해서 얄팍하게 해지고 섬유 유연제 향이 운명처럼 배어 있다. 날씬한 옷 위에 부드러운 코트를 감기듯 ‘휘리릭’ 입는 기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둔탁하고 무딘 겨울 속으로 낭창낭창이랄까 휘청휘청이랄까 그처럼 가볍고 나긋하게 들어가는 기분. 그 맛에 미욱한 패딩이나 뚱뚱한 털옷은 생각도 안해 봤다. 결은 다르지만 일종의 지적 허영이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입고 현관에 선 채, 앰버 베이스의 향수를 서너 가지 섞어 뿌린다. 어떤 날은 배합에 실패해 가죽 소파나 물담배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잘되는 날의 살짝 매캐한 향은 울 코트와 굉장히 멋지게 어울린다. 향기가 제 아무리 좋아도, 겨울 백합처럼 한 떨기인 듯 차갑고 날렵하게 입었어도,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온몸은 스위치를 당장 올린 듯 즉각적으로 떨린다. 떨림의 강도로 볼 때 채신머리 없기가 오래된 환풍기나 최신 전동 드릴은 그냥 다 우습다. 보는 사람이 수상쩍게 여길 만큼 덜덜 떨면서 차에 타면 거기엔 더 혹독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다. 전시장에서 한번 보고 첫눈에 반해 산 소프트 톱 숏바디 SUV는, 운전자를 날씨와 계절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는 그런 조물주적 매력이 있다. 차체의 반이 조금 두꺼운 천막인 차 안의 온도는 바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장해서 말하면 신발에 바퀴를 달고 조금 큰 커튼을 뒤집어쓴 채 바람을 간신히 막으면서 도로 한복판을 달리는 것과 비슷하다. 온몸을 요란하게 떨면서 낡아빠진 니트 비니를 쓰고 커피를 줄줄 흘리면서 약속 장소에 간다. 조니 미첼의 ‘River’를 반복해서 듣다가 ‘I made my baby cry’ 가 나오는 대목에선 볼륨을 조금 줄인다. 도착해서도 한동안은 의지와 상관없이 부르르 진동이 남아 있지만 곧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서 위스키 반 잔과 함께 늦은 점심을 천천히 먹는다. 이렇게 겨울은 위스키의 계절, 앰버의 계절, 조니 미첼의 계절, 님의 계절… 무엇을 붙여도 그럴싸하게 어울린다. 하지만 12월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저 검은 코트라고 답하겠다. 잔혹한 계절을 보내는데 필요한 조처로 코트 몇 벌은 실 없이 느껴지긴 하지만.
최신기사
- 에디터
- 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