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가요. 가볍거나 얇거나 작아서 어디든 함께하기 좋은 지적 지도, 신간 6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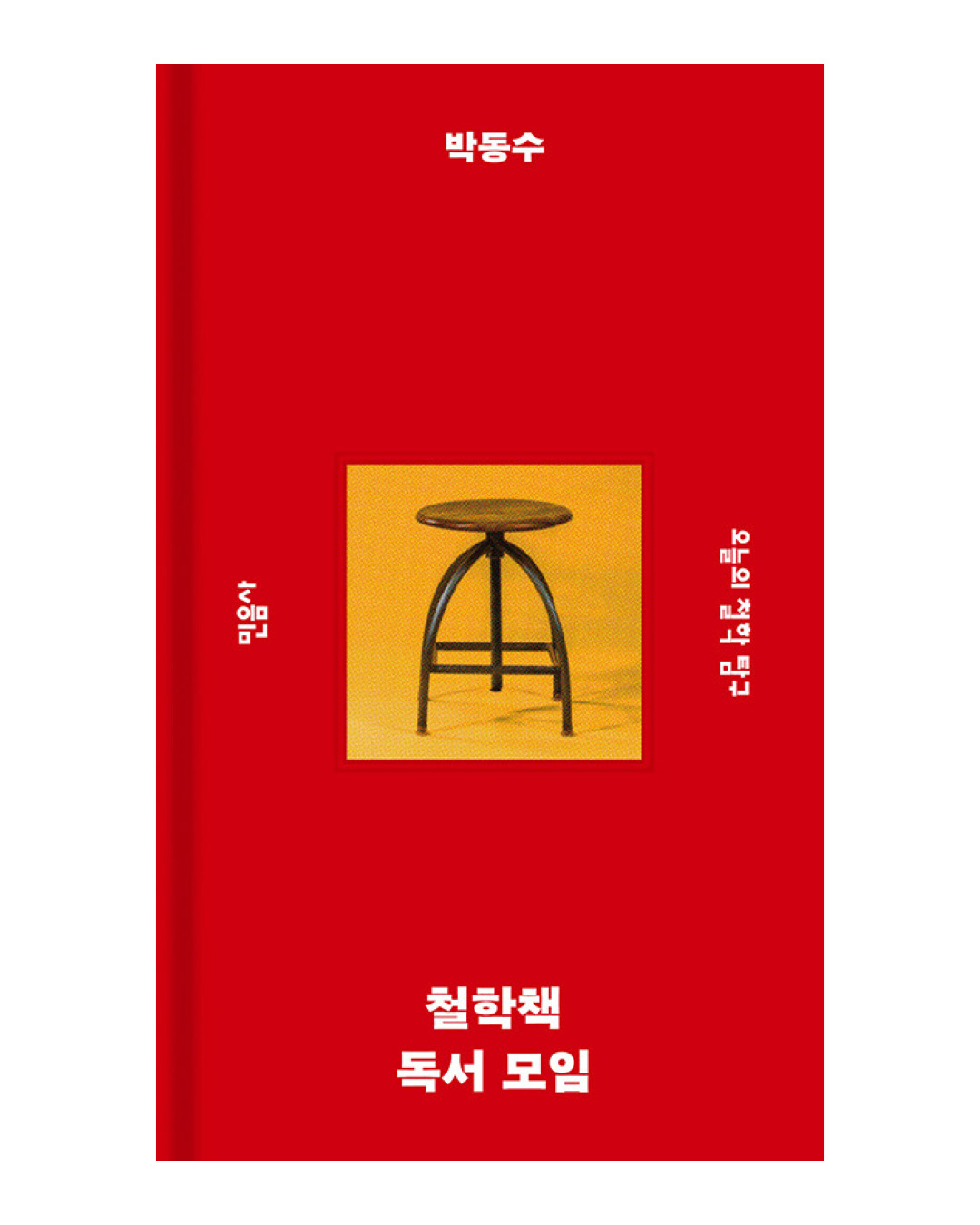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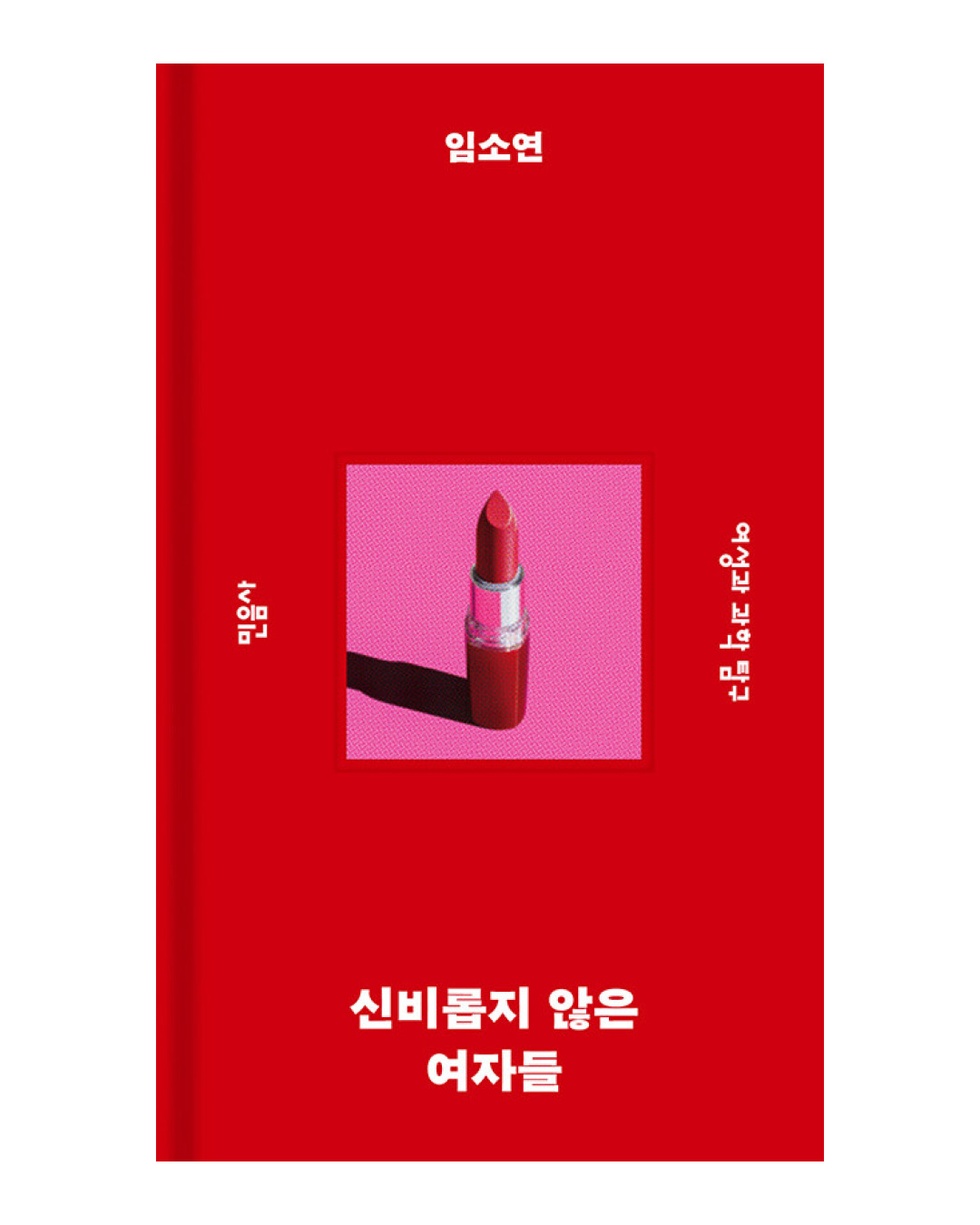
탐구 시리즈 ㅣ 민음사
<오늘의 철학 탐구: 철학책 독서 모임>, <여성과 과학 탐구: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동시대 문화 탐구: 뭔가 배 속에서 부글거리는 기분>···. 제목만으로도 그 안에 담긴 지식이 묵직할 것 같은 와중에 실물은 한 뼘이 채 되지 않는 세로 길이, 손에 착 감기는 아담한 판형이다. 실제로 편집팀의 “집에서나 출근길에서나 일상 속에서 독자와 함께하려는 바람”을 담았다 한다. 아담한 외형을 떠나서, 탐구 시리즈의 첫 번째 책 <철학잭 독서 모임>에는 “(나는 자기대화 또는 자신과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대화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화는 언어 게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는 가라타니 고진의 메시지를 기둥 삼아 서로 다른 인간과 인간 사이를 잇는 사유와 대화거리가 그득하고, <뭔가 배 속에서 부글거리는 기분>은 진솔한 비평을 찾기 힘든 요즘 모래밭에서 발견한 바늘 같다. 인문사회과학을 알차게 담은 탐구 시리즈의 다음 책도 고대 된다.
<나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혐오하고> 서효인 ㅣ 문학동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 집의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저녁을 먹으며 평소 친애하는 시인에게 가르치듯 말했다.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후회한다. 요즘 하는 말이 대체로 그런 식이다. 함부로 말하고 깊이 후회한다.” 책 날개에 적힌 시인의 말을 읽자마자 그 길로 이 시집을 가방에 넣었다. 함부로 말하고 깊이 후회라도 하는 사람의 흔적이니까. 시인은 시를 후회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했지만, 글쎄. 뒷덜미가 끈적해질 때마다 두 어장씩 펴보는 시집에는 얼음장이 한 움큼씩 꽂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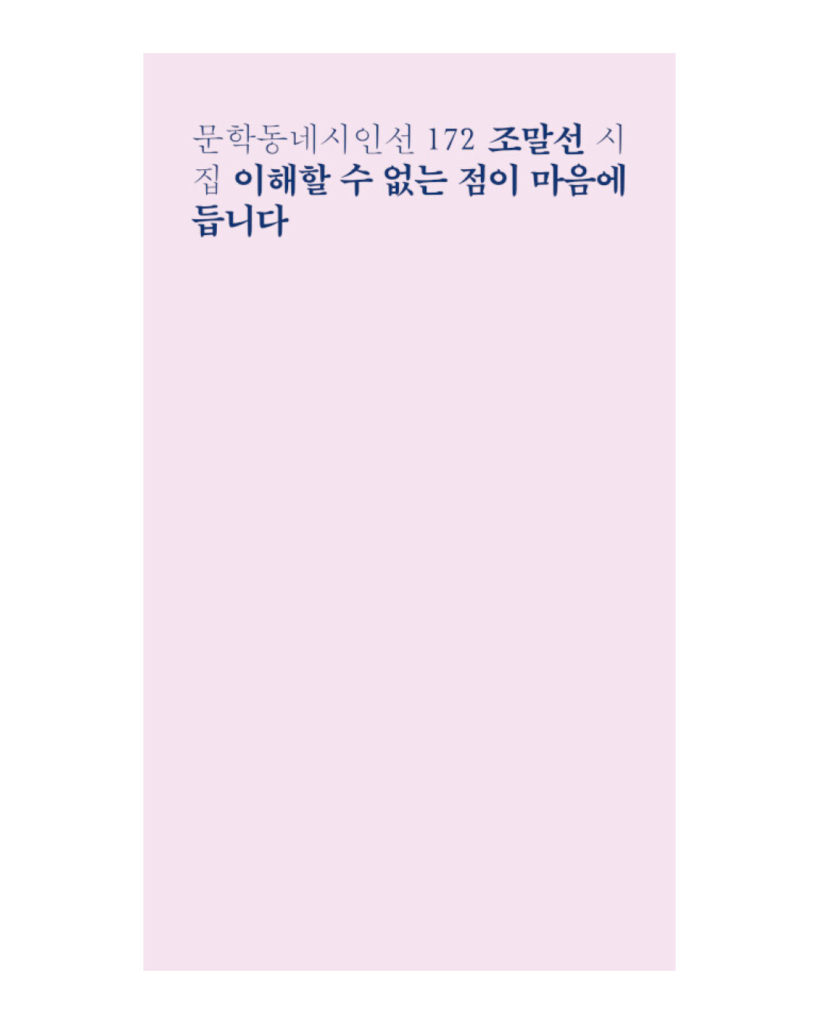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조말선 ㅣ 문학동네
손을 뻗게 되는 시집은 대체로 이런 식이다. 단숨에 제목이 좋다. 후루룩 넘기다 채이는 문장이 좋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서,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에 든다. 조말선 시인이 남겼고, 내 마음에 든 문장으로는 이런 것이 있다. ‘공같이 생긴 내 머리통을 두 손으로 감싸서 겨우 들고 왔어요’. ‘네가 주인공이라서 읽었는데 이름을 모른다’. ‘접시는 접시의 조감도이다’. ‘종이를 구기고 종이를 구겨서 파지를 던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종이 같아’.
<납작하고 투명한 사람들> 백세희 ㅣ 호밀밭
저자 백세희 변호사의 시선이 닿는 예는 이런 식이다. 최고시청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최민수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 박태수는 유년시절부터 전라남도 광주에서 살았지만 “나가 시방 떨고 있냐?” 말하는 대신 “나 지금 떨고 있냐?” 한다. 이례적으로 드라마 주조연 모두 신나게 사투리를 쓴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는 사투리를 비주류에서 주류 문화로 끌어올린 것 같지만 주인공들은 성인이 된 순간 표준어를 쓴다. 대중문화 콘텐츠를 접하며 알게 모르게 지나간 ‘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 백세희 변호사는 정확하게 짚는다. 교묘하게, 대놓고, 혹은 무심하게 선 그어진 ‘비주류’들을 깨달아 가다 보면, 납작한 사람은 나였구나, 조금 덜 납작해지기 위해 정신을 가다듬게 된다.

<나의 사랑스럽고 지긋지긋한 개들> 진연주 ㅣ 문학과지성사
음율이 느껴지는 소설을 보면 쉬이 책을 놓지 못하게 된다. “난 걷는 데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난 걷는 데 재능이 없다. 없는 재능으로 무언가를 할 대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같이 이어 나가는 진연주 작가의 <나의 사랑스럽고 지긋지긋한 개들>이 그러하다. 동명의 단편 ‘나의 사랑스럽고 지긋지긋한 개들’을 비롯해 단편 9편을 묶었다. 리드미컬하게 이어지는 운율을 어느 한 군데서 끊을 수 없어 통칭하자면, 하나 같이 퍼석하고 뾰족하고 어둠 속에서 빛난다.

<아무튼, 할머니> 신승은 ㅣ 제철소
싱어송라이터이자 영화감독 신승은의 에세이. 아무튼, 작가의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책이다. “하루는 할머니가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가, 그것도 어린 나에게, 뭘 하고 싶다고 한 적은 처음이었다”라는 문장을 읽을 때, 깨끗하게 세탁한 파란색 체크 셔츠를 입을 때마다 손목 깃을 단정하게 접던 나의 할머니가 겹쳐졌다. 쏟아지는 에세이가 무상하고 지겹다가도, 이럴 때면, 덤덤하게 써내려간 개인의 이야기에 빗장 넘어 흘러 나오는 나의 순간과 마주할 때면, 별 수 없이 책 끝을 붙잡게 된다.
- 피처 에디터
- 김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