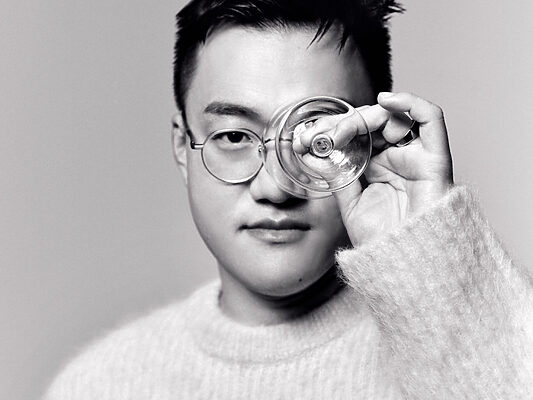시작은 해프닝, 결말은 해피 엔딩.




























여름 내내 문장에 딱 맞는 단어를 찾느라 몇 줄의 글을 채 못 썼다고 한 것은 플로베르였나 랭보였나. 남겨진 단어와 문장은 버려진 모든 것을 함축해야 한다고 말한 건 독일 시인이었나 영국 소설가였나. 작문에 대한 수많은 작가의 마음가짐 혹은 권유 중, 그처럼 딱 맞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게다가 세상 모든 일에 적용된다. 발렌시아가의 내년 봄 컬렉션을 보러 가면서 뎀나는 이번에 어떨지 생각해봤다.
발렌시아가는 맥시멀리스트와 미니멀리스트, 다른 취향을 교묘하게 만족시킨다. 과장된 실루엣, 전복된 디테일, 반전된 소재로 옷을 만들고, 입는 사람은 그거 하나면 모자라다고 느끼지 않는다. 티셔츠 하나 입고도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기껏해야 운동화인데 왠지 자세가 나오는, ‘발렌’이란 데카당스한 자부심을 준 것을 인정한다. 짠내 나고 궁핍한 스트리트웨어를 하이패션으로 승격시킨 용기도. 그런데 요즘 그는 굳이 자신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듯 보였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전날 밤 꿈이 뒤숭숭한 것이 전조 같았지만 뉴욕증권거래소의 고전적 웅장함에 현혹되어 전통적이며 고아한 멋에 뎀나식 농담을 살짝 얹은 장면을 기대하게 되었다. 한편, 뉴욕증권거래소 내부는 외관과는 달랐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돈다발이 허공에서 불온한 편지처럼 날리는 장면은 봤으나 현실은 그다지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거액이 오가는 테이블엔 구겨진 썬칩과 버터핑거스 껍데기가 기어코 펴지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BFRND(로익 고메즈)의 음악(제목은 무려 헤지펀드 트랜스!)이 뿅뿅 사운드로 스피커 출력을 높이는 동시에 ‘그들’이 잰걸음으로 쏟아져 나왔다. 온몸에 라텍스 보디수트를 뒤집어쓴 그들은 겨우 뚫린 작은 구멍으로 속눈썹을 끔뻑이거나 입술을 오물대면서 관객을 향해 돌진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전주만 듣고 노래를 평가할 순 없다. 등장만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존재도 있지만, 나아갈수록 더 나아지는 길도 있다. 그래서 눈을 감는 대신, 불가해한 자들이 차려입은 옷을 꼼꼼히 살펴봤다. 갈다 로브 라인과 이브닝 웨어는 변명 없이 잘 만든 옷이었다. 커팅은 깔끔하고 마감은 섬세하며 소재는 우아했다. 코트와 수트, 드레스, 턱시도, 트렌치는 없는 약속도 일부러 만들고 싶어지는 어떤 날, 생각날 법했다.
아디다스와의 컬래버레이션은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펼쳐졌지만, 오버사이즈 사커 티셔츠, 트랙 수트, 코치 재킷, 푸퍼 코트 등은 익숙하게 예쁘니 잘 팔릴 것이 자명했다. 오버사이즈 패디드 펌프스와 스머프 신발 같은 더비 슈즈는 오리무중이었으나
발렌시아가 혈통임은 명백했고. 쇼가 끝나고 거대한 어떤 것에 침공당한 기분, 거창한 비밀을 누설한 기분에 휩싸인 채 밖으로 나왔다. 현실은 거리에 있었다. 발렌시아가 티셔츠와 진을 입고 우르르 몰려가는 날씬한 젊은 애들. 청량하게 예뻤다. 쇼는
쇼일 뿐, 그래서 결말은 해피 엔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