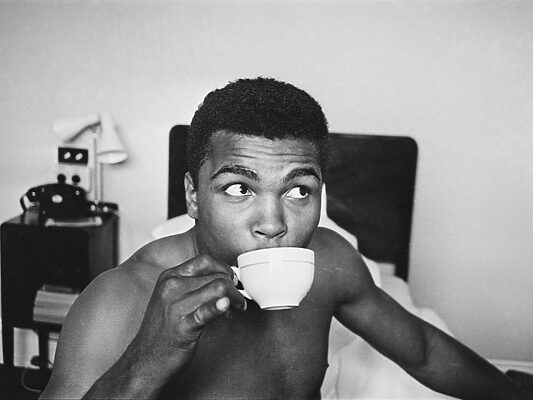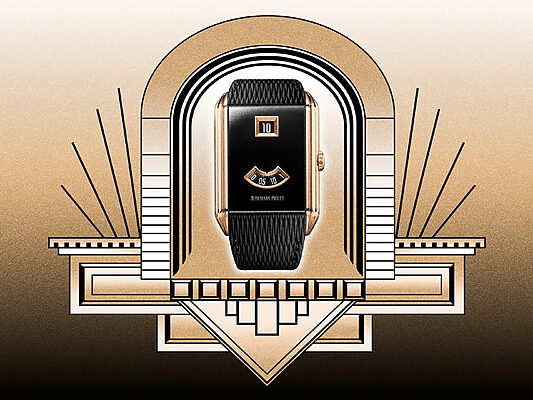신상이 나왔을 때 같은데.

러닝화는 소모품이다. 근데 도통 언제 바꿔야 할지는 잘 모른다. 밑창이 남아 있으면 괜찮아 보이고, 애착이 생기면 더 신고 싶어진다. 하지만 발과 무릎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다. 숫자와 충격에 반응한다.
보통 러닝화의 수명은 500~700km라고 한다. 브랜드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범위다. 이 수치는 ‘갑자기 못 신게 되는 시점’이 아니라, 충격 흡수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에 가깝다. 아웃솔(밑창)은 멀쩡해 보여도, 미드솔(중창)은 이미 주저앉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러닝화의 핵심은 고무가 아니라 폼이다.
미드솔은 시간이 아니라 압축 횟수로 늙는다.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체중의 2~3배 하중이 실린다. 그 압력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면 폼은 원래의 복원력을 잃는다. 처음 신었을 때의 푹신함이 사라지고, 통통 튀는 반발력이 둔해진다. 이 상태로 계속 달리면 충격은 고스란히 발바닥, 발목, 무릎으로 올라간다. 러닝화는 더 이상 완충재가 아니라 얇은 고무 덩어리에 가까워진다.
체중과 러닝 스타일에 따라 수명은 더 빨리 줄어들 수 있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뒤꿈치 착지가 강한 러너라면 400~500km에서도 교체 신호가 온다. 반대로 가벼운 체중에 미드풋 착지, 부드러운 페이스로 달린다면 700km 이상 버티는 경우도 있다.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같은 감각은 가장 믿기 어려운 기준이다. 발은 적응하고, 관절은 침묵한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도 있다. 미드솔에 주름이 깊게 잡히고, 좌우 비대칭이 심해졌다면 이미 많이 신었다는 증거다. 예전보다 러닝 후 발바닥이나 무릎이 유독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몸이 먼저 항의하는 중이다. 같은 코스, 같은 페이스인데 피로도가 달라졌다면 러닝화를 의심하자.
러닝화를 오래 신는다고 해서 경제적인 것도 아니다. 수명이 다 된 신발로 달리다 보면 부상 위험이 커지고, 한 번 다치면 몇 주에서 몇 달을 쉬게 된다. 그동안 못 달린 시간과 병원비를 생각하면, 러닝화 한 켤레는 오히려 싼 편이다. 러닝화는 아껴 신을 물건이 아니라, 정해진 역할을 다하면 보내줘야 할 장비다.
기록해 두자. 러닝 앱이든 메모든, 누적 거리를 체크하자. 500km를 넘기면 교체를 고민하고, 700km를 넘겼다면 전 애인처럼 미련 없이 보내주자. 러닝화가 평생 함께할 파트너는 아니니까. 즐겁게 잘 달렸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