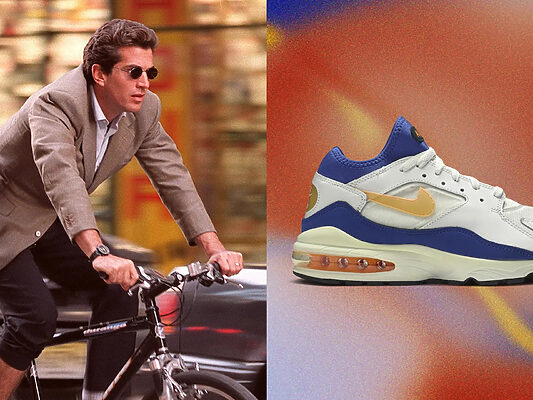사실 누군가의 대단히 큰 잘못은 아니다. 그보다는 반복되는 사소한 불편이 쌓여 생기는 피로에 가깝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더 쉽게 공감된다.

문 앞에 서있는 사람
출입문은 곧 통로다. 그 앞에 봉을 잡고 요지부동인 사람을 보면, 내릴 사람은 미리부터 긴장하게 된다. “저 내려요”라는 말을 꺼내기까지의 망설임과, 그 말을 듣고도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순간까지가 세트다.
하차보다 승차가 먼저인 사람
문이 열리면 기본 규칙은 내리는 사람이 우선이다. 버스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모두 마찬가지. 하지만 그 규칙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 밀고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내릴 사람은 방향을 잃고, 짜증은 몸으로 먼저 튀어나온다. 사람이 다 내리면 타세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 서기 무시하는 사람
분명 ‘두 줄 서기’ 혹은 ‘한쪽은 걷기’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중앙에 애매하게 서 있다. 앞사람 한 명 때문에 뒤쪽 열 명의 속도가 동시에 느려진다. 얘기 하자니 망설여지고, 그냥 서 있자니 분명 내가 손해 본 느낌이 든다.

이어폰에서 음악이 새는 사람
장르 불문. 발라드든 힙합이든 강제 청취다. 볼륨이 애매하게 크다. 항의하기도, 무시하기도 애매한 수준. 노래가 반복될수록 짜증은 누적되고, 결국 ‘왜 내 하루에 이 음악이 깔려야 하지?’라는 생각에 도달한다. 대중교통에서 이어폰 없이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사람은 더 설명할 것도 없다.
빈자리에 가방 올려 놓는 사람
저 가방이 문제일까, 저 사람이 문제일까. 사람이 앉기도 전에 가방이 먼저 착석한다. 노약자나 임산부를 위해 일부러 비워둔 자리에 대신 앉은 짐도 문제다. ‘가방 좀 치워달라’고 말하자니 번거롭고, 그냥 다른 자리로 가자니 지는 느낌이다. 결국 대부분은 아무 말 없이 물러난다. 교묘해서 더 짜증난다.
내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돌진하는 사람
꼭 있다. 끝까지 앉아 있다가 문이 열리기 0.5초 전에 깨닫는 사람. “어, 여기네.” 인지하자마자 문을 향해 돌진한다. 문제는 이 짧은 행동 하나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불편해진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발을 밟히고, 누군가는 균형을 잃는다. 정작 당사자는 내리자마자 다시 스마트폰을 본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