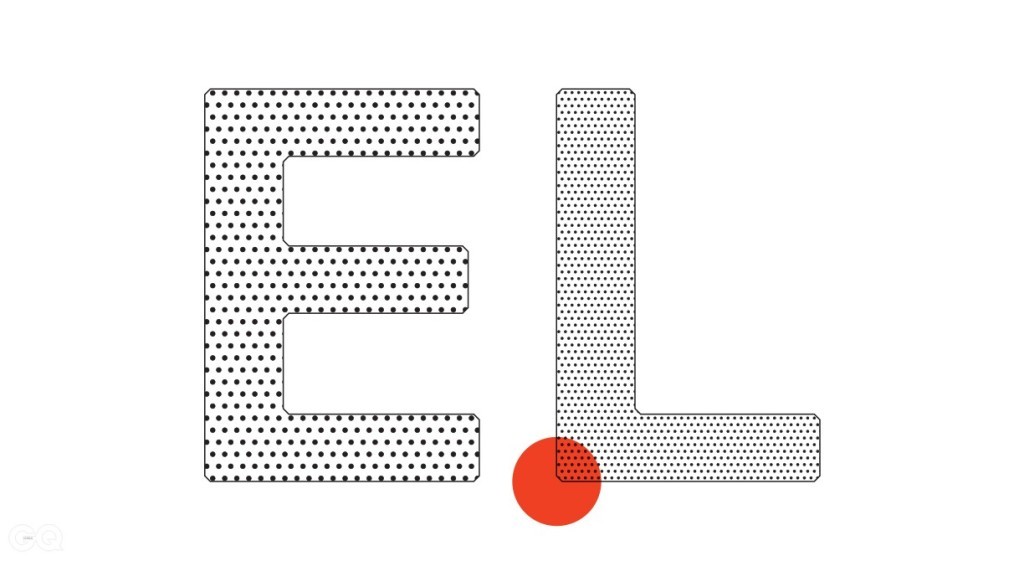생각을 기록하는 작은 레코드가 발명됐다 치자. 그럼 최악의 적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단, 아침에 깨기도 전, 나에 대해 나부터 부정적으로 떠드는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숙주로 바로 활동한다. 동네에서 제아무리 잘나가던 남자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양푼처럼 찌그러져선, 화장실 거울 앞에서 문득 눈이 화등잔만 해지는 것이다. “저게 나야? 내가 저렇게 늙었단 말이야?” 회한이 발등으로 툭 떨어질 때, 둔감한 아내가 욕실문을 두드린다. “아유, 안에서 뭐 해? 아직 멀었어? … 근데 당신, 혹시 울어?”
시간이라는 잔인한 약탈자가 남긴 흔적을 거울로 보는 순간. 콜라겐으로 치밀했던 얼굴에 주름의 음탕한 낙서가 콧볼 옆으로 길게 팔자를 늘어뜨리면, 눈 밑엔 당장 부푼 살덩어리의 잔해가 들어선다. 대출 이자를 넣어야 하는 어느 멋진 날, 전철 계단을 오르기도 전에 주저앉아 가게 유리에 비친 어떤 노인을 본다. 당혹하고도 무력한 채로 그 골룸이 나란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아니 평생 지구 최악의 룸메이트와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우치는 것이다.
노화의 단계를 축하할 수 있다면, 세월의 어떤 공습에도 산맥처럼 꿈쩍 안 하겠지만, 그런 남자는 없다. 더 약해빠진데다, 여자처럼 늘어진 몸을 추켜올리거나 파인 피부를 메울 용기가 없다. 그런 게 한국 남자의 국가적 취미가 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 몸에 대한 원시적 구애와 첫 번째 스릴이 지나간 뒤엔 누구라도 태도를 선택해야 한다. 남성성을 더 애달프게 끌어안거나, 양보하여 존중받거나. 풍습에 덜 구속되어 있고 최소한의 돈도 있는 지금 세태라면, 우중충한 피부에 사포 같은 입술, 옥수수 밭 두 마지기를 옮겨놓은 코털과, 인간의 살덩이가 안고 가야 할 여러 공포를 무신경하게 견딜 순 없다. 급기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불가사의의 세계, ‘남자의 아름다움’이 여자 친구나 여자 친구의 얼굴보다 우선하는 자부심이 되었다… 라고는 못하겠지만. 글쎄, 우리가 몸의 결함이라고 믿는 게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받은 돌판 때문인지, 시장이 조작한 불확실성 때문인지 누가 장담한다고?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일정하지 않다. 진짜 아름다움은 실험실에서 힘들게 제조되지 않는다. 슈퍼노바처럼 아주 쉽게 생겨난다. 분명 육체적 우월함은 단지 좋은 자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필요한 것 자체이며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조건이다. 설사, 병원에서 혹은 스타일리스트의 가게나 미용실 ‘후까시’로 재조정된 것이라고 해도.
<GQ KOREA>를 창간하기 전, 우리 집 욕실에는 스킨과 로션, 샴푸와 왁스가 전부였다. 그나마 잘 챙기지도 않았다. 땡볕 아래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돌아다니던 그때의 내가 지금 나 맞지? 이제, 크림과 모이스처라이저, 목욕 제품과 스크럽, 별의별 샴푸가 즐비한 욕실은 실로 웬만한 신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우습다. 자기 전에 수분 크림을 문지르는 건 상상도 못하는 친구들과, 자기 스타일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는 시대 사이에 끼어, 볼살 때문에 잘생긴 얼굴 윤곽을 잃었다는 냉소와 자조로 살아온 내가 그루밍 세대에 뛰어든 것이다!
어제, 내 친구 헤어 디자이너도 향수를 바르는 새로운 법을 가르쳐주었다. 다들 맥박이 뛰는 귀밑이나 손목에 뿌린다지만, 자기는 쉬지 않는 심장과 내내 꿀럭대는 갑상선 연골에 뿌린다고. 그러면 향기가 더 오래간다고. 나도, 향수를 공중에 뿌리고 그 속으로 걸어가는 배우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니, 주량이나 독서만큼 치장도 우리의 삼삼한 주제였다.
그러나 그루밍은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손에서 빠져나가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십상인 애착증이다. 하루에 다섯 가지 제품을 쓰거나 스파를 제 집 드나들 듯 하지 않더라도 순진하게 얼굴 스크럽부터 시작했다간, 자칫 때마다 몸에 난 털을 제모하지 않으면 도대체 근질근질해진달까. 여차하면 엄마 립스틱을 바른 중1 딸애처럼 비참해질 테다. 그러니, 적당하고 적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 간단하고 현명한 정도, 국경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립밤이나 손톱에 광을 내는 건, 선을 긋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도 안 한다. 얼굴에 ‘자유와 웰빙, 힘과 에너지를 줄’ 거라는 장 폴 고티에 제품도 일단 의심하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다가오기 전까지는 결코 경험하지 못할 여자들의 세계, 잡티 하나 타협할 여지 없는 구역에서 살아가야 하겠지. 그런데 거울 앞에서 이쪽 얼굴 저쪽 얼굴, 마구 분주한 남자에게 오랑우탄인들 관심이나 있겠어? 남자들이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여자들과 동등함을 느끼기까진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 게임에서 여자를 이기려고 당신까지 여자가 될 필요는 없다.
한편, 멀끔한 얼굴을 약속한다는 제품이 수백 가지가 넘고 다 써볼 수도 없는데, 그들 중 싸고 새파란 깡통 니베아 크림을 당할 자가 누구일까 싶은 것도 어쩜 솔직한 심정이다.
- 에디터
- 이충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