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문장을 ‘비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괜한 훈수가 되었다. 비문을 안 쓰는 사람이 더 희귀해졌다. 그럼에도 비문非文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비문 文을 살피는 노력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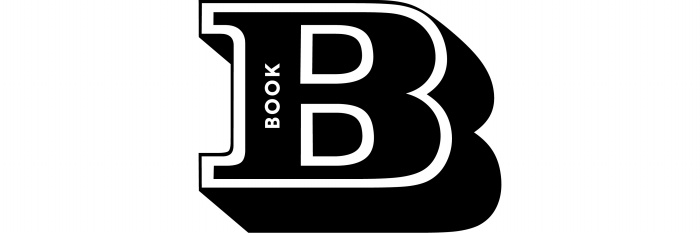
“자기는, 얼굴이 비문이면서.” 김애란의 단편소설 <침이 고인다>에 나오는 문장이다. 후배에게 맡긴 논술 답안의 첨삭 원고가 “맞은 걸 죄다 틀리게” 고쳐놓았다고 학원 부장에게 야단을 맞자,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얼굴이 ‘비문’이면 고치는 게 좋겠다. 비문은 문장이 ‘못 된 문장’이니까. 비문은 이해와 소통의 정체를 가져오고 시간과 관심의 낭비를 부른다. 그런데 가끔 ‘조금 이상한 비문’이 튀어나와 의미와 세상의 경계를 시험한다. 엄격한 잣대로 비문에 빨간 펜을 긋던 버릇 때문에, 이런 ‘비문의 가능성’마저 같이 지워진다면 아깝다.
물론 우리의 문장 생활을 살피면 비문의 가능성 따위를 붙들기엔 아직 이르다. 매체와 도구가 언어생활을 바꾼다는 지적은 익숙하다. 메신저와 SNS로 오가는 문장들은 구어를 닮기 때문에, 전송 전에 재차 검토하지 않으면 입 말의 실수를 반복하기 쉽다. 주술은 꼬이고 목적어는 간 데 없는 복문이 겹치고 얹히는 장면은 너무도 흔하다. 거리로 나서보면 어떤가. 관공서에 게시된 자료, 공사 현장 안내 문구, 건물 화장실의 금연 경고 등 어디에나 비문이 있다. 일부러 저렇게 틀리기도 어렵겠다 싶은 문장마 저도 그대로 전시된 것을 보면, 너그럽게 의미를 읽어주려던 마음은 금세 바닥난다. 혹시 비틀리고 무너지는 문장을 통해서 관공서의 운영 도, 공사장의 안전도, 건물의 관리도 허술하다 는 것을 알리려는 내부 고발이 아닌 다음에야 그걸 본 뒷맛이 좋을 리 없다. 공적 문장이 흔들리는 나라의 미래가 밝기는 어려울 테니까.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가끔 돌출하는 조금 이상한 비문의 가능성을 위해서, 비문의 정의를 살짝 수정해보고 싶다. 시인 신해욱은 <비성년열전>에서 성년, 미성년, 비성년을 이렇게 구분한다. “성년이란 말에는 움직임이 내포되어 있다. 움직여서 인간의 세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게 된 이들을 성년이라 부른다.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으되 이제 그렇게 될 이들을 미성년이라 부른다. ‘이미’ 그렇게 되지 않은 이들은, 그러니 비성년이라 부르기로 하자. 미성년은 대기 중이고 비성년은 열외에 있다.”
이 구분에서 힌트를 얻어, 비문非文을 아직 문장이 되지 못했으되 이제 그렇게 될 문장인 미문未文과 이미 문장이 되지 않은 문장인 비문 文으로 나누면 어떨까. 미문은 대기 중이고 비문은 열외에 있다. 미문은 문장이 ‘덜 된’ 문장이고 비문은 문장이 ‘안 된’ 문장이다. 어떤 비문 文은 아주 조금 어긋나 있고 거기에 묘한 매력이 있다. 문소리가 각본, 주연, 연출을 맡은 단편영화 <여배우>의 대사를 빌려 고쳐 쓰면, 잘 쓴 문장은 매력 있는 문장을 못 이기고, 나름 매력 있는 정확한 문장은 지나치게 매력 있는 비문 文을 이기지 못한다.
“I would prefer not to.” 허먼 멜빌이 만든 문제적 인물, 바틀비의 유명한 말이다. 문법상 틀리진 않지만 조금 이상한 여운을 남기는 이 말은 주로 ‘그렇게 안 하고 싶다’ 또는 ‘안 그러 고 싶다’로 번역한다. 만약 내게 번역어 선택권이 있다면 맞춤법에 어긋나게 ‘안하고 싶다’로 옮기겠다. 이만큼의 어긋남은 한국어 문장 생활에 무리 없이 스며들 수 있다. 아니, 이미 스며들어 배어나오고 있다.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각종 나른한 ‘짤방’에 덧붙는 이 인터넷 유행어는 맞춤법상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이다. 하지만 이만큼의 어긋남이 이 문장의 의미를 게으름이나 ‘잉여’보다 두텁게 만들고, 나아가 바틀비적 전통으로 연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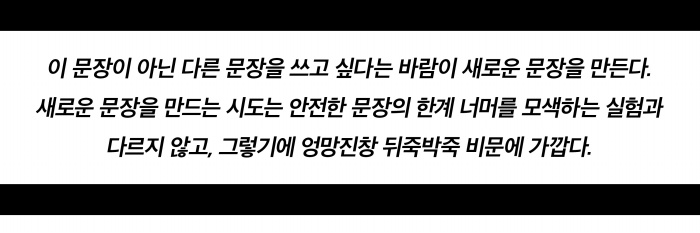
이렇게 안전한 문장이 안 되려는 비문 文, 아주 조금 어긋나 있는 비문 文은 사람들이 정확한 문장이라고 부르는 경계의 바로 곁에 있다. 물론 비문이 경계 이쪽의 한계 너머를 겨냥한다면 바로 곁은 한없이 멀고 낯선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비문의 가능성을 넉넉하게 견뎌 줄 수 있는 장르는 우선 문학이다. 이 문장이 아닌 다른 문장을 쓰고 싶다는 바람이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시도는 안전한 문장의 한계 너머를 모색하는 실험과 다르지 않고, 그렇기에 엉망진창 뒤죽박죽 비문에 가깝다. 그 모색의 비문을 거쳐 지금의 한계 너머 세상을 그려낼 때 새로운 문학이 된다.
한편 문학이 아니더라도, 한국어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한국인이 쓰는 문장에 비문 文이 섞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아직 한국어는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실험한 언어가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기존 문장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는, 비문이라는 시행착오를, 문장을 통한 생활양식의 실험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게 낫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비문 文은 드문 사건 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비문은 결국 정확한 문장도 되지 못하고, 그렇게 고장난 채 사라진다. 어쩔 수도 없고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정확한 문장에 대한 집착과 강박으로, 비문을 만나기만 하면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냉큼 치워버리면, 드문 만큼 보상도 큰 기회를 만나지 못한다. 고종석은 “정확성과 아름다움으로 한국어의 가능성을 넓혔다고 평가받을 만한 글”을 쓰고 싶다고 말한다. 정확성과 아름다움, 이것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어긋남이 더해져 한국어의 가능성이 넓어지길 바란다. 문법적 쓰레기 더미 위엔 아주 가끔 비문법적 장미가 피어난다.
비문의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비문의 처지’도 헤아릴 수 있을까. 빤한 지적이지만 서울에 견주어 ‘지방은 비문’이고, 도시에 견주어 ‘시골은 비문’이고, 강남에 견주어 ‘강북은 비문’ 이고, 금수저에 견주어 ‘개룡남은 비문’이고, 내국인에 견주어 ‘다문화인은 비문’이고, 정규직에 견주어 ‘비정규직은 비문’이고, 남성에 견주어 ‘여성은 비문’이다. 이때 풍문으로 들리는 이 쪽의 문장은 비문秘文이, 저쪽의 문장은 비문 文이 된다. 사람들은 각자 놓인 자리에서 “말 좀 제대로 하지” 혹은 “그게 대체 문장이냐” 같은 소리를 종종 듣는다. 분명히 말과 문장의 규칙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그곳의 지배적인 ‘스타일’과 맞지 않을 때, “듣도 보도 못한” 비문의 대접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비문인가 아닌가는 그곳의 ‘상식’이 결정한다.
그래서일까. 얼굴도 비문도 모두 전문가의 첨삭을 받는 시대다. 미인의 기준에 따라 넘치는 부분은 잘라내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 넣는다. 미문美文의 기준에 따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문장성분이 위치하도록 교정받는다. 성형외과에서 시술 부위를 펜으로 긋는 것과 비문에 긋는 붉은 선은 이렇게 닮아간다. 문장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 교정해주는 전문 분야도 세분화되었다. 이렇게 세분화된 미문美文을 다루는 전문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수룩한 ‘미생’의 문장을 쓰곤 한다. 청소년 토론 대회에서 자기주장을 형식에 맞게 말하는 중산층 학생과 두서없이 주절거리는 저소득 학생의 차이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비문 자체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비문 너머의 사람을 쉽게 재단하지 않기 위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곳의 상식은 그 집단을 겪지 못한, 혹은 미리 교육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상식이 아니라는 인식의 ‘포스트 잇’. 현실의 차별을 은폐하는 정당한 낙인으로 비문이 활용된다는 작은 환기. “듣도 보도 못한” 비문은 종종 그 분야 전문가의 ‘터치’를 받지 못하는 누군가의 처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현실을 둘러보면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인가 싶다. 애써 비문의 가능성을 보고, 비문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를 헤아리려는 노력은 지금 한국의 현실과 충돌한다. 바야흐로 ‘비문의 시대’가 아닌가. 청와대에 있는, 한국 최고 의 존엄이 비문을 구사한다. 최고 존엄한 비문 이라서 아무도 선뜻 빨간 펜을 들지 못하고 비문秘文처럼 떠받들며 받아 적고 있다. 그 자리의 공적 무게를 생각하면 참기 힘들다. 어느 토론을 마치고 진중권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것만으로도 무서운데, 사람들도 그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 그보다 한 단계 위다. 이기기는커녕 비기기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소통을 말하면서도 소통을 말소시킬 수 있는 비문의 힘을 목격하고 있다.

- 글
- 박준석 (문학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