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일부러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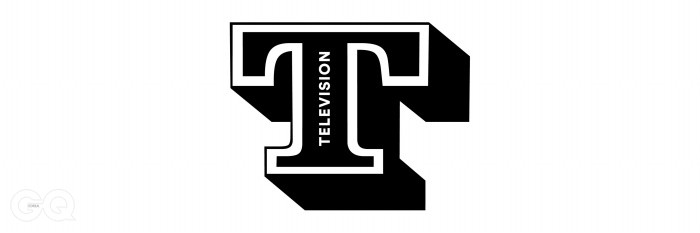
우연히 <냉장고를 부탁해>를 보는데, 가수 태양이 자신의 냉장고를 공개하고 있었다. 반사적으로 의문이 생겼다. 지금 스타란 무엇일까? 이미지란 무엇일까? 저 반찬통과 태양의 노래 사이엔 어떤 거리를 설정해야 할까? 혹시 이런 생각은 쓸데없이 진지한 척하는 구태에 불과할까? 예능이란 무엇인가? 텔레비전은 무엇인가?
사실 거기엔 얼마 전 <무한도전>에서 본 장면의 여파가 있었다. EDM을 소재로, 여러 음악가에게 박명수처럼 “까까까까까~”를 해보라고 시키던 장면 말이다. 그걸 시킨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심지어 다들 시키는 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그때 정리한 건 두 가지다. 첫째, <무한도전>이 적어도 저만큼은 대단하구나. 둘째, 딱 필요한 만큼은 저급하구나. 하지만 의문도 깨달음도 하나의 명제 앞에서는 그저 무력하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말이 필요한가? 그래야 팔린다는데. 채널을 돌리다 “데뷔 9년 차, (…) 베일에 싸여 있던 그녀 들의 진솔한 매력이 드.디.어 공개된다!”는 <채널 소시>를 봤다. 딱히 소녀시대가 아닌 누구라도 상관없을 모습이 이어졌다. 9년 동안 스스로를 뛰어넘으며 행진한 그녀들에게 저토록 안일한 접근은 오히려 무례가 아닐까? 하지만 그 역시 예능은 예능일 뿐이라는 주장 앞에 괜한 어깃장이기 쉬웠다.
안 보면 된다. 안 봐도 된다. 결론은 늘 그런 식. 실제로 텔레비전이 없다. 몇몇 프로그램을 컴퓨터 모니터로 확인하는 선이다. 그러다 보니 가장 모르는 게 TV CF였다. 어쩌다 텔레비전 앞에 앉은 날, 가장 낯선 것은 바로 줄줄이 CF였다. 그런데 패턴이 보였다. 모든 CF가 아이에게 하듯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었다. 말하자면 이렇게. “이것은 자동차 광고입니다. 이것은 신 모델입니다. 다들 사고 싶어 합니다. 당신도 그렇지요?” 모조리 다 그랬다. “이것은 맥주광고입니다. 그래서 맥주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맥주는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텔레비전을 안 보는 사이에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혹시 지구에서 사라졌나? 대놓고 손에 쥐어주듯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아무런 각인 효과도 없다는 거겠지. 90년대에 ‘이미지 광고’라고 부르던 것들이 생각났다. 예를 들어 이런 것. 한 남자가 거리를 뛰어간다. 모퉁이에서 물고기를 들고 가던 소년과 부딪친다. 바닥에 떨어진 물고기가 파닥거린다. 다시 뛰어간다. 브랜드 로고가 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걸까? 이 친절한 세상에 그건 웬 불친절한 CF쯤 되려나?
영화 <북촌방향>(2011)에 이런 장면이 있다. 성준(유준상)이 경진(김보경)의 집에 오랜만에 찾아간다. 방 안을 둘러보던 성준이 말을 꺼낸다. “테레비가 생겼네.” 경진이 대꾸한다. “큰 테레비전이 보고 싶더라구요.” “어 좋아. 테레비 있으면 아늑하고, 집에 있는 것 같아서 좋지.” “책을 너무 못 보게 돼요.” “담배 좀 피울게.” 처음엔 극장에서 보고, 이번엔 모니터로 보면서 같은 생각이 들었다. “테레비 한 대 살까?” 하지만 지금, 아늑하고 집에 있는 것 같아서 좋을 ‘테레비’가 과연 있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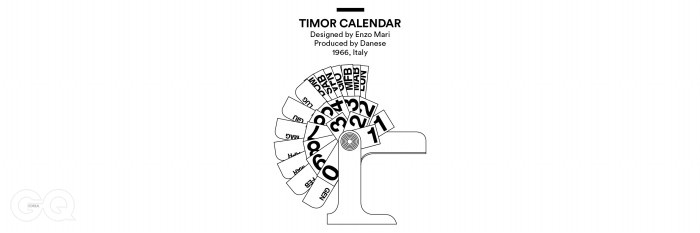
최신기사
- 에디터
- 장우철
- 일러스트레이터
- 문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