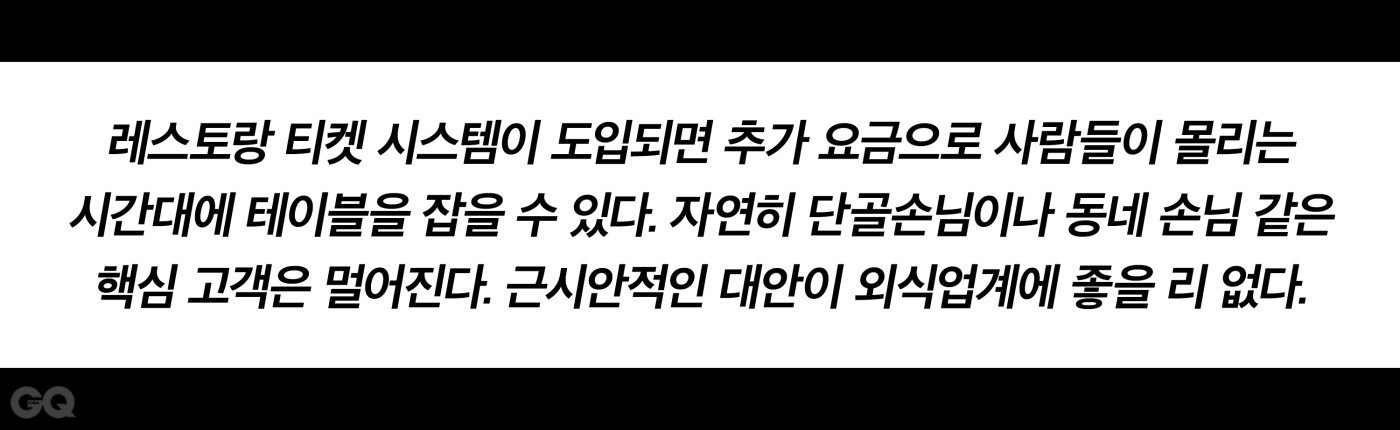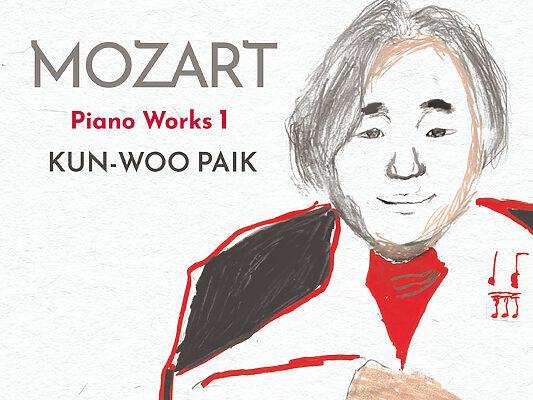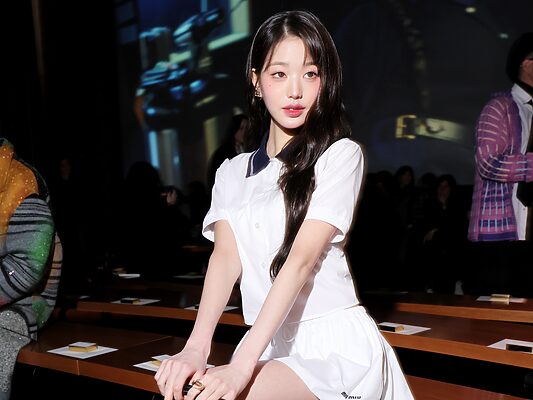티켓으로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일부는 ‘티켓’이 외식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혹시 ‘노쇼’ 잡으려고 초사삼간 다 태우는 건 아닐까?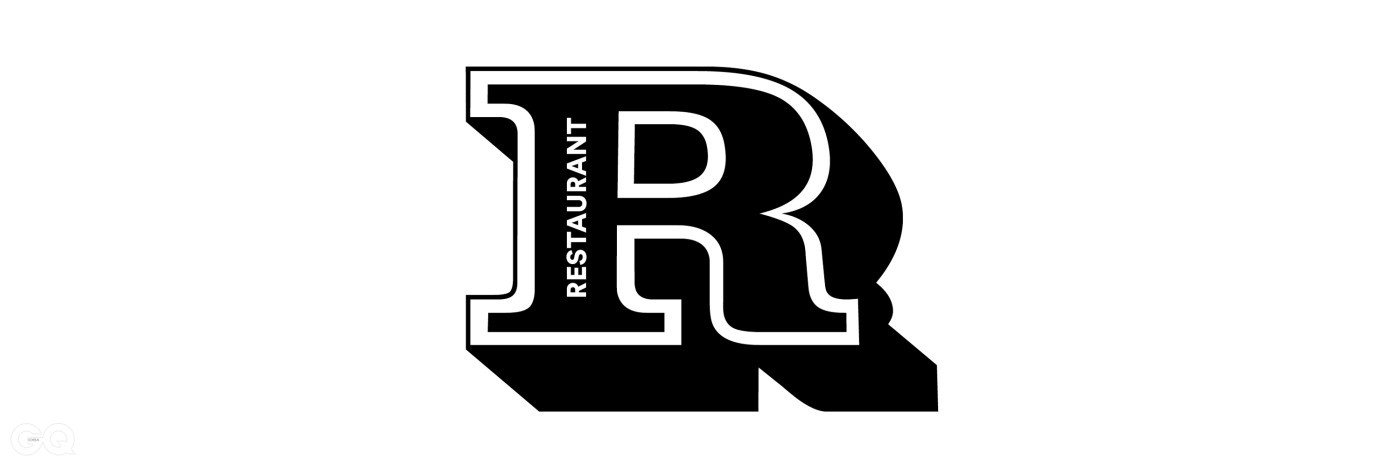
‘톡Tock(Tocktix.com)’은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처럼, 식당 예약을 티켓으로 진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시카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셰프 그랜트 아카츠Grant Achatz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닉 코코나스가 만들었다. 코코나스는 전직 파생 상품 트레이더다. 레스토랑 업계에 뛰어든 이후, 그를 좌절시킨 단 한 가지는 ‘예약’이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레스토랑 업계를 괴롭혀온 문제, ‘노쇼(예약한 뒤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를 해결하려고 만든 앱이다. 노쇼(비록 전체의 10퍼센트 미만일지라도) 이 바닥의 큰 돌부리다. 계산을 해보면 놀랍다. 알리니아와 같은 레스토랑에서, 매일 밤 두 명이 테이블 하나를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치자. 1년을 합치면 손실액이 25만 달러(약 2억 9천만원)다. 코코나스는 티켓을 판매하면 이 문제가 없어질뿐더러, 서비스가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예약 과정이 자동화되면 예약 담당 직원을 더 적게 뽑아도 되고, 레스토랑 직원은 오지 않을 사람들에게 거절하느라 시간을 쓰는 대신 실제로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집중해 고객별 선호를 기록하는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톡은 계속 몸집을 불리고 있다. 지난가을에는 구글의 엔지니어였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이 톡의 파트너로 가담했고 토마스 켈러 셰프와 중국계 미국인 셰프 밍차이, 시카고의 거대한 레스토랑 그룹 ‘레터스 엔터테인 유’의 오너가 투자자로 합류했다. 그리고 코코나스는 작년 한 해 동안 알리니아의 ‘노쇼’가 1년 동안 단 다섯 건뿐이었다고 말한다. 알리니아와 그랜트 아카츠의 두 번째 레스토랑인 ‘넥스트’는 모두 실험적인 곳이다. 매일 밤 고객들에게 유일무이한 요리 경험을 선사하는 장소다. 하지만 코코나스는 모든 종류의 레스토랑에 톡을 접목시키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예치금을 낸다는 단순한 행위(매몰비용)만으로도 노쇼를 사실상 없애준다고 주장한다.
예약 산업은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우버와 포스퀘어의 창립자 존 파브로, 저레드 레토, 윌아이엠 등 유명 인사들에게 1천5백만 달러를 투자 받은 레스토랑 예약 앱 ‘리저브’는 앱을 통해 바로 식사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게다가 전체 식사 비용의 몇 퍼센트를 더 내면 잡기 힘든 자리를 예약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욕의 레스토랑 중 이 옵션의 혜택을 보는 곳은 마리오 카르보네 셰프 레스토랑과 리치 토리시 셰프의 ‘메이저 푸드 그룹’뿐이었다.) 한편 현재 베타 서비스 중인 ‘킬러레지’는 뉴욕 레스토랑 몇 군데의 예약을 평균 25달러에 판매한다.
톡 역시 가격 책정 역학이 있다. 수요가 많은 시간의 티켓은 사람이 없을 때보다 더 비싸다. 알리니아에서의 한 끼 식사는 오후 5시에는 1인당 2백10달러(봉사료와 와인 제외)인데, 8시 30분에는 1인당 2백95달러다. 톡은 이렇게 얻은 이득을 제휴 레스토랑과 나누겠다고 약속하지만, 모든 레스토랑이 이런 서비스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셰프가 테이블들을 빼돌리고 있다, 손님을 받지 않는 비밀 스러운 음모가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려고 애써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사기꾼이고 범죄자들이라고 인정하라는 말인가?” 로스앤젤레스의 접객 매니저 데이비드 로소프의 말이다.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추가 요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단골손님들과 동네 사람들 같은 핵심 고객들은 다 쫓게 될 거다. 2년이 지나 더 이상 식당이 ‘핫하지’ 않으면 핵심 고객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근시 안적인 생각이 우리 업계에 좋을리 없다.”
새로운 레스토랑 예약 시스템의 진짜 타깃은 고객이 아닌 레스토랑 업계다. 리저브 홈페이지에는 이런 말도 있다. “레스토랑 예약 앱은 레스토랑의 통제권을 다시 다이닝 룸으로 돌려놓았다.” 아니, 레스토랑에서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났나? 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최근 10년간 레스토랑과 고객의 권력 균형은 모든 면에서 레스토랑으로 기울었다. 물론 그 덕택에 정말 훌륭한 미식을 할 수 있다. 실험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레스토랑과 기꺼이 돈을 내고 실험 대상이 되려는 고객들 덕분에, 셰프들은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을 정도의 위치로 올라갔다. 하지만 ‘음식 혁명’은 결국 레스토랑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핑계가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다. “혁명에 참가하니 좋죠?” 빵을 공짜로 받는다는 생각이 왜 낡았는지를 설교하는 웨이터는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최근 ‘페비켄 마가시넷’이라는 스웨덴 레스토랑에서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셰프들이 ‘핀란드 수도원의 삶’, ‘달걀을 오래 보관하는 현대적인 방법’ 등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에 20주는 문을 닫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름대로 멋지긴 하지만 고객들에게 친절한 것은 아니다. 손님들을 맞고 음식을 대접하는 게 그들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말처럼 들렸다. 페비켄은 올해 봄부터 미리 돈을 내는 티켓팅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 같다. 외식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예술 애호가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다.
노쇼는 오래 묵은 문제다. 하지만 200년은 족히 되는 현대 레스토랑의 역사를 노쇼가 다 망쳐버리는 것은 아니다. 레스토랑 티켓 시스템에 반대하는 한 오너 셰프는 이렇게 말했다. “예약을 넘치게 받아요. 비효율적이고 직관이 필요하지만, 이 일을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접객을 맡은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 6시 45분에 예약한 사람들이 조금 일찍 떠나길 바라며, 8시 30분에 예약한 사람들이 조금 늦길 바라며, 만약 예약한 사람들이 전부 온다면 서비스로 술을 한 잔씩 돌리거나 디저트를 공짜로 주거나 하면서 말이다.
“나는 노쇼 문제로 잠을 설친 적은 없어요.” 뉴욕에서 레스토랑 8곳을 운영하고 있는 외식 사업가 대니 메이어는 알리니아 같은 소규모 레스토랑은 티켓 판매가 적절하다고 보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는 티켓 판매에 반대한다. “결국 우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려는 거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난 당신을 믿지 않아요’라는 말부터 한다면,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뉴욕에 2만6천 개가 넘는 식당이 있는데, 여기 오려면 먼저 돈부터 내야 한다고 하는 건 그저 자만심만 세우는 것 같아요.”
휴 애치슨 셰프 역시 티켓 판매에 회의적이다. 그는 티켓 제도를 도입하면 손님 접대의 유연성이 사라질 거라 걱정한다. 고객에게 음식을 추가로 주거나 빼기가 힘들어지고, 그때그때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말이다. “다이닝은 한 가지로 고정된 경험이 아닌데 티켓은 다이닝을 고정시키려 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완전히 일치하는 레스토랑을 만들지 않는 이상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레스토랑을 만드는 셈이겠죠.”
닉 코코나스는 식당의 티켓을 사는 것과 연극과 스포츠 경기의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 질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사람들 앞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것과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코코나스가 레스토랑 업계에 제시하고 있는 시스템은 때로는 너무 강제적으로 느껴진다. 나는 레스토랑 주인과 셰프의 삶이 나아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손님도 더 좋은 경험을 하길 바란다. 그러나 코코나스를 비롯한 사람들이 섬세한 것을 해치지 않기를 빈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그 기분 말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다. 노쇼는 남의 돈을 빼앗는 일이라는 점이다. “회계사, 의사에겐 노쇼를 하지 않잖아요. 외식 업계에서만 윤리와 책임이 존재하지 않아요. 노쇼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레스토랑 매니저 데이비드 로소프의 말이다.
최근 뉴올리언스에서 점심을 먹다가 뉴올리언스의 전설적인 레스토랑의 오너 랄프 브레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난 티켓이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손님으로 맞는 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 노쇼는 어쩌죠? 효율성은? 티켓 시스템을 도입하면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는 사제락 칵테일을 쭉 들이키고 말했다. “그 모든 게 내 직업의 일부예요.”

최신기사
- 에디터
- 글 / Brett Martin
- 일러스트
- 문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