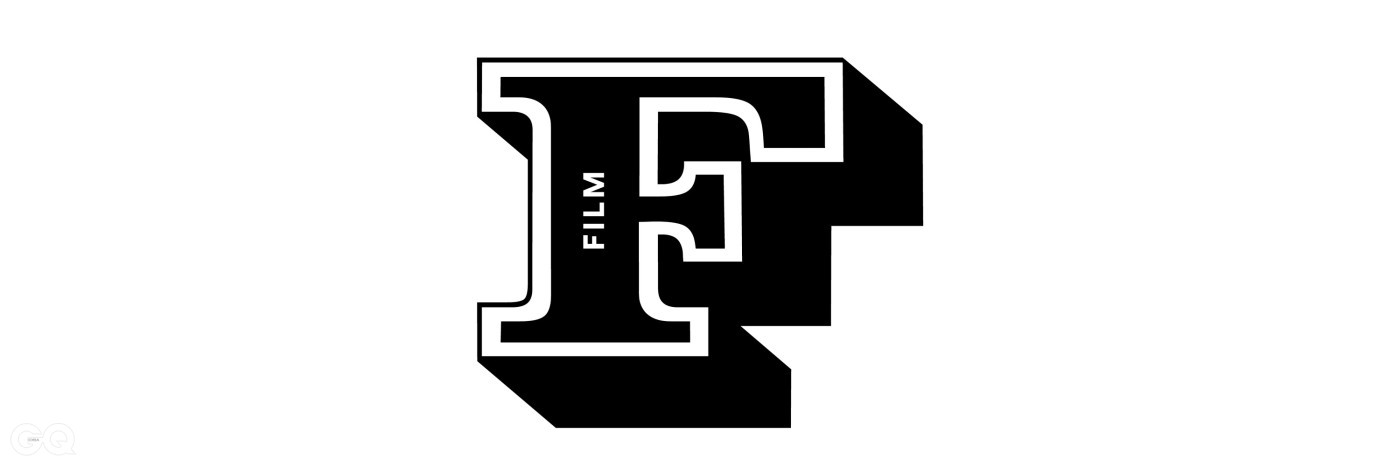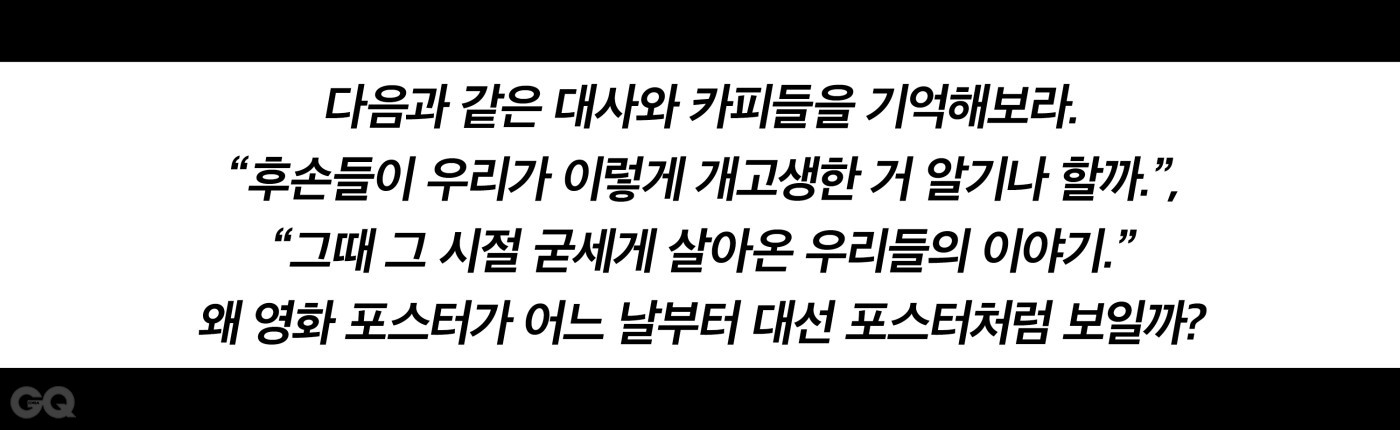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졸업 후 소설가가 된 정지돈은 지금 한국영화가 너무 ‘정치적’이라고 말한다. 과연 한국영화는 진짜 ‘영화’로서 생존할 수 있을까? 한국영화가 정말 영화 같았던 시절은 왜 그렇게 짧았나?
고다르 X 고다르 68혁명 이후 장 뤽 고다르는 장 피에르 고랭과 ‘지가 베르토프 그룹’을 결성하고 정치적인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 고다르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에 대한 영화가 있고 정치적인 영화가 있다.” 지가 베르토프 그룹의 영화들은 정치를 소재로 만든 영화(정치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정치적인 방식으로 제작되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유통되며 정치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는 또는 그러길 원하는 영화, 다시 말하면 고다르와 고랭 에게 정치적인 영화는 저항과 비타협의 장치였다. 최근 강성률 평론가는 <매거진 M>에 실린 <내부자들> 리뷰에서 고다르의 저 유명한 격언을 이상한 방식으로 인용했다. 강성률 평론가 의 말. “우리가 고다르 감독에게 배운 것은 정치적 소재에만 정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치 영화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현실과 정치를 살피려면 여전히 정치 영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부자들>은 정치를 소재로 만든 영화다. 그러니까 고다르가 거부하기 위해 한 말을 고다르가 거부한 내용에 인용하기. 이상한 아이러니. <내부자들> 리뷰는 심지어 마지막에 고다르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이 영화에서 “스타일적인 의미를 찾지 말고 정치적으로 읽을 필요”를 당부한다. 정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만약 <내부자들>이 ‘정치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정치적인 영화’였다면? 다만 고다르의 정치적인 영화가 저항과 비타협의 정치인데 반해 <내부자들>은 타협과 포퓰리즘으로서의 정치 라면? 그렇다. 우리는 강성률 평론가의 말대로 영화에서 스타일적인 의미를 찾지 말고 정치적인 의미를 찾아야 한다.
대체 누가 보는 거야 이런 종류의 글을 쓰는 건 괴로운 일이다. 이른바 요즘 한국영화 누가 봐, 한국영화 재미없어 같이 때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 한국소설 구리다, 한국미술 후지다 등등. 그런데 최근 한국 영화를 둘러싸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를테면 <국제시장>이 관객 1천만 명을 넘어 고공행진 중 일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한 이야기는 “대체 누가 보는 거야”였다. 잠시 후 친구가 말한다. 부모님이 보셨대. 최근 2년 사이 관객 동원에 성공한 영화들을 떠올려보자. <7번방의 선물>, <명량>, <변호인>, <국제시장>, <연평해전>, <암살>, <베테랑>, <사도>, <내부자들>. 이 영화들은 상이한 완성도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영화 개별의 수준이나 완성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이 영화들의 질적 수준 때문에 보러 가는 게 아니니까. 정성일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인구 5천만 명의 나라에서 한 영화가 1천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을 때 거기엔 예술이나 산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영화평론가가 아니라 사회학자나 인류학자가 나서야 한다. 질문: 한 나라에서 1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동원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정답: 선거. 한국영화들은 어느 순간부터 관객들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 신호는 영화와 관계 없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대사와 카피들을 기억해보라.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한거 알기나 할까.”, “우리 잊으면 안돼.”, “그때 그 시절 굳세게 살아온 우리들의 이야기.” 왜 영화 포스터가 어느 날부터 대선 포스터처럼 보일까?(황정민의 얼굴을 전면에 내세운 <국제시장> 포스터.) 시그널은 때론 좌우를 가르고 때론 세대를 가른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그널이 어느 쪽을 향하는가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다. 어떤 관객들은 더 이상 ‘영화’를 보러 가지 않는다. 그들은 투표하기 위해 간다. 지금의 한국영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불편한 사람들이다. 영화가 오락도 예술도 아니 고 ‘영화’도 아니게 된 이런 현상.
간단한 인구 통계 2000년 한국의 세대별 인구는 20대 820만, 30대 850만, 40대 690만, 50대 435만 명이었다. 2015년 세대별 인구는 20대 680만, 30대 760만, 40대 850만, 50대 800만 명이다. 맥스무비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20대 관객은 전체 관객의 70퍼센트에 가까웠다. 2013년에는 30퍼센트도 안 된다. 그 빈자리를 40대와 50대 관객이 채웠다. 영화는 어느 순간 선거가 되었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계와 분석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고 간단한 답에 따라 전략이 세워진다. 누가 우리에게 표/티켓을 줄 것인가. 영화/선거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정치가 싫어서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는 1889년 프랑크푸르트의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건축가이자 유력 신문 문예면의 편집장이었지만 기자로 불리는 걸 싫어했고, 철학자이자 소설가였지만 독일에서 그의 책은 모두 불태워졌다. 현대 영화 비평의 기반을 세운 명저를 썼지만 미국에선 좌파로 비난받았고 독일에선 배신자로 규탄받았다. 그는 그의 책 <칼리가리에서 히틀러까지>에서 대공황 직전의 독일 사회와 그 이후 독일 사회의 중요한 특징을 정치적 ‘마비 상태’ 로 이야기한다. 당시 독일의 중산층들은 오로지 자신의 생존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사회 변화나 구체적인 정치 상황에는 무관심했다. 이런 무관심은 정치 혐오증으로 이어진다. 말하자면 정치인들은 모두 다 썩었다는 생각. 파시즘은 이러한 정치 혐오를 바탕으로 탄생한다.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정치화 시키며(이른바 먹고사니즘) 기존의 정치 모두를 매도하는 것, 모든 문제를 카타르시스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이 지점에서 파시즘은 포퓰리즘과 결합한다. 그들의 태도는 간명하다. 너희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줄게. 크라카우어는 1933년 프랑스로 이주했고 1941년 다시 미국으로 망명한다. <칼리가리에서 히틀러까지>는 1947년에 출간됐다.
2003년 2003년 4월 한 편의 영화가 개봉했다. 나는 2003년 3월에 영화과에 입학했고 동기들과 함 께 충무로의 대한극장에서 영화를 봤다. 제목은 <살인의 추억>이었고 우리는 영화관을 나서며 백 번쯤 한숨을 쉬었다. 한국영화를 보고 이런 충격을 받은 건 모두 처음이라고 했다. DNA 분석 판정서는 기차 바퀴에 찢겨지고 박해일은 터널 속으로 사라졌다. 범인은 어디 갔지. 영화가 이렇게 끝나도 되나. 그해 4월 <지구를 지켜라>가 개봉했고 6월 <장화, 홍련>, 9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11월 <올드보이>가 개봉했다. 봉준호는 인터뷰에서 <살인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자신은 좋은 시절에 영화를 만든 것 같다고 했다. <살인의 추억>을 제작한 차승재 대표는 지금 같으면 범인이 잡히지 않는 영화는 만들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9년 후인 2012년 <광해>와 <도둑들>이 스크린을 휩쓸었다. 나는 2012년 대학을 졸업했고 소설을 쓰고 있었다. 더 이상 영화가 흥미롭지 않았다.
두 번째 첫 번째 영화 장 뤽 고다르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활동하는 동안 자신의 ‘영토’를 잃었다. 그의 정치적인 영화에 대해 프랑스의 제작자들은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에게 내려진 선고는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였다. 실험적이고 도발적인 그의 영화 제작은 비디오와 다큐, 논문, 교육용 영상을 오갔고 아무도 그의 작품을 영화로 소화하지 못했다. 그는 1980년 뉴욕에서 가진 조너선 로젠봄과의 인터뷰에서 <여기 저기>와 같은 영화들은 특정한 범주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야 했다는 점을 깨닫는 데 2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는 자신의 ‘두 번째 첫 번째’ 영화라고 말했다.
지금의 한국영화 제작은 포퓰리즘으로서의 정치 논리를 따른다. 고다르의 정치적인 영화 제작의 정확히 반대. 그렇다면 이것은 영화가 아닌가. 누구도 그런 선고를 내릴 수 없다. 그것이 어떤 방식의 정치라도 정치적인 영화 역시 영화다. 하지만 내가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는 두 번째 첫 번째 한국영화다. 정치공학으로서의 영화가 아니라 영화로서의 영화.
- 에디터
- 글 / 정지돈(소설가)
- 일러스트
- 문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