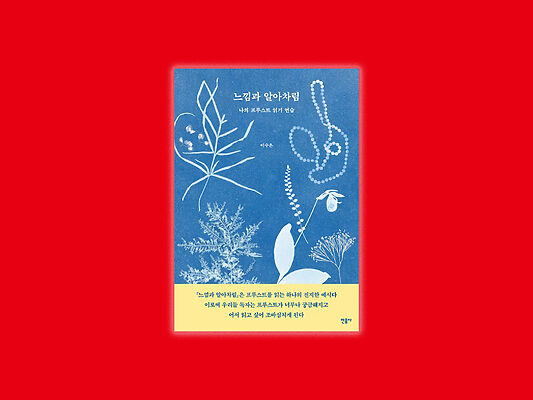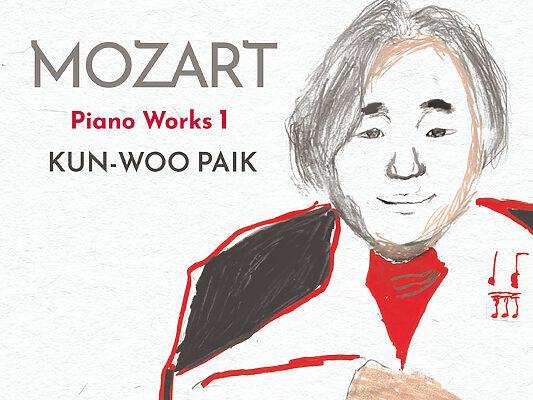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에 대한 상찬에는 빠진 게 있다.
분명 다음 편이 궁금해서 하루 만에 시즌 1 전체를 끊지 않고 봤지만 뭐가 재미있었는지, 혹은 별로였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기분. <기묘한 이야기> 시즌 1을 봤을 때의 감상이다. 몇 달 후 시즌 2를 봤다. 시즌 1보다 스케일이 커지고 캐릭터들에 깊이가 생겼으며 캐릭터 간의 관계는 촘촘해졌지만 역시 전체적인 감상은 같았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상과는 무관하게 올해 10월 27일 할로윈 시즌에 맞춰 공개된 <기묘한 이야 기> 시즌 2는 언론의 극찬을 받는 것은 물론 2017년 한 해 동안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틀어 북미 기준 드라마 부문 1위 시청률을 기록했다.
<기묘한 이야기>를 대표하는 한 단어를 꼽자면 ‘치밀함’이다. 1980년대 미국 시골 마을 호킨스를 배경으로 초자연적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드라마는 자잘한 소품과 의상, 헤어, 메이크업, 심지어 배우들의 이목구비, 스타일까지 80년대로 돌아가 당시를 대표하는 외모의 사람을 데리고 나온 듯이 자연스럽다. <스타워즈>를 떠올리게 하는 예스러운 드라마 타이틀 디자인과 포스터마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압축한 듯하다. 여기에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드라마에서 유행하고 있는 ‘초자연’ 콘셉트까지 주요 코드로 활용하니 성공한 프렌차이즈의 조건은 다 갖춘 셈이다.
주인공 아이들 하나하나는 <구니스>나 < E.T >, <어메이징 스토리> 같은 명작에 출연시킨다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성격과 외모가 잘 조율되어 있다. 아니 오히려 이 작품들 속 세계 어딘가에 살던 아이들의 숨겨진 이야기라고 하는 편이 어울릴 정도다. 아이들의 가족과 친구들, 새로운 등장인물 역시 각각 미국 하이틴 드라마의 익숙한 삼각관계나 홈 드라마의 익숙한 캐릭터를 충실히 수행하며 극의 밀도를 높인다. 하지만 바로 이 드라마의 최고 장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분에 답답함의 원인이 있다. 나는 <기묘한 이야기>를 보는 내내 평생 봐온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떠올리지 않느라 애썼고 나중에는 조금 지쳐 포기했다.
일상적 공간이 비현실적 세계로 연결되고 모험의 공간이 되는, 극 전체의 분위기는 <구니스>, 비밀 실험실에서 도망친 초능력 소녀 일레븐과 순수한 소년들의 관계는 , 윌의 집이 업사이드다운 세계와 연결되고 귀신 들린 집처럼 전자제품들이 멋대로 움직이는 모습은 <폴터가이스트>, 윌의 몸에 적의 숙주가 숨어 있다 빠져나오는 모습은 <엑소시스트>, 새끼 데모고르곤과 더스틴의 관계는 <그렘린>, 데모고르곤과 인간의 싸움은 <에이리언>과 <쥬라기 공원>, 각자 가족을 잃고 결국 대안 가족이 되는 호퍼 소장과 일레븐의 관계는 <빨간 머리 앤>, 일레븐의 염동력은 <스타워즈> 속 제다이의 포스까지…. 단순한 소품이나 시각적 인용을 제외하고 주요 전개에서 대표적으로 눈에 아른거리던 작품 몇 가지만 꼽아도 이정도다. 물론 이 드라마에서 ‘레퍼런스’는 표절이 아니라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는 듯, 시즌 2에서는 아예 <에이리언> 초기 시리즈의 배우인 폴 레이저, <구니스>의 주인공 숀 애스틴을 주요 캐릭터로 등장시키는 영리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시즌 2 공개 전후로 나온 뉴욕 매거진 기사는 대놓고 < 30 Movies to Watch If You Like Stranger Things >와 < Every Major Pop-Culture Reference in Stranger Things 2, From A to Z >란 제목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총 9편으로 구성된 <기묘한 이야기> 시즌 2를 보고 떠올린 비슷한 분위기의 추천할 만한 영화는 30편이며, 사소한 시각적 레퍼런스부터 주요 전개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는 알파벳 개수에 맞춰 스무 가지 넘게 찾아낼 수 있다. 드라마 한 편에 나오는 인용 작품의 개수가 어림잡아 50개가 넘는다면 단순히 감각적이고 재미있는 수준을 넘어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게다가 인용한 대부분이 고전 중의 고전
이라 모르고 지나치기조차 어렵다.
정작 곳곳에 배치된 ‘레퍼런스’와 ‘클리셰’를 들어내고 이 드라마만의 고유한 장점에 대해 말하라면 단번에 생각나지 않는다. 이 드라마가 왜 잘 만들고 흥행할 수밖에 없는 작품인지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작품성에 대해 할 말은 딱히 없는 것은 아마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드라마를 보는 내내 들었던 애매함의 정체는 과거부터 증명된, 많은 사람이 반응했던 공통적인 흥행 요소를 빠짐없이 집어넣어 이미 어디서 본 이야기들로 재조립한 ‘콜라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묘한 이야기>는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생, 즉 매체가 막 발달하던 시기에 태어나 평생 드라마와 영화를 공기처럼 흡수하며 성장했고, 현재는 문화 전반의 주력 소비층이자 창작자가 된 세대에게 바치는 매우 치밀한 기획물이다. 하지만 작품 전체를 통해 말하려는 바는 별로 특별하지 않거나 고민의 흔적이 없고, 전개는 ‘레퍼런스’를 통해 롤러코스터를 태우며 끊임없는 자극을 이어가는 식이다.
아무리 인상적인 레퍼런스 가 나와도 타란티노 작품의 분위기와 개성을 설명할 때、 인용된 작품을 예로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답은 쉽다.
물론 ‘레퍼런스’로 작품을 연출하는 것이 특별한 연출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연출자 본인의 취향이 드러나는 참고물을 조합하며 작품을 재구현한 쿠엔틴 타란티노나 웨스 크레이븐의 영화에서 <기묘한 이야기> 같은 답답함을 느낀 적은 없다. 오히려 정반대로 개운하고 통쾌했다. 그들의 인용은 작품 전체 스타일과 정확히 맞물려 명료한 주제의식을 보여주며 작품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기묘한 이야기>에 대해 말할 때 <구니스>나 만 예를 들어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두 작품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아무리 인상적인 ‘레퍼런스’가 나와도 타란티노 작품의 분위기와 개성을 설명할 때, 인용된 작품을 예로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답은 쉽다. 똑같이 물건을 파는 일이라도 개성과 취향이 돋보이는 편집숍과 많이 팔리는 물건을 최대한 다양하게 들여놓은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방식은 비슷하지 않으며 소비하는 기분도 결코 같을 수 없다.
<기묘한 이야기>는 마치 인공 지능으로 ‘1980년대’, ‘어린이모험영화’, ‘가족영화’, ‘괴수물’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 뽑아낸 빅데이터 결과물을 기계적으로 나열한 것에 가깝다. 특정한 메시지를 주는 작품을 만들거나 작가나 감독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레퍼런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반드시 좋아하는, 결코 싫어할 수 없는 요소를 모으고 나아가 실패의 확률을 줄인 기획물. 어쩌면 비단 <기묘한 이야기>뿐 아니라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크게 히트하여 재미있다고 증명된 것을 시리즈로 이어나가고, 그 요소를 다시 재탕하며 투자의 손실을 줄이는 것에 가까운 일이 됐는지 모른다. 그래서 보는 사람조차 새로운 것을 찾아 스스로 재미를 느끼기보단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을 의지 없이 선택해 재미있는 척하는 관성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결과적으로 누군가 <기묘한 이야기>가 재미있냐고 묻는다면, 나는 앞서 열거한 고전 영화나 드라마를 모르는 어린 세대에게는 재미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 드라마에서 인용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자라난 어른들에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품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조금 애매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상하게 한마디로 ‘재미있다’고 말하는 순간 내 안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관성에 속는 듯하기 때문이다.
이미 제작이 결정된 <기묘한 이야기> 시즌 3는 안 볼 것이다. 이 정도로 작품 그 자체보다 기획의도가 더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작품에 중독되고 쉽게 좋아하고 싶지 않다. 아직은 어릴 때 보던 것을 떠올리며 추억에 갇혀 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며, 지금도 창작자들이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그래왔듯 독창적인 창작물을 보고 자극받아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싶기 때문이다.
“본방 사수”라는 말도 사어가 됐다. TV는 동시대에 뒤처졌다. 한국 사회에서 TV는 여전히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지만 동시대 감각에 무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책임감마저 없어 보인다. “욕하면서도 본다”라는 전혀 달콤하지 않은 말에 취해 있어도 좋은 걸까? 끌 때 끄더라도 욕 한마디는 시원하게 해야겠다.
최신기사
- 에디터
- 글 / 김보화(번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