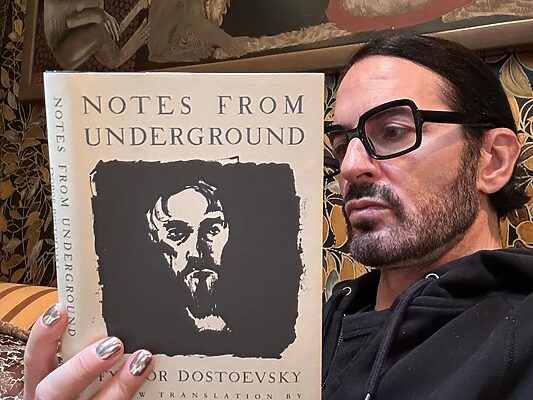나란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에 집중하면서 하프 보틀 볼링저를 마셨다. 백팩에 넣고 온 탓에 미지근하고 뒷맛이 아리송했지만, 토요일 오전 강변 벤치에 제정신으로 앉아 있단 사실이 감격스러워 맛 따위는 일도 아니었다. 그는 의자 아래로 떨어진 비스킷을 줍기 위해(비둘기가 동료들에게 과자 위치를 알리면 포위되는 건 순식간이다) 구부정하게 앉아 몸을 비틀었다. 티셔츠가 살짝 치켜 올라갔는데 복근 운동을 얼마나 한 건지, 순간 갑각류가 얼핏 지나간 줄 알았다. 옆에 앉아서 정성 들여 잘 가꾼 보기 좋은 어깨와 야무진 팔 근육, 날렵한 턱선을 대놓고 쳐다봤다. 보고 있어도 믿을 수 없었다. 몽실몽실한 흰 곰 같았던 그가 마이애미 비치의 섹시한 해상 구조대처럼 머리까지 바짝 자르고 나타났을 때의 충격은 실로 놀라웠다. 주변의 입 달린 사람은 모두 그의 달라진 몸을 찬양했지만 나는 글쎄, 서운했다. 삽살개처럼 부스스하고 너저분한 머리와 위태롭고 근심스러운 눈빛, 팔꿈치에 생기던 웃기는 보조개가 다 없어졌는데도 이자는 아직도 그자인가. 자신감 넘치고 전에 없이 활기찬 그는 더 이상 귀엽지 않았다. 어느 날 점심,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는 연어와 아스파라거스를 미리 두 사람 몫 주문한 그는 크림파스타에 상세르나 한잔하려는 나의 소박한 기대를 호통으로 날려버리고 간증에 가까운 연설을 시작했다. 하도 구구절절하니 디테일은 생략, 요점만 추리자면 “생각을 바꾸니 행동이 바뀌고 마침내 생활이, 인생이 바뀐다”는, 하도 들어서 <모래요정 바람돌이> 주제곡만큼 후렴이 자동 재생되는 뻔한 스토리. 매일 뭘 쓰거나 그리느라 책상에 너프처럼 붙어 있고, 땅바닥을 기어 다니면서 사진 짝이나 맞추고, 휴일엔 음악과 코냑, 영화와 와인 쳇바퀴, 나태하고 무기력하며 어두운 곳으로만 파고드는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얘기엔 그저 시큰둥했다. 문화적인 순간을 채집하는 그 섬세한 희열을 너 같은 무지한 근육인이 알겠니, 무시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그가 누구인가. 그는 내 자신 때때로 칠칠치 못하고 뒤죽박죽이며 허약하고 여린 인간이란 사실을 거의 유일하게 알고 있는 오래된 친구다. 게다가 운동의 정신적 효용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는 와중이고. “어렸을 땐 어딜 가든 같은 생각을 했어.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나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못생기고 뚱뚱하고 이상하다고 여기겠지. 지금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 따지고 보면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건 예전부터 있던 마음이야. 단지 실천하지 않았을 뿐이지.” 갑자기 핸섬해지더니 말도 잘하는군, 감탄하는 찰나 그가 나에게 던진 미끼는 굉장한 것이었다. “어떤 순간 결정자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뭐든 혼자 결정해야 하는 건 고문이잖아. 누가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있고 싶을 땐 없어?” 믿을 수 없게도 그렇게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트레이너가 다 정한다. 이거 열 번씩 세 세트, 저거 열다섯 번씩 두 세트. 시키는 대로 뇌를 비우고 몸으로만 움직이면 그만. 게다가 나를 체육관에 등록시키고 한껏 고무된 그는 자진해서 영양사 역할을 맡고 있다. 닭을 먹으라면 먹고 달걀을 먹으라면 또 먹는다. 컵에 든 걸 단번에 삼키라면 독약은 아니겠지, 삼킨다. 간단하다. 고민할 일은 하나도 없다. 주말엔 함께 한강 공원을 뛴다. 잘 꼬셔서 쉬는 타이밍엔 매번 샴페인과 버터 비스킷은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러닝의 명분을 만들고자 운동용 발목 양말을 수십 켤레 사들이고 있다. 물론 문제는 있다. 오늘은 멀리까지 가보자는 계획은 늘 실패로 끝난다. 산책 나온 강아지들 때문이다. 바람에 뒹구는 검정 비닐 봉지와 진심으로 싸우는 베이비 리트리버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화창해진다. 그렇지, 내 마음보다 중요한 건 없지. 내키는 대로 사는 게 맞다. 그러니 강을 건너는 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샴페인이나 한 병 더.
- 편집장
- 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