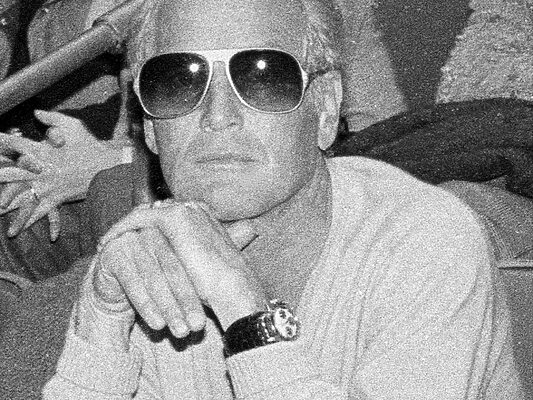로봇 팔이 손맛을 대신하는 일은 요원해 보이지만, 조리의 영역으로 훅 들어온 로봇을 보자 하니 식탁 위에 변화가 불어올 것만은 분명하다.

신기한데 신기하지 않다. 로봇이 만드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카페나 음식점에 로봇이란 수식어가 심심찮게 붙지만 자세히 보면 그냥 로봇 팔이다. 전보다 조금 정교해진 건 알겠다. 하지만 이걸 로봇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상암동에 라디오 녹음하러 갔다가 들른 무인 로봇 카페 스토랑트에서도 그랬다.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로봇 팔이 나 대신 커피 머신의 버튼을 눌러준다. 호텔 뷔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의 커피 머신에서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 커피를 추출하고 뜨거운 물을 타서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준다.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얼음을 컵에 담는 동작 정도가 추가된다. 완성된 커피를 서빙 로봇이 내가 미리 지정한 테이블로 가져온다. 아직 서빙 로봇에는 팔이 달려 있지 않아서 내가 직접 컵을 집어 들어야 한다. 그저 조금 더 정교해진 자동판매기이다.
분당 라운지X에선 로봇 팔이 더 많은 일을 했다. 원두가 분쇄되면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가져가 커피를 추출할 준비를 한다. 회전 레일에서 로봇 팔이 빈 잔을 집어 에스프레소 머신 아래 두면 커피가 자동으로 추출된다. 로봇 팔이 그 잔을 다시 레일로 옮기면 사람이 건네 들고 따뜻한 우유를 섞어 카페라테를 완성한다. 맛은 괜찮았다. 하지만 로봇이 하는 일은 역시 제한적이다. 온도와 습도에 맞춰 원두 분쇄도나 추출 압력, 온도를 조절하는 지능은 아직 장착되지 않아서 사람이 하나하나 세팅해줘야 한다. 세팅을 변경하는 도중엔 로봇 대신 사람이 커피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로봇이 자주 고장나는 걸로 오해하는 손님도 많다고 한다.

강남역 근처에는 한식로봇주방도 있다. 이름 잘 지었다. 봇밥이다. 고추장불고기덮밥 세트를 주문했다. 매콤한 제육불고기를 올린 덮밥이 고추장돼지고기찌개와 함께 나왔다. 고기 양도 많고 고열에 볶은 풍미도 좋았다. 중식도 아닌데 불맛이 났다. 이걸 로봇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내 착각이었다. 제육볶음은 주방에서 요리사가 만들었다. 로봇은 찌개를 끓였을 뿐이다. 사람이 소분해서 뚝배기에 재료를 넣어주면 그걸 인덕션 레인지로 옮겨 3분 30초 동안 끓여낸다. 로봇이 아직 온전히 한 사람 몫을 해내진 못한다. 봇밥의 대표 김용 씨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이 직원 0.3명 노릇을 한다고 밝혔다. 로봇 팔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 하나에 2천5백만원 수준이다. 로봇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식재료를 더 풍성하게 쓰기는 힘들 것 같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로봇의 요리 솜씨가 그리 뛰어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제일 진보한 요리 로봇이라며 영국 제작사가 올해 초 CES에 내놓은 야심작 몰리 Moley는 로봇 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무려 5천 가지 요리를 해낼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유튜브에 올린 파에야 시연 동영상을 보면 살짝 한숨이 나온다. 4억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를 자랑하지만 칼질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다. 양파를 썰어 담고 토마토를 조각 내어 쌀과 함께 용기에 넣는 식으로 재료 준비를 사람이 직접 해줘야 한다. 그런 수작업 뒤에야 두 개의 로봇 팔이 팬에 기름을 두르고 재료를 볶고 쌀을 넣고 저으면서 익혀서 파에야를 완성한다. 감히 파에야를 휘젓다니, 발렌시아 사람들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결과물도 파에야라기보다 질척한 볶음밥에 가깝다. 이 정도로 인간 요리사를 대체할 수 있을 거 같진 않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로봇의 완성도는 아직 높지 않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금은 셰프의 요리 동작이나 바리스타의 핸드 드립을 로봇이 흉내 내는 정도이지만 완벽하게 따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유명 셰프의 손맛을 로봇을 통해 대신 맛볼 수도 있을 테다. 게다가 사람보다 로봇한테 시키는 게 더 나은 요리 과정이 분명히 존재한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다. 아무도 프렌치프라이 튀기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바쁘면 깜박하고 조리 완료 경보음을 지나칠 우려도 있다. 로봇이 하면 이런 위험과 실수를 모두 피할 수 있다. 미국 햄버거 체인 화이트캐슬은 프렌치프라이를 만드는 플리피2라는 로봇을 시험 운영 중이다. 이전 모델은 더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튀긴 프렌치프라이를 트레이에 옮겨 담지 못했지만 새 버전은 더 작고 기능도 추가됐다. 주문량에 맞게 프라이를 담고 조리가 완료된 다음에는 트레이에 쏟아 넣는 동작까지 가능하다. 햄버거 패티를 구우면서 카메라로 온도를 스캔해 뒤집는 로봇도 이미 시험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정부의 재난 지원금으로 여유가 생긴 덕분에 전처럼 고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식당 입장에서는 로봇 사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 락다운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의 편리함을 맛본 고객이 원래대로 매장 식사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경향도 이런 레스토랑 자동화 트렌드에 한몫하고 있다.

미국에서 로봇이 프렌치프라이를 튀긴다면 한국에선 프라이드치킨 아니겠는가. 롸버트치킨 강남2호기점에 들러 순살치킨을 주문했다. 염지된 닭고기 조각을 반죽기에 투입하면 튀김옷이 입혀진다. 튀김옷이 입혀진 닭고기를 바스켓에
넣어주면 로봇 팔이 튀김기에 바스켓을 옮겨 튀김 작업을 시작한다. 중간에 바스켓을 흔들어주며 치킨이 엉겨 붙는 것을 막는다. 완성된 치킨을 부어서 양념에 버무려주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숙련된 사람보다는 동작이 느리다. 너무 빠르면 사람과 부딪쳐 사고를 낼 수 있다. 맛은 로봇이 튀겼는지 사람이 튀겼는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무난하다. 하지만 1시간에 40~50마리의 닭을 튀기면서도 사람이 튀김기 앞에서 기름 연기를 들이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건 큰 장점이다.
매장에 로봇을 도입해 요리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직원들이 고객과 대화를 나누거나 다른 일을 할 여유가 늘어날 거라는 주장이 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로봇 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직원은 1명이었지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충분했고 직원들 표정도 밝았다. 어느 매장에서든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한다기보다는 고객의 흥미를 끄는 역할이 더 커 보였다.
진짜 재미는 로봇이 AI와 결합해 사람은 만들 수 없는 요리를 만들게 되는 때부터가 아닐까. 이미 3D 프린팅으로 새로운 모양의 음식을 뽑아내고 레이저로 정밀하게 요리를 가열해서 촉촉하게 고기를 굽는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AI 셰프봇도 있다. 미국 유통업체 크로거가 만든 셰프봇은 사용자가 냉장고에서 세 가지 재료 사진을 찍어서 트윗하면 재료를 식별하고 수초 내로 그 셋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를 추천해준다. 냉장고 파먹기에 딱이다. IBM이 요리학교와 협력해서 만든 셰프왓슨처럼 인공지능을 이용해 음식의 풍미 요소를 분석해 새로운 조합을 찾아내고 벨기에 베이컨 푸딩 같은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왓챠에서 내 예상 평점을 보여주는 것처럼 앱으로 내 음식 취향을 분석해서 레스토랑 메뉴 중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을 음식 조합을 찾아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의 요리 로봇이 놀라워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자. 로봇한테 서프라이즈 메뉴를 달라고 청할 날이 머지않았다. 글 / 정재훈(약사, 푸드 라이터)
- 피처 에디터
- 전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