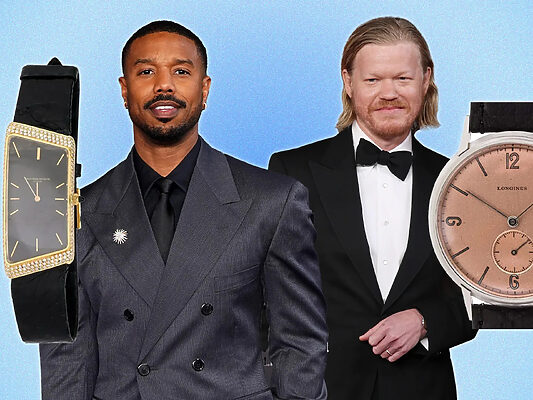이도다완은 일본의 국보다. 그걸 건네준 조선에선 이도다완을 전혀 찾을 수 없다. 김지완은 찾지 않고 만들었다.



“과연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 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선 조선이 남긴 것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도다완에 대한 이야기다. 이도다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6세기에 만들어져 일본으로 넘어간 후 모든 것이 미스터리로 남았다. 일본 국보 26호인 기자에몬 이도喜左衛門 井戶를 비롯해 현존하는 모든 이도다완을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이도다완이 일본 다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즐기는 말차(가루차)는 움푹 파인 찻사발, 즉 다완에 녹차가루를 넣고 물을 잘 섞어 두 손으로 마신다. 이때 이도다완을 으뜸으로 여기고 사용했는데 조선에서 넘어간 이후에 누가 소유했고, 어디서 사용했는지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반면 조선에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도다완’이라는 말도 일본에서 붙인 것이다. 이도다완에서 우리나라의 것을 찾을 순 없다.
“아주 좋은 조건의 이도다완을 제대로 구현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특징이 한 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야 해요.” 작가 김지완의 말이다. 그는 거의 30년 동안 이도다완에 매달려왔다. 그 결과 몇몇의 조선시대의 그것과 비슷한 모습을 재현할 수 있었다. “이도다완은 제게 평생의 숙제입니다. 요즘 장비가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졌지만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조상들은 어떻게 무심하고 대범한 작품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무섭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짠하기도 합니다. 제 목표도 저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열일곱 살부터 도예를 시작했다. 어떤 의심도 없었다. 그는 운명이라고 말했다. 운명은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특히 이도다완은 근본이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만든다해도 확실하지 않다. 가혹한 일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본에선 좋은 이도다완을 선별하는 ‘이도다완의 약속’이라는 조건을 만들었다. 약 십여 가지의 기준인데 그 약속을 최대한 갖출수록 좋은 작품이다. 이를테면 다완의 색깔은 사람의 살색과 같이 붉으스름한 황토색, 즉 비파색이어야 하고, 입술이 닿는 지점이 그 입술 모양을 닮아 살짝 도톰한 모양일 것. 도공이 물레를 돌리면서 남긴 손자국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으며 유약이 주름같이 갈라지거나 방울지는 현상이 굽둘레에 나타나야한다. 게다가 굽 바닥이나 다완 안쪽 바닥에 용의 발톱처럼 다완을 포개 구울 때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흙을 구슬처럼 만들어 붙인 자국이 5개 남아있어야 한다. 위아래 바닥에 모두 나타나면 더 좋다. 그리고 몸체에 유약이 부드럽게 흘러 그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하지만 김지완은 이 약속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모든 조건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야 해요. 모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부드러우면서도 망설이지 말아야 하죠. 뭐든 그렇겠지만 짜임새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지완의 이도다완엔 정교한 구조가 있다. 그걸 본능이라고 말해야 할까? 만든 사람만이 아는 유약의 진동. 아무렇게 흘렀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품위가 그의 이도다완에 있다.
과거엔 사라졌으나 지금 되찾는다면 그냥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도다완을 다시 만드는 건 지금부터 우리의 다례 역사가 시작했다는 또 다른 기록이 될 수도 있다. 5백 년 전과 1천 년 전은 엄격히 다르지만, 먼 과거라는 하나의 틀로 묶을 수 있는 지금, 5백 년 후엔 지금과 16세기가 하나로 묶일 수도 있다. 아주 오랜 후에 김지완의 이도다완이 어떤 식으로 기록될지는 모를 일이다. 그의 전시 <결>은 11월 8일부터 서울 종로구 학아재 갤러리에서 열린다. hagajaegallery.com
최신기사
- 에디터
- 양승철
- 포토그래퍼
- 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