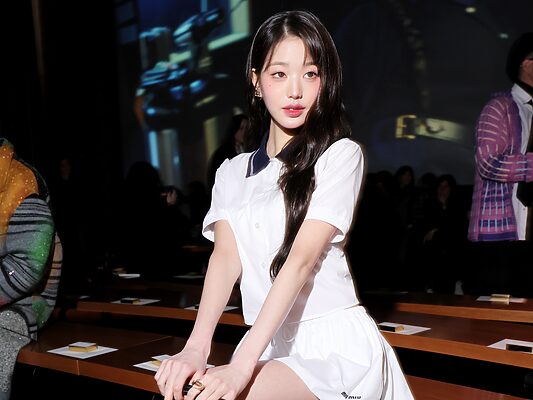새해라서, 복싱을 시작했다. 챔피언이 되기보다, 부끄러움을 떨치기 위해 거울 앞에 선다.

유명우는 지는 법이 없었다. 본관 같은 건 몰라도, 성이 같다는 이유로 도화지에 챔피언 벨트를 그렸다. 같은 이유로 유남규를 좋아했다. 유명우와 장정구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가늠하는 일은 김택수와 유남규의 경우보다 좀 더 어려웠다. 유명우의 은퇴 이후, 복싱은 중계보다 뉴스에 더 가까워졌다.
파퀴아오가 리키 해튼을 때려눕힌 날, 줄넘기를 들고 집을 나섰다. 복싱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오래됐지만, 계기가 없었다. 주먹 하나는 더 큰 거구가 빗자루 미끄러지듯 링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걸 보고 주먹을 입에 물었다. 주먹을 쥐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또 거기까지였다. 그날 이후론 줄넘기를 꺼낸 적이 없다. 그게 벌써 2년이 넘었다.
언제나 처음은 부끄러웠다. 새 신발은 비오는 날 신었다. 데이트하기 전에 미리 도착해 음식점의 메뉴를 외웠다. 권투는 새 신발이나 처음 가는 음식점보다 더 낯설었다. 글러브가 수영모나 탁구채와 제일 다른 점은, 도전자의 의지보다 크기일 것이다. 들고 다닐 만한 용기도, 숨길 큰 가방도 없었다. 그저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 원래 좋아했던 것처럼 보이면 좋으련만. 늘씬한 여배우의 복싱대회 우승이나, 크리스찬 베일의 열연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 복싱이 옛날부터 하고 싶었다는 말은 김연아에게 관심은 없는데 피겨는 하고 싶다는 말처럼 들리겠지.
새해니까, 새해엔 뭐든 할 수 있으니, 체육관을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여기저기에서 새해 다짐이 넘치니, 좀 덜 부끄럽고 덜 어색했다. 복싱을 한다는 말을 복음처럼 전파했다. 감시자가 필요했다. 헬스를 몇 번 하다 실패한 걸 제외하고 땀에 젖을 만큼 뛰어본 적이 드물다. 샤워하고 주먹에 수건을 둘둘 말고 나면 그럴싸해 보였지만, 언제 다시 그만큼 머리가 젖을지 알 수가 없었다.
회사 근처의 체육관을 새로 등록했다. 샤워실이 있고, 옷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다. 체육관엔 사람이 적었다. 파란 글러브를 받았다. 관장님은 줄넘기를 땅바닥에 던져주며 “3라운드!”라 일갈하는 대신, 손에 붕대를 감아줬다. “이거 왜 이렇게 뻑뻑하게 감는 줄 알아요?” “손 다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어깨 힘 빼라고. 주먹 꽉 쥐면 어깨에 힘 들어가요.” 강한 비트의 록음악 대신, 걸 그룹의 댄스 가요가 나왔다. “칙칙” 소리를 내는 건 피할 때가 아니라. 때릴 때 숨을 뱉어야 해서다. 영화에서 보던 건 다 틀렸다.
실제 경기처럼 3분마다 공이 울렸다. 소리에 맞춰 거울 앞에서 줄넘기를 시작했다. 몸이 부끄러운 건 꽤 오래됐다. 애인은 뱃살을 두드리며 안정감을 찾는다. 복근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간혹 복근이 있는 남자를 곁눈질한다. 생각해 보니 좀 화가 나서 더 높이 뛰었다. 마음을 다스리기보다, 마음을 괴롭히는 편이 복싱엔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착지할 때마다 볼 살이 솟아올랐다. 보이진 않지만 배, 옆구리, 어깻 죽지도 마찬가지였다. 온몸의 군살이 제멋대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부위별로 보였다. 안경을 벗었다. 안경을 벗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체육관엔 여자가 많았다. 엉덩이가 올라붙은 여자들이 긴 트레이닝복을 입고 줄넘기를 뛰거나, 다리를 쭉쭉 찢으며 스트레칭을 했다. 미간을 찌푸리고 거울에 바싹 붙어 자세를 교정했다. 부끄럽지 않으니, 배움이 빨라졌다.
다섯 번쯤 갔을 때, 처음 샌드백을 때렸다. 스텝, 스텝, 잽, 스트레이트…. 샌드백은 때리는 만큼 고스란히 돌아왔다. 피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군. 주먹을 실컷 뻗고 나면 마무리 운동을 위해 링 위에 올랐다. 복근을 비틀어 짜고, 목 근육을 단련했다. 어깨에 힘을 주면 승모근이 목도리도마뱀처럼 펼쳐지는 모습을 기대하며 억지로 버텼다. 기진맥진. 온몸이 잠자리 날개처럼 떨렸다. 링 위는 푹신했다. 경기에서 얻어맞고 넘어지면 이런 기분일까? 아침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과연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까.
주말을 앞둔 어느 날, 링 위에서 체급이 안 맞아 보이는 두 남자가 주먹을 주고받고 있었다. “저거 스파링 아니야? 메스게임 하라고 올려놨더니….” 메스게임은 가짜로 치고 맞는 연습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주먹이 가짜 같아 보이진 않았다. 둘 다 괜찮은 걸까? 주말에 놀러 안 가나? 얼굴에 상처 날 텐데. 구경을 하다 말고 글러브 낀 손으로 광대뼈를 툭툭 쳐봤다. 세게, 세게, 더 세게. 때리는 연습은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맞는 건 여기서만 할 수 있다. 아니, 여기서 하는 게 좋다. “저, 관장님. 스파링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누굴 줘 패려고 체육관에 온 건 아니다. 정신수양 같은 건 상술이라 믿는다. 스스로 부족한 게 뭔지 잘 안다. 좀 맞고 일어나면 또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싫은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후배를 보고 대견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거절당하는 게 싫어 사랑을 고백하지 않은 적도 많다. 피하기만 하면 카운터펀치 같은 건 없을 텐데, 스파링을 보면서도 남들 얼굴 다칠 걱정이나 하고 있다니. “원투까지 배웠죠? 내일부터 훅 들어갑니다. 스텝 좋아요.” 기어이 링 위의 ‘홍 코너’가 바닥에 쓰러졌다. 다시 안경을 벗고 줄넘기를 잡았다.
최신기사
- 에디터
- 유지성
- 아트 디자이너
- 일러스트레이션/정원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