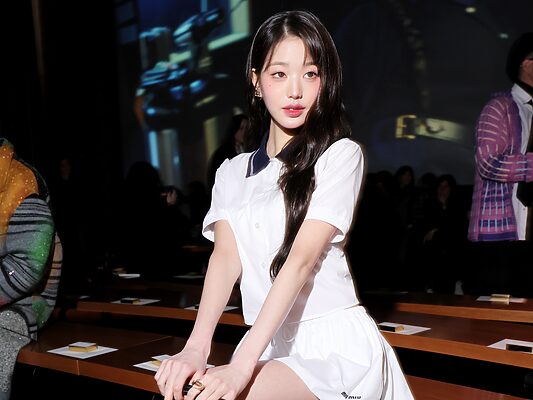소유할수록 행복해진다는 말의 반기를 든, 비움의 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짐이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들이 최근에 버린 물건. 그리고 대신 느끼는 개운함.

종이 쇼핑백 쇼핑백에 대한 강한 애착 아니 집착이 있다. 매거진 어시스턴트 시절 수많은 퀵을 쇼핑백에 담아 보내야 했던 나에게 직업병처럼 생겨버린 습관이랄까. 빳빳하고 튼튼한 새 쇼핑백을 얻게 되면 이유 모를 안정감을 느끼며 ‘언젠가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에 고이 모셔 둔다. 사무실 한 켠에도 어김없이 쌓여 있는 쇼핑백. 그 모습을 본 직장 동료의 한 마디, “환경 생각한다고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쇼핑백을 모아?”라는 말에 쇼핑백 집착이 사라질 줄이야.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더라. 그 말을 들은 직후, 예쁜 종이 상자에 소중히 담아 버렸다.
조윤주, 편집숍 <아데쿠베> 마케터
십자가 목걸이 어릴 때부터 목걸이 대한 애정이 컸다. 아마도 부모님이 서로에게 목걸이 선물을 자주 주고 받아서일 거다. 2016년 추운 겨울, 어머니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받았다. 날씨가 좋았던 날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선물이라고 해서 나름의 의미도 있었다. 잘 때나 씻을 때, 운동할 때도 안 뺐다. 심지어 촬영할 때도 “혹시 이 목걸이 착용하고 찍어도 될까요?”라고 많이 물어본다. 최근에 그 십자가 목걸이가 뚝하고 끊어졌다. 꽤나 녹슬어서 예상은 했지만 정말 끊어지니까 마음이 아팠다. 어머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 무엇이든 사랑해야 오래 남는다는 말과 함께 혼자 여행 다니면서 샀던 펜던트 목걸이를 새로 건네주셨다. 끊어진 이후에도 마음을 떼고 싶지 않아서 못 버렸던 십자가 목걸이, 이젠 안녕.
토비, 모델
커트 레자칼 미용을 시작하면서 10년 넘게 나와 함께 했었던 커트 레자칼. 커트를 할 때 자연스럽고 가벼운 느낌을 좋아하는데, 레자칼은 그런 느낌을 만들기 좋아 자주 애용하는 커트 도구 중 하나다. 부서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었지만 오랜 시간 정든 물건에 대한 아쉬움에 한동안 힘들었다.
박창대, 헤어 스타일리스트
메종 마르지엘라 지갑 모든 것에는 추억이 함께하고, 옛 연인이 선물로 준 물건에는 더 특별한 추억이 깃들어 있다. 새로운 걸 위해 낡은 지갑 하나를 버렸을 뿐인데, 오만가지 이상의 것들을 버린 기분이 드는 건 나 혼자만의 착각일까? 난 지갑과 함께 그녀와의 추억을 버린 거다.
안효민, 만화가
와인병과 말린 꽃 집에서 혼자 또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와인 마시는 걸 즐기는 편이다. 예쁜 레이블이나 특별한 와인을 마시면 그 시간도 좋고, 다시 못 만날 와인일 수도 있어서 꼭 와인병을 모아둔다. 벽 아래 와인병으로 줄을 세워두고 마치 주술사가 사는 것처럼 꽃을 말려서 꽂아두곤 했었다. 그러다 문득 지나간 순간들을 뭐 이렇게 붙잡고 놓칠 못하나 싶어서 마음먹고 버렸더니, 와인병은 이웃 주민이 부끄러울 정도로 긴 행렬, 꽃은 대용량 쓰레기봉투에 한가득. 거의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에나 나올법한 이웃으로 살고 있는 걸 들킬 뻔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는 걸로.
장세현, 패션 PR
에르메스 슬리퍼 스타일리스트 독립 후 ‘나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던 난 아무 생각 없이 에르메스 매장으로 향했다. 그중 가장 눈에 밟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었다. 이후 4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슬리퍼는 얼마 전 비가 와 끊어지고 말았다. 에르메스 매장에서도, 명품 수선집에서도 어렵다고 했다. 언제 어디서나 날 빛나게 해준 너, 이제는 쿨하게 보내줄게.
임진, 스타일리스트
울 코트 대학생 시절 구매한 울 코트. 나에게 정말 잘 어울리기도 했고 그때의 추억이 담긴 옷이라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교 때 친구들과 멀어지는 일이 있었다. 그 뒤로부터는 보기가 싫어지더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집 주변 수거함에 넣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위해 난 지금 새로운 코트를 보고 있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버림. 잘했어, 나 자신.
최수정, 광고 마케터
산타 마리아 노벨라 타바코 토스카노 공병 여행을 가든, 출장을 가든 그 도시와 닮은 향수를 사는 습관이 있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타바코 토스카노는 밀라노 출장 때 산 향수다. 쓸쓸하고 스산한 겨울의 밀라노와 썩 잘 어울리는 향이랄까? 타바코 베이스에 바닐라와 우디가 오차 없이 어우러지는 게 무척 매력적이다. 타바코 토스카노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토스카나 시가’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는 점도 마음에 든다. 구매한 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질리도록 뿌렸다. 탈탈 털어 쓴 탓에 세 병이나 생겼고, 얼마 전 괜한 마음에 버리지 못하던 공병들을 모두 버렸다. 그리고 네 번째 타바코 토스카노를 장만했다.
신은지, <보그 코리아> 패션 에디터
프라다 신발 때는 지난여름, 술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정말 이유 없이 신발 밑창이 덜컥하고 떨어졌다. 신사동 한복판에서 응급처치로 본드도 붙여보고 명품 수선집에 문의도 했지만, 죽은 건 다시 살릴 수 없다는 말뿐. 못 신는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또 버릴 순 없어서 신발장 자리만 차지하던 나의 프라다 신발. 이제는 떠나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도혜, <도혜 윤> 디자이너
20대 때 입던 옷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서 방을 보는데 깔끔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커다란 비닐을 꺼내 이제는 입지도 않을 20대의 추억이 깃든 옷가지를 모두 정리했다. 그러고는 나와 취향이 겹치는 친구에게 선물했다. 지금의 나는 30대로 접어 들었고, 앞으로 새것을 들여오려면 비움이 필요하다. 옷을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는 사진으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며 미련 없이 정리했다. 그걸로 됐다.
김성민, 포토그래퍼
최신기사
- 에디터
- 글 / 주현욱(프리랜서 에디터)
-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