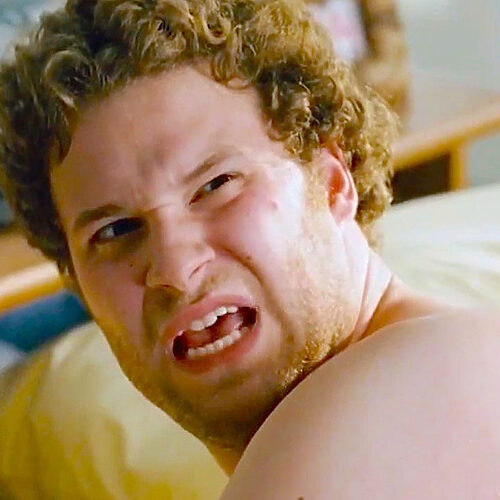우리의 집단적 생산성 집착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다.

인류학자 제임스 수즈먼은 신작 『Work』에서 ‘무조건 더 생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어떻게 농경의 시작과 함께 태동했는지 추적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읽지 않은 이메일이나 슬랙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며 ‘생산적이지 않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도 생산성의 강박에 익숙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 대부분에게 생산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은 직장뿐 아니라 사적인 삶에서도 배경음처럼 흐른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주머니 속에 메일함을 넣고 다니게 되었을 때부터 이런 집착이 시작된 걸까? 아니면 인터넷이 생겨 시공간을 초월해 일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일까?
그러나 인류학자 제임스 수즈먼 박사는 새 책 『Work: A Deep History, From the Stone Age to the Age of Robots』에서 그 뿌리가 훨씬 더 깊다고 말한다. 무려 만 년 전, 농업 혁명과 식량 부족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뭄이나 해충이 발생하면 작물이 망가지고 기근이 닥쳤다. 이때부터 ‘부족함’과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짝을 이루기 시작했다. 즉, ‘항상 부족할 수 있으니 끊임없이 더 만들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즈먼은 자신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남아프리카의 부시맨 공동체, 특히 수렵채집 생활을 현대까지 유지했던 주/호안시 부족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들은 일주일에 고작 15시간만 일했다. 수즈먼은 이들의 생활을 농경 사회와 대비시켜 현대적인 ‘노동’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단순히 생산성에 집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시간, 역사, 땅, 타인과의 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변화시켰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기존의 ‘일 중심 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긴 경제 불평등과 환경 파괴를 직면하게 되었다. 수즈먼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만들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한다.

항상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농경 사회에서 시작된 건가요?
농경 이전의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일이 삶을 먹여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만족스럽게 여겼죠.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뭐 했냐? 지루하지 않았을까?”라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냥은 심장, 영혼, 두뇌까지 모두 쓰는 일이었습니다. 지적 능력과 감각의 결합이었죠. 그래서 일을 끝내면 정말 충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운동하거나, 등산하거나, 어떤 창작 활동을 하고 난 후의 그 만족감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충분히 만족했고, 쉬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하루 노동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수많은 위험에 노출됐고, ‘일’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게으름은 악, 일은 선”이라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수렵채집인들은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부시맨이나 대부분의 소규모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그런 개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30만 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은 환경을 잘 알고 있었고, 대응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칼라하리 사막처럼 혹독한 환경에서도 그들은 100종 이상의 식물을 활용했고, 어디에서 어떤 동물이 사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매일 체득한 경험 덕분이었죠. 농사를 지으며 단 1~2개의 작물에 의존하게 되면, 환경 리스크에 취약해집니다. 가뭄이 오면 수확이 전멸할 수도 있죠. 반면 수백 종의 야생식물에 의존한다면, 어떤 것이든 살아남아 제공됩니다. 그들은 환경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항상 대비되어 있었고, 하루 두세 시간의 ‘즉흥적인’ 노력만으로도 에너지 요구량을 충족시켰습니다.
이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도 달랐겠네요.
정확합니다. 부시맨들과 함께 지내며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도 그거였어요. “과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써”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현재’에 철저히 집중하며 살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저 ‘어제’, ‘그저께’, ‘옛날’, ‘최초의 시기’ 정도로 구분될 뿐이었죠.
그렇다면 게으른 사람은 없었나요?
게으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무임승차자를 문제 삼지만,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사냥 화살을 만든 사람이 고기의 소유자가 되는 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냥을 못하더라도 고기를 ‘소유’할 수 있었죠. 공동체는 서로 돕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성공 요인은, 모두가 똑같이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술을, 어떤 사람은 사냥을 하면 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많은 나라에서 기본소득 개념이 논의되고 있고, 특히 생산성 중심 시스템의 환경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실 산업화된 세계에서는 더 이상 진짜 ‘결핍’이 없습니다. 미국의 식량 생산 인구는 1%뿐인데, 먹지 않는 음식이 버려지는 양이 먹는 양만큼 많죠. 그런데도 우리는 ‘더 가져야 한다’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연결되는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이 아닌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죠. 이웃과 비교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자꾸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광고 산업은 우리가 몰랐던 필요를 새로 창조하죠.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