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동네에 오밀조밀한 음식점과 가게가 생긴다. 특유의 분위기와 독특한 사람들이 피어난다. 그러다 갑자기 확 쓸려나간다. 골목 문화의 시작은 지역마다 이유가 달라도, 골목의 소멸 이유는 비슷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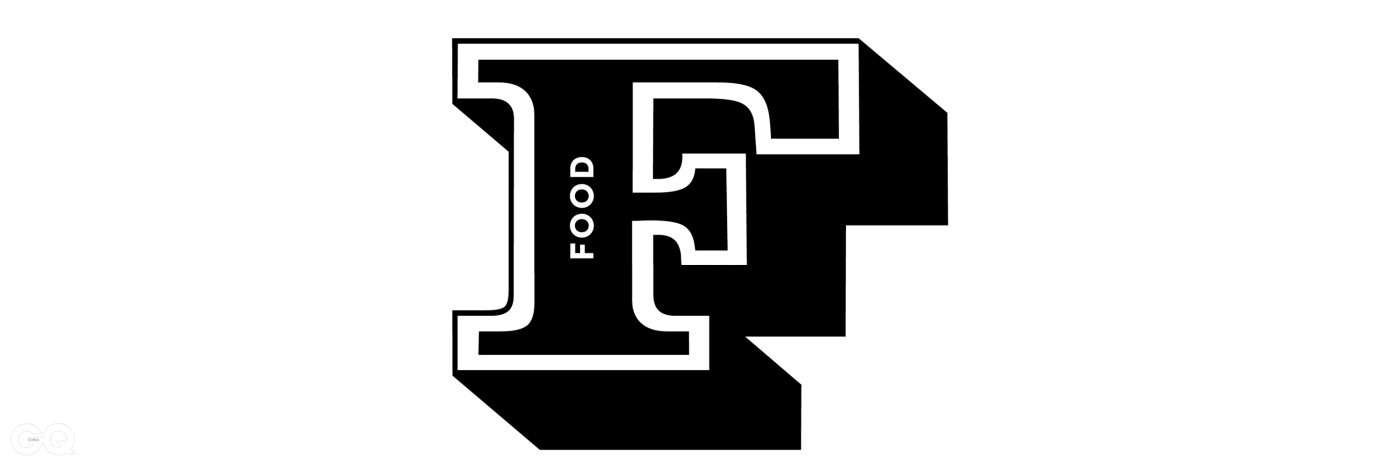
7년 차 식음료 담당 에디터로서 그동안 수없이 ‘새로운 가게’를 지면에 소개했다. 어떤 날은 홍대로, 어떤 날은 청담동으로 갔다. 최근엔 꽤 많은 날을 한남동에서 촬영했다. 7년 전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가로지르기 위해 찾던 경리단길이었지만, 지금은 입맛 당기고 눈길 당기는 가게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섰다. 브랜드 행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게를 소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꼭 들르던 가로수길은 마지막으로 가본 지가 언제인지 날수를 거슬러 올라야 한다. 바뀐 것은 그뿐이 아니다. 소개한 식당이 몇 달 뒤 사라지는 비율도 높아졌다. 뛰어난 요리를 안정적으로 선보이는 발군의 식당도 폐업을 피해가진 못했다. 예약 전화를 넣었는데 갑자기 증발한 경우도 있고, 주인이 바뀌어서 주방 쪽을 기웃거리다 겸연쩍었던 적도 있다. 소개하는 사람 입장에선 맥빠지는 일인데, 이런 일이 갈수록 더 자주, 더 또렷하게 일어나고 있다.
상권이 형성되고 한 차례 거품이 일었다가 서서히 쇠락하는 일은 어느 도시에서나 일어난다. 팽창하고 번져 나가고, 유동인구가 말 그대로 여기에서 저기로 흐르고, 뜨는 동네에 미디어의 관심이 쏠리는 일이 새삼스럽진 않다. 하지만 서울에서 유독 울룩불룩 솟았다 꺼지는 골목의 유행이 걱정스러운 데는 짚고 넘어가야 할 뒷배경이 있다. 골목이 생성된 이유와 아무 상관없이, 사라지는 건 단순한 이유로 좁혀지기 때문이다.
확 찔러 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부자들 때문이다. 꼭 집어 말하면, 그중에서도 골목 문화 발전에는 이해도 공감도 개입도 관심도 없는 건물주들 때문이다. 유행의 빠른 변화, 취향의 변덕, 돈으로 거래되는 블로그 마케팅, 그 유명한 ‘다이내믹 코리아’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허무한 결론이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자조로, 관행이라는 위안으로 덮어두기엔 부동산 부자들의 탐욕이 골목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례 몇 가지만 짚어봐도 또렷하게 드러난다.
경리단길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재미는, 소박한 동네 그대로의 모습 사이사이에 독특한 개성을 가진 가게들이 들어선 데 있었다. 비디오가게, 세탁소, 부식가게가 좁은 언덕길을 마주 보고 있는 모습. 하지만 몇십 년째 이 길에서 장사를 했던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상권이 들썩이는 걸 느낀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려달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리단길은 특유의 색깔을 잃고 그저 유동인구가 많은, 그냥저냥 괜찮은 상권 정도로 바뀌게 될 것이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이 동네를 일궜다고도 할 수 있는 잘나가는 식당들조차 건물주와의 월세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 서촌도 상황이 비슷하다. 홍대 앞에서도, 가로수길에서도, 똑같이 거쳐온 과정이다.
골목길에 사람이 많아지고, 가게에 손님이 늘면, 건물주는 월세를 올린다. 주변 시세에 맞추겠다는 건데, 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그게 정당한 요구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건물주에게 건물은 돈을 뽑아내는 확실한 투기 대상이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더 받아낼 수 있을지 늘 계산기를 두드리고 머리를 굴린다. 결국 상권을 일으키고 손님을 일군 임차인의 노력은 건물주의 지갑 속으로 사라진다. 수익은 월세금으로 내기 바쁘고, 확실한 보상은 가게를 닫을 때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 밖에 없으니 오래된 가게가 생길 수가 없다. 지난 3월 11일, 서울시에서 지난 4개월간 서울 시내 상가 5천여 개의 임대 기간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균이 1.7년이었다.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 건물주의 요구에 돈을 벌어도 매달 수지타산 맞출 궁리를 해야 합니다. 이 동네 건물주의 70퍼센트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가로수길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던 사업가 A씨가 말했다.
권리금 문제 역시 곪을 대로 곪았다. 권리금 제도 자체는 타이머가 켜진 폭탄을 상인들끼리 돌리고 있는 꼴과 비슷하다. 잘되는 상권일수록 이런 폭탄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진다. 영업이 잘되는 자리에 가게를 열려면 그 자리에서 먼저 장사하던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의 권리금을 주는 게 우리의 관행이다. 보증금보다 2~4배 정도 높다. 이 권리금은 건물주와 상관없이 임차인끼리 주고받는다. 좋은 가게의 형성 요건이 오로지 ‘좋은 목’이라고 판단하는 듯한 권리금 관행에 화도 나지만,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 골목 문화가 잘 형성된 일본에도 권리금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엔 권리금의 관행을 악용하는 관행이 있을 뿐이다. 건물주는 온갖 방법으로 이 권리금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권리금을 건물주가 가로채는 방법도 유행 중이다. 게다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상권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한다. 그들은 권리금을 내지 않고 들어오는데다가, 주변 월세 시세를 엄청나게 올리니, 이들의 등장은 폭탄의 마지막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다.
지난 2월 25일, 정부가 꼼수로 너덜너덜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더 촘촘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식 변화 없이는 법이 개정된다 한들 언제든 다시 뚫릴 수 있는 허술한 안전망이 될 수밖에 없다.
먹고 마시는 걸 유난히 좋아하고, 맛집이라고 하면 우르르 찾아가 숟가락을 꽂고 보는 우리지만, 요식업 문화는 도대체가 농익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오래된 가게가 생겨날 수 없는 구조와 인식 때문이다. 홍대 앞에서 ‘나물 먹는 곰’을 비롯해 6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한 대표는 동네 감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홍대 바닥에 대한 애정이 크다.
“저 역시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 때문에 오랫동안 운영하던 식당의 문을 닫아야 했어요. 밥 장사해서 그 엄청난 월세를 낼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홍대 앞은 출판문화와 미술이 결합된 독특한 하나의 ‘타운’입니다. 홍대 사람이라는 그 색깔을 지키고 싶은데…. 이제 연희, 연남, 상수, 망원으로 자꾸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주변 상인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함께 뭉쳐서 옮겨가자고요. 오죽하면 아예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 없는 연희동으로 가자는 말도 하죠. 실제로 연희동 재래시장에 조합을 만들어 들어가는 것을 논의하고 있고요, 2주 전에는 잔다리길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출판동네발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골목 문화를 지속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이렇게 약한 경우, SNS의 발전은 오히려 골목 문화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골목 흥망성쇠의 속도를 그야말로 LTE급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요즘 뜨는 동네’를 부러 찾고, 작고 한적한 골목을 골라 띄운다. 빨리 부푼 길이 공고해지기는 쉽지 않다. 경리단길, 서촌, 한남동 같은 신흥 골목은 의도적으로 주류와 차별화되고 싶은 SNS 기반의 소비 세력이 상권 형성에 일조했다는 사실을 배제하기 힘들다.
오래도록 쌓아온 시간은 소중하다. 오래된 가게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는 풍요로운 골목으로 영글지 못한다. 김진한 대표 역시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동네 문화와 동네의 기억이 사라지는 걸 바라보고만 있어요. 돈이 시간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골목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 에디터
- 손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