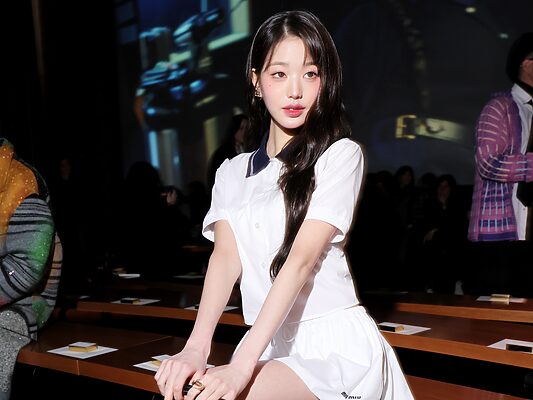예상이든 염원이든 재미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미신에 기대본다. 전근대적이라고 치부하기엔 꾸준하다. 미신엔 잘못이 없다.
10년 동안 음반 준비 중이라고 말하던 친구는 지금 닭을 튀긴다. 간혹 닭집에서 자작곡을 트는 것과 별개로 사업은 번창 중이다. 언젠가 압구정의 용하다는 도사님께 “소리가 나는 일을 한다”고 들었다며 너스레를 떨던 친구였다. 그 말은 거의 기도처럼 들렸다. 미신은 믿음이 관여하는 가상에 불과하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았다. “믿음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 현실은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외부 현실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다.(<프루스트와 지드에서의 사랑 이라는 환상>, 이성복)” 미신은 <용의자 X의 헌신>에서 사건의 열쇠가 되는 속임수인 “기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함수 문제”를 낸다. 미신은 진위가 아닌 해석의 문제다.
부적과 주문을 미신이라고 믿는 세대의 미신은 ‘테스트’다. 어제오늘의 유행이 아니지만 지겨워진 적도 없다. 뱀과 원숭이와 새를 어떻게 데려갈지 물었을 때 뱀(재물)은 버리고 간다고 대답했던 기억. 인터넷이 보급될 즈음 게시판을 휩쓴 ‘뇌 구조 테스트’는 예능 프로그램이 차용하기에 이르렀다. 요즘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테스트가 떠돈다. 친구가 ‘당신의 정신 연령은 몇 세입니까?’의 결과를 공유한 걸 보고 네가 스물여덟 살?, 되물은 건 당신만이 아니다.
정보화 사회의 중심이 모바일로 옮겨가자 짐짓 과학적으로 보이는 미신도 생겨났다.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해 관상을 보는 앱, 자신의 기분을 지문으로 판별해내는 앱, 타로카드처럼 고민을 떠올리고 구슬을 ‘터치’하거나 책을 ‘슬라이드’하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앱. 물론 이런 유형의 테스트들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사실조차도 해석의 결과라는 점을 간과할 뿐이다. 뇌과학자 김대식은 시인과 달리 주체를 ‘뇌’로 바꿔 같은 말을 한다.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계가 절대 아니다. 뇌는 단지 감지되는 감각 센서의 정보를 기반으로 최대한 자신의 경험과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해석들을 만들어낼 뿐이다.(<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가장 최근에 유행한 테스트로 ‘당신의 잠재의식 속 국적은 무엇인가요?’가 있다. 칠레가 나온 한 친구는 칠레에서 대학 무상 교육이 실시된다는 뉴스를 보고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일본이 나올 거라고 짐작했던 한 친구는 독일이 나오자 ‘한국은 동양의 이탈리아고, 일본은 동양의 독일’이라는 서양인의 통념을 말했다. 결과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었다면 넬슨 만델라라도 들먹였을지 모르겠다. 닭집 사장은 말했다. “차라리 믿었으면 나았을지 몰라. 내가 궁색할 때만 그 말을 생각했거든.”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신이 득세하지만, 미신은 차라리 일상적이다. 미신을 대하는 태도가 삶에 대한 자세를 보여준다고 여겨질 만큼. 이를테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여행을 가면 ‘힐링’된다고 믿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자신이 ‘힐링’하려는 게 대체 뭔지 해석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건 잘못일 수 있다. 미신은 두 번째 걸음을 필요로 한다. 스스로 해석하지 않은 미신은 해석된다. 닭 튀기는 소리도 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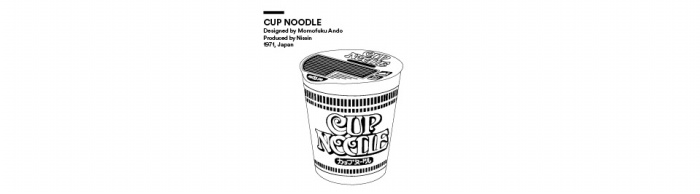
최신기사
- 에디터
- 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