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몰트위스키 바의 문턱이 낮아졌다. 그러는 사이 바의 불청객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바를 찾는 게 새로 생긴 펍을 찾는 것처럼 유쾌하고 신나는 일이 됐다. 하지만 급격하게 일어난 변화라서, 아직은 좀 생소한 문화라서, 바텐더와 손님 사이에는 종종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 서로의 신경을 긁다가 결국엔 터져버리는 날도 있다. 어디서 어떻게 꼬인 밤이었을까?
레스토랑이건 백화점이건, 어디에나 ‘추태손님’은 있다. 다른 장소에서 몇 번 추태를 부린 손님이라면, 바에서 부릴 수 있는 추태도 다양하다. 취해서 소리 지르고, 같이 온 손님과 싸우다 옆자리 손님과도 싸우고, 잔을 깨고, 술값이 비싸다며 깎아달라고 하고, 함께 온 이성 손님과 눅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술 한 잔을 시켜놓고 클럽의 피크 시간이 될 때까지 3시간을 그냥 앉아 있고, 뜬금없이 외상을 요구하고…. 명백한 손님의 실수이자 예상 가능한 ‘갑과 을’ 싸움이다. 이런 손님은 의외로 해결이 쉽다. 하지만 바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된 손님의 실수와 고집은 해결하기가 영 까다롭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말풍선 속에 넣어 유형을 나누어보았다.
“이 칵테일 맛이 이게 아닌데…. 이거 보드카가 5밀리리터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외국에선 이 맛이 아니었는데요?” 자신의 취향을 ‘표준’이라고 단단히 착각하는 경우다. 어느 정도 바를 다녀봤다고 생각하는 손님이 바의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때 저지르는 실수다.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의 중심은 바텐더’라는 사실이다. 칵테일도 당연히 바텐더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똑같은 마티니라도 바텐더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진과 베르무트의 조합을 만든다. 표준으로 정해진 레시피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외국의 레시피가 정답인 것도 아니다. 요리사가 만든 요리를 두고 “이거 간장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손님이 있을 까? 게다가 위의 사례는 자신의 미각을 맹신하는 오만한 실수까지 보탠 경우다. 게다가 요즘엔 다른 바에선 볼 수도 없었던 그 바텐더만의 창작 칵테일이 인기다.
“여기 왜 자릿세를 받아요? 세 잔 마셨으니까 이거 빼주시면 안 돼요?” 싱글 몰트위스키 바가 한창 생겨나던 초창기에 사람들이 흔히 묻던 말이다. 커버차지를 받은 바들은 나름의 규정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설명하면 손님들은 대체로 수긍했다. 이제는 커버차지가 바 문화로 자리 잡아 실랑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위의 말처럼 많이 주문했으니 커버차지를 깎아달라는 손님은 아직도 종종 있다. 커버차지는 바의 서비스(작은 안줏거리, 생수, 슈샤인 서비스, 공연 등)에 상응하는 일종의 팁이다.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 바에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다.
“여기서 ‘알바’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바텐더 들의 나이는 외국에 비하면 어린 편이다. 바 문화가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일 테다. 일본처럼 ‘마스터’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 든 바텐더는 찾아보기 힘들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가 가장 흔하다. 그래서 바를 찾는 손님들이 바텐더보다 연배가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런 손님들 중 일부는 바텐더들의 나이를 직 접적으로 묻거나, ‘알바’라고 오해하거나, 무턱대고 반말을 한다. 실제로 바텐더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손님들이 반말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한다. “내가 너보다 술을 훨씬 더 많이 마셔봤다”는 식의 말도 서슴지 않는다. 나이부터 까고 위아래 순서부터 매기는 못된 습관이 바에서도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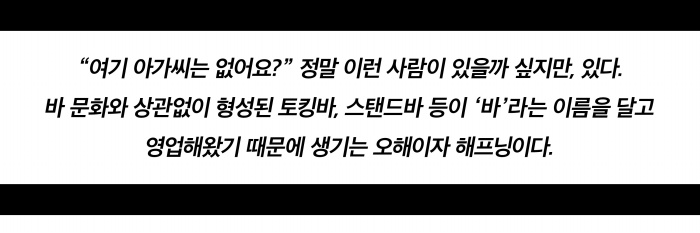
“저기 뒤에 있는 저 술 처음 보는 건데, 살짝 맛만 볼 수 있어요?” 잔술을 판매하는 바에서 이런 요구는 좀 무리다. 물론 바텐더의 재량에 따라 손님에게 테이스팅을 제안할 때도 있다. 단골에게 신제품의 시음을 권할 때도 있고, 어떤 술을 마실지 고민하는 손님에게 몇 가지 위스키를 맛보게 한 뒤 선택에 도움을 줄 때도 있다. 하지만 손님이 먼저, 그저 궁금해서, 잔에 술을 조금 따라달라고 하는 건 식당에서 공짜로 음식을 조금 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잔은 이만한데, 술은 왜 요거밖에 안 따라주는 거예요?” 요즘 바에서는 위스키를 서브할 때 샷잔을 잘 쓰지 않는다. 대신 입구가 좁고 아래로 갈수록 둥글게 퍼지는 글랜캐런 잔을 많이 쓴다. 샷 잔보다 두세 배는 큰 잔이다. 여기에 그 바에서 정한 한 잔(주로 30밀리리터)을 채우면 잔의 발목까지밖에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정황을 안다면 바텐더가 술을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바텐더가 술을 따를 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라고 하는 건 차라리 애교로 넘어갈 수 있다. 술 양이 적다며 바텐더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경우엔, 메뉴판에 적힌 한 잔의 용량과 지거(술의 양을 잴 때 쓰는 칵테일 도구)의 용량을 정확히 인지시켜주는 것밖엔 답이 없다.
“병에 술이 거의 없네. 새 병 뜯어서 따라주세요.” 역시 잔술을 판매하는 바에서 손님이 흔히 하는 실수다. 병에 술이 조금 남았을 때, 새 병을 뜯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괜찮다. 품질이 낮은 위스키의 경우, 뚜껑을 딴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맛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반면 고가의 위스키 중엔 뚜껑을 따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맛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도 있다. 그러니 새 병을 요구할 때는 그 병을 언제 땄는지 먼저 묻고, 혹시 맛 변화가 있는 술 인지 확인한 뒤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말하는 게 맞다. 무턱대고 새 병을 열어달라고 하면 바텐더도 난감하다.
“그 위스키 새로 나온 건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정보가 느려서 되나….” 최근 술 동호회나 위스키 동호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저지르는 실수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앞세워 바텐더에게 이것 저것 요구하는 경우다. 그들이 인터넷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접하는 소식이 보통 서울 시내 바에 ‘유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 유통회사의 사정으로 물량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아예 물량이 수입되지 않을 때도 있다. 더 나아가 바가 해당 술을 비치하지 않기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바는 세상의 모든 술을 구비하는 곳이 아니다. 바텐더 혹은 오너가 바콘셉트에 맞게, 혹은 주 고객층에 맞게 리스트를 작성한다. 장사도 되어야 하고 재고도 남지 않아야 한다. 손님이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만 가지고 바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기 전에 장사 하는 사람들의 복잡한 사정들도 고려해볼 필요 가 있다. 꼭 마셔야 하는 술이라면 그 술을 구비한 곳을 찾아보고 가는 게 맞다.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해요. 술 마시다 졸겠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나라의 바 문화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바에는 저마다의 캐릭터가 있다. 식당에도 분식점이 있고, 비스트로가 있고, 파인다이닝이 있는 것처럼 바도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다. 외관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갖춘 술부터 규율까지, 스타일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어떤 바는 노래를 크게 트는 라운지 바이고, 어떤 바는 조용하게 술을 따르는 클래식 바다. 바가 가진 고유한 색깔을 손님이 인식하지 못한 다면, 엉뚱한 바에 가서 “음악 좀 줄여주세요”, “음악 좀 틀어주세요”라는 실수를 하고 만다. 아직까지 서울엔 바의 캐릭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체나 통로가 잘 없다. 바 스타일을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되면 손님과의 교류 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여기 아가씨는 없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생기는 해프닝이다. 그동안 토킹바, 스탠드바, 착석바 등 바 문화와 상관없는 공간들이 ‘바’라는 이름을 달고 왕성하게 영업해왔다. 바 자체를 오해하는 손님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손님과 바텐더가 서로를 답답해하는 이런 상황들은 바 문화가 성숙하면서 조금씩 사그라질 것이다. 한국칵테일위크의 유용석 대표는 바라는 공간 자체의 특이성을 손님과 바텐더가 모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바는 지친 하루를 위로받기 위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손님을 응대하는 바텐더의 업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텐더들이 조금 더 각오하고 인내할 필요도 있어요. 손님이 이런 바텐더의 노력을 헤아리면 더할 나위 없겠죠.”

최신기사
- 에디터
- 손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