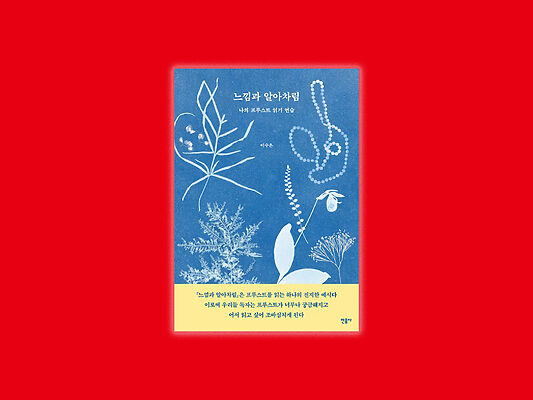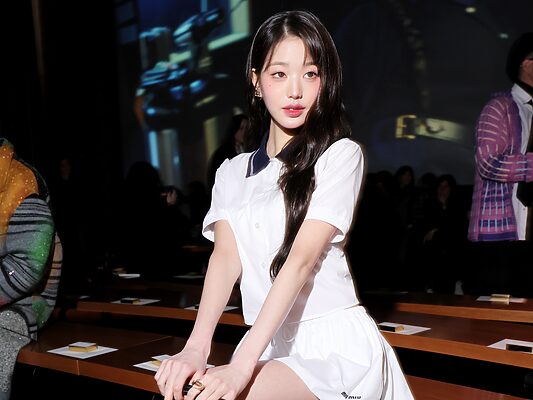슈테판 마르크스는 전시를 위한 드로잉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디뮤지엄 벽에 직접 드로잉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디뮤지엄 벽에 드로잉했다. 캔버스가 아닌 벽에 새로 그려낸 이유는 뭔가? 방 하나를 작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전시를 해보고 싶었다. 전시실 4면 벽과 바닥, 달라지는 색까지 포괄하는 작업이었다. <Sundaayyyssss>의 드로잉을 벽에 그려 ‘일요일을 그려주지’라는 제목을 붙였다. 거대한 ‘선데이룸’이 된 셈이다.
전시가 끝나면 지워질 텐데 아깝진 않나? 전혀. 예술은 감상하는 순간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관람객의 경험과 기억으로 의미를 가질 거다.
언제 그림이 그리고 싶어지나?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뭔가를 그린다. 스튜디오에만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기록한다. 작업실에 앉아 그리는 시간뿐 아니라, 이렇게 소재와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과정도 드로잉의 연장이다. 내 드로잉이 쉬워 보여도 쉽지 않다. 하하.
이번 전시의 주인공인 ‘선데이독’은 어떻게 탄생했나? 일요일의 풍경을 매주 일요일마다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젠더가 없는 강아지라 남녀 모두 공감해줬다.
한국에 입국해서는 귀여운 초고추장 통을 그렸던데? 식당에서 봤는데, 여닫는 뚜껑이 꼭 모자 같아 유머러스하게 그렸다. 하하. 물건을 살아 있는 것처럼 캐릭터화시키는 걸 좋아한다. 나는 새로운 것들을 볼 때마다 드로잉 노트를 꺼낸다.
당신의 드로잉과 타이포그래피엔 장난스럽고 유머러스한 에너지가 가득하다. 세상을 보는 당신만의 방식이 있나? 뭔가를 볼 때, 그것이 가진 특징들에 주목해 캐릭터를 끄집어낸다. 그리고 그게 살아 움직인다면 어떨까 상상한다. 이를테면 이 물병을 툭 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즐겁다. 나 혼자 즐기는 게임이다. 이런 상상으로 드로잉을 하다 보니,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다.
작가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할까? 나는 아티스트의 자세, 태도, 가치 정치적 의견까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디어를 자기 작품에 녹여내 발표함으로써 세상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에선 북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우익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끔찍한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에 반대하기 위해 나치 심벌을 부수는 주먹을 그려 티셔츠로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좋아했고, 독일 배우들이 입기도 했다. 판매 수익은 전부 반전체주의 단체에 기부했다.
어떤 형식으로 어디라도 그린다. 캔버스뿐 아니라 의류, 세라믹, 설치, 조각 등 형식이 다양하다. 베를린 왕립 자기 제조소와 세라믹 제품을 만들고, 지난해엔 꼼 데 가르송 봄 컬렉션을 협업하기도 했다. 갤러리의 캔버스에 그리면 소수의 사람만 볼 수 있지만, 세라믹과 패브릭에 그리면 입체적으로 드로잉을 볼 수 있고,
직접 쓰고 만질 수도 있다. 티셔츠에 드로잉을 그리면 입은 사람과 여행하는 셈이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내 드로잉을 보고 즐길 수 있다. 하나의 문장으로 타이포그래피를 할 때가 많다. 서울에 온 기분을 하나의 문장으로 타이포그래피를 만든다면? 한글로 타이포그래피를 해보고 싶다. 한글은 동그라미, 각 잡힌 선들로 구성돼 모던하고 그래피컬한 멋진 글자다. 고딕체로 쓰면 더 근사하다. 이런 단어들로 하고 싶다. 추운 날씨, 핫 소스, 뜨거운 심장!
최신기사
- 에디터
- 이예지
- 포토그래퍼
-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