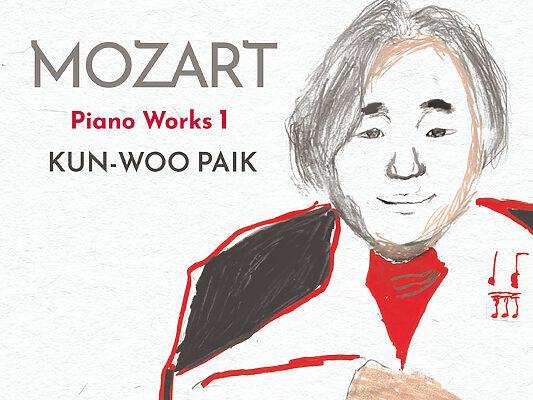정유미는 소녀였다. <차우>에서 맷돼지를 잡을 땐 선머슴아 같았다. “알았어요, 한 번 해 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 저런 눈빛을 하고.

재킷은 나인식스 뉴욕, 검은 레이스 속옷은 에고이스트 이너웨어, 가죽 레깅스는 에스티 에이, 검정 귀고리는 엠쥬.
촬영을 마치고 마주 앉았다. 정유미는 책상에 쌓인 인터뷰 자료들을 들어 읽었다. 기사엔 정유미가 ‘잘 팔리는 이미지’라고 써 있었다. “나, 잘 팔리는 이미지였어!” 이렇게 말하곤, 금세 웃었다. 짙었던 화장은 조금만 남아 있었다. 당신이 어떤 여자인 것 같냐고 물었을 땐 “여자가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매니저에게 개구지게 물었다. “그렇죠, 재웅군?”하고.
잘 팔리는 이미지였네요. 어때요, 옛날에 했던 말들은? 내가 한 말이라고도, 안 한 말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말들은 진짜 내 말처럼 보이는데, 내말은 마지막 한 줄뿐이고 그 위에 살을 붙여놓은 기사도 많았어요. 나쁜 말은 아니었지만. 이런 문답식 인터뷰가 더 억울한 거 있죠?
진짜 당신이 한 말 같으니까? 더 ‘진짜’ 같으니까요.
오늘 촬영은 어땠어요? 하하, 뒷감당이 좀 걱정되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대중에겐 아직 정유미라는 배우가 익숙진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잘했다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사진에 익숙지가 않아요. 항상 이런 거 하면, 다 미안해. 사진을 잘 못 찍으니까.
스틸 카메라 앞에선 어색한 거죠? 오늘은 오히려 편했어요. 콘셉트가 있었으니까. ‘그냥 나’를 드러내기 꺼려지는 마음도 조금은 있어요. 선입견이 생길까 봐. 인터뷰보단 배역으로 인사하는 게 먼저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보단 조금 더 열렸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안 해, 안 해, 못해”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잘하면 좋잖아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일도 계속할 거고. 전엔 ‘내가 지금 이런 걸 할 때인가? 연기도 잘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의 닫힘이 있었어요.
언제 열렸어요? <차우> 이후? 그렇죠. <차우> 하면서 본격적으로 홍보 인터뷰나 화보 촬영이 있었으니까. 그전엔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였어요.
당신이 동선을 자꾸 벗어나서, 통제가 힘들다는 감독님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던 사진 기자분도 있었어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말까지 그렇게 하시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뜨는 제 사진들 다 되게 힘들게 나온 거예요.
당신이 어떤 여자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팜므 파탈이었잖아요. 저 남자를 내가 후리겠다는. 하하, 알려주시지. “후리겠다”는 눈빛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어떤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마지막 남자 친구는 당신을 어떻게 봐줬는지를 생각해보면? 연애라는 걸 딱 한번 해봤는데요, 나한테 멘토라고 그랬어요. “넌 나의 멘토”라고.
무슨 뜻이죠? “그래?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냥 그랬죠. 예전에, 사귈 때 한 얘기예요.
다가왔던 남자들은 없었어요? 다들, 별말 없더라고요.
다리가 예뻐요, 목선이 살인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말예요. 그냥 “너, 참…”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아, 눈이 너무 예쁘다는 말 들었어요. <10억>에서 이민기 씨가.
너, 참? 그냥, 뭐라고 말은 못하고. “넌 참…”하는 느낌으로. 특별히 남자들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좀 열어보래요. 저한테 다가오기가 힘든가봐요. 닫힌 사람은 아닌데. 제가 어떤 여자인 것 같아요? 작품으로만 날 봤던 사람들, 특히<사랑니>를 보신 분들은 제가 진짜 예민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억지로 웃거나 하지는않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즐겁고 좋거든요? 근데, 웃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어, 이런 스타일이에요?”하고. 저, 원래 이래요. 진짜 좋아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남자를 “괜찮다”고 생각해요? 편견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자세가 좋은 사람, 바른 사람. 여자건 남자건 편견 없는 사람이 좋아요. 편견이 있으면 불편해.
배우는, 지속적으로 당신을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죠. 진실이든 아니든, 자신이든 배역이든. 그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멀어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직 개봉하진 않았어요. 그 영화를 기다리고 촬영하는 시간은 내 삶과 다르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하는 대사와 느낌들. 그걸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가까웠다는 거죠? 당신과 배역이. 그 여자애가 되려고 자제했던 게 많았어요. 간접 경험도 싫었어요. 왜냐면 그건 온전히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할 거니까.
역할에 몰입하려고 일상을 자제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너무 좋았는데, 말은 못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 캐릭터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여자였거든요. 지금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캐릭터가 사랑했던 대상과 내 대상은 분명히 달랐지만, 그래도 말을 못했어요.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느낌이 깨지니까? 실제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이 캐릭터 안에서 깨져버리잖아요. 그 남자가 “오케이, 나도 네가 좋아” 그러면 그때부턴 되게 행복한 여자가 되는 건데, 이 캐릭터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거절당해도 그렇죠. 영화 속에선 기다려야 하는 여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대답을 이미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마냥 기다렸어요. 양쪽 다 캐릭터에 방해가 되니까요.
매번 그러지는 않죠? 작품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긴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차우>와 <10억>은 또 달랐죠? <차우> 촬영장에서, 전 이미 수련이었어요. 다 그렇게 대해주니까, 저도 그렇게 행동해요. <10억>에서 나는 김지은이라는 연약한 캐릭터인데, 그럼 사람들도 다 그렇게 봐 줘요. 촬영 스태프들은 이미 그 영화로 머리가 가득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기운들이 있어요. 아직은, 정말 모르겠어요. 뭔가 배역에 맞춰 변신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뭔가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차우>에서 백 포수 아저씨랑 빵이랑 팩소주 먹으면서 마주 보고 웃던 그런 기운? 대본엔 없었던 장면이죠? 즉흥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으니까 또 재미있어요. 우리만 통했던 게 아니라는 걸 느꼈죠. 근데 저는 아직, 제 영화를 봐도 항상 현장 생각밖에 안 나요.
온전히 관객이 될 순 없는 걸까? 직후에는 온전히 못 봐요. 몇 년 후엔 가능할까? 괴롭고, 아쉽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좋지 아니한가> 찍고 나선 막 후회했어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좋지 아니한가>에서는 뭐가 아쉬웠어요? 제가 연기를 대하는 방법은 진짜 단순하고 무식해요.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캐릭터만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좋지아니한가> 할 때 괴로웠던 건, 그 캐릭터가 되게 어둡고 힘든 애잖아요? 근데 현장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스태프들도 다 젊고, 피디님도 여자였고, 배우들도 너무 좋고 화기애애했어요. 근데 내 캐릭터는 어두운 애니까. 안에선 계속 ‘내가 이렇게 즐거우면 안되는데, 이렇게 어둡고 힘든 캐릭터인데 지금 여기서 웃고 떠들어도 될까’ 생각했던 거죠.
당신의 이런 말들과 ‘4차원’ ‘엉뚱함’처럼 당신을 수식하는 말들이 연결이 안 되네요. 엉뚱함의 기준은 뭘까요? 신경 안 써요. 그냥 친구들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솔직히 별로 특이할 게 없는데, 뭐만 하면 그걸 쉽게 ‘4차원’ 같은 식으로 말하기를 좋아하시잖아요.
‘독립영화의 아이콘’이기도 했죠? ‘네가 인디 영화계의 꽃이라며?’ 누가 또 그러는 거예요. ‘꽃은 좋지만 뭐 한 게 없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독립영화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쭉 적어봤어요. 왜냐면,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독립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저한테는 <폴라로이드 작동법>밖에 없어요. <가족의 탄생> <사랑니><좋지 아니한가> 세 작품이 있었는데, 다 상업영화예요. 흥행이 안 돼서 그렇지, 하하. 다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살짝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를 해야 하나?’ 생각했죠.
오히려? 독립영화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아무거나 막 안찍었어요. 독립영화, 단편영화를 많이 찍긴 했지만 비슷비슷해서 하기 싫은 건 안 했어요. 거의 마지막에 찍은 게 <폴라로이드 작동법>이었죠. 그게 잘돼서 데뷔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그렇게 불리는 건 민망했어요.
당신과 작업했던 사람들은 그 캐릭터가 곧 정유미라고 말했어요. <가족의 탄생>에서 다 퍼줄 것 같은 여자애로 나왔을 때도. 그분들에겐 제가 이미 그 캐릭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그렇게만 나를 본 게 다니까. 친구들은 작품마다 ‘저거 너야, 저거 너야’ 그래요.
하하. 그건 좀 무섭네요. 처음부터 캐릭터가 곧 나였던 적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말이 되게끔 해야 하잖아요. 내가 선택했고, 또 나를 선택해준 이상은. 그게 자연스럽게 섞이다 보니까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신기사
- 에디터
- 정우성
- 포토그래퍼
- 김종민
- 모델
- 정유미
- 스탭
- 스타일리스트/김봉법, 헤어/권호숙, 메이크업/권호숙
- 브랜드
- 나인식스 뉴욕, 에고이스트, 에스티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