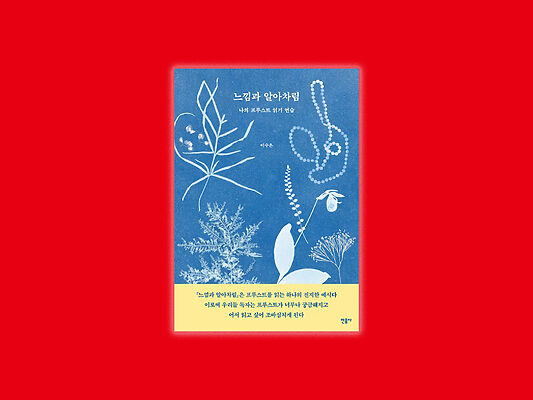하이엔드 패션, 스케이트보드, 인스타그램, 90년대, 배트멍, 비스포크, 도널드 트럼프, 레플리카 청바지, 케이팝…. 지금 이곳의 스트리트 패션을 얘기하면서 박세진의 시각은 세계를 종횡무진한다. 온통 뒤섞인 채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요즘이 꼭 그렇듯이.
옷을, 하이엔드 패션과 평범한 이들이 직업적 목적 혹은 적당한 멋을 부리기 위해 입는 것으로 양분해서 본다면, 현대 패션의 역사는 평범한 이들의 옷이 파리와 밀라노의 캣워크에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십 년 전쯤, 데님으로 만든 턱시도 같은 에둘러 말하기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후드와 찢어진 티셔츠까지 모두 캣워크 위에 있다. 그런 만큼 평상복이란 한때는 그저 옷이었지만, 이제는 패션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류가 되었다.
일상복의 패션화는 스트리트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대략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서핑, 스케이트보드, 마약상, 갱단 등 거리의 문화 그리고 이와 연결된 힙합, 네오 고딕 등 진짜 거리에서 시작되어 거리를 따라 올라온 종류다. 이쪽은 힙합 컬처가 제대로 만개하고 패셔너블함, 웰메이드와 희소성 등이 결합하면서 트렌디한 패션의 최첨단이 되었다.
여기에는 칸예 웨스트, 퍼렐 윌리엄스 그리고 후드 바이 에어의 게토 고딕이나 젠더리스, 본격적인 디자이너 컬렉션인 지방시와 겐조, 베트멍과 팰리스 스케이트보드 등등 수많은 이름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입고 있다는 고도의 트렌디함과 어디서 저걸 구했지, 라는 ‘레어템’의 확보는 오랜 시절 동안 남성 스트리트 패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더 실시간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19세기 초 의류 제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빈티지 스타일 메이킹이 있다. 일본의 레플리카 제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비스포크와 테일러드는 격식이 있는 고급 남성복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청바지도 소규모 업장에서 핸드 크래프트로 만드는 제품을 찾을 수 있고 원단, 버튼, 실 등등 세세한 부분까지 따지고 들어간다. 이건 스웨트 숍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와 겹치면서 잘 골라서 오래 입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리지드 데님 상태에서 시작해 페이딩에서 삶의 흔적을 찾는 개인화는 옷뿐만 아니라 구두, 가방 등등 노화를 즐길 수 있는 다른 부분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 이런 것들이 일단은 모두 한국에 들어와 있다. 혹시 브랜드는 직접 진출하지 않다 해도 해외 직구의 발달로 별로 문제가 될 게 없고 정보도 넘쳐난다. H&M과 겐조의 콜라보 출시나 나이키의 신모델 출시에 맞춰 길게 줄을 서고 혹은 밤을 지새우기도 하는 국제급 이벤트도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다. 인터넷, 연예인이 입은 것, 가서 본 것, 어떤 멀티숍에서 들여놓은 것 등이 우후죽순으로 가시화되고 그것들이 통으로 혹은 부분부분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같은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16년에는 80년대와 90년대라는 가까운 과거가 유행했는데, 이런 측면을 꽤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회고의 대상은 <비버리힐즈의 아이들>이나 <클루리스>로 발랄하고 건강한 특유의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토미 힐피거와 지지 하디드의 컬렉션에서 현대적 아이템과 결합해 새로운 ‘뷰’를 보여줬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게스 홈페이지 맨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은 모델 헤일리 볼드윈의 섹시한 화보들이었다. 게스라고 하면 역시 전통의 이미지는 ‘게스 걸’이고 모델 안나 니콜 스미스나 클라우디아 시퍼 등이 한 시절을 풍미했었다. 일본에서는 쇼와 붐 같은 레트로 문화 유행이 이미 지나간 후라서 그런지 이런 기존의 이미지를 전면에 세웠다.
한국의 경우, 양상은 비슷해도 이들과는 다른 자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지금 80년대와 90년대를 회고한다면 그건 <건축학 개론>과 ‘응답하라’ 시리즈다. 멀지 않은 과거는 드라마와 합쳐져 소박하고 정겨운 이미지로 재구성되었고, 그 주역 중 하나인 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스카잔과 프린트 데님 트러커, 후드, 밝게 페이딩되거나 살짝 뜯기거나 밑단을 엉성하게 잘라낸 청바지 등을 입고 빛바랜 사진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패션처럼 개인적인 일을 자꾸 “국민 첫사랑”이니 “국민 청바지”니 하는 말로 몰고 가는 건 아쉽지만 그런 게 또 여기만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어쨌든 이걸 보면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에 시작된 유행, 구체적으로는 원색의 나일론 아우터나 자수나 그림이 그려진 데님 등의 아이템도 받아들이는 방식과 소비되는 방식, 동반되는 이미지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같은 부분은 다들 각자의 30여 년 전을 끄집어낸다는 점뿐이다.
이렇게 새로운 맥락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글로벌 트렌드의 국내 유입은 단품 위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빈티지 메이킹 청바지나 레드 윙 부츠, 데님 재킷 같은 워크웨어를 비롯해 퍼티그 팬츠나 MA-1 같은 밀리터리 웨어, 올해 겨울에 부쩍 많이 보이는 첼시 부츠 등등이 글로벌 트렌드와 비슷하게 가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는 해도 어디까지나 아이템 위주고, 어떤 완성된 문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입던 것 위에 하나 더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나오는 실수 중 하나가 그 안에 어떤 함의가 담겨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부 연합기를 달고 인종주의자가 되어 있다든지, 욱일기나 네오나치의 표식을 달고 파시스트가 되어버리는 일이다. 현대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 중 하나가 적어도 인류의 존엄성에 견주어 봤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걸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건 그저 몰랐다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런 일은 아무래도 어떠한 트렌드가 나타나게 된 배경까지 수용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특히 스트리트 패션은 애초에 디자이너의 제시보다는 거리에서 자생한 거고, 그러므로 특정 문화나 성 지향을 중심으로 한 서브컬처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 소비자의 입장에서 적어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유입된 문화이기 때문에 교조주의적 성향을 보이기 쉽다. 즉, 매뉴얼 중심으로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것”들의 리스트가 늘어난다. 여기에는 스펙이 패션이 되는 남성 패션(혹은 전자제품, 자동차 등등) 특유의 성격이 담겨 있다. 자동차나 시계에서 더 나은 성능이나 더 정교한 제조 방식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하듯 제조 방식, 기계, 지역이라는 스펙 그 자체가 패션이 되어버린다.
자기 나라에서 발전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하우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 일본에 아이비리그 패션이 들어왔을 때 잡지를 중심으로 매우 세밀한 적용 방식이 제시되었고 미유키 족들은 그걸 교과서처럼 신봉했다. 일본에서 발흥한 레플리카 청바지가 미국에 유입된 2000년 초반에도 인터넷 포럼 등을 중심으로 뭐가 더 멋지다가 아니라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를 논쟁했다. 여기에서도 영국 수트나 나폴리의 구두, 셀비지 청바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양상은 비슷했다. 그리고 이런 건 계속 반복된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주로 입는 이상하게 품이 크고 이상하게 긴 넥타이에서 볼 수 있듯이 포멀한 복식과 관련한 교과서가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패션 생활이 옷에 점수를 매기면서 줄이나 세우는 하급의 취미 활동에 머무르기 쉽고, 미지를 탐험하며 새로운 걸 발견하는 눈이 제한된다.
스트리트 패션의 스트리트는 우리의 거리가 아니기도 하고 맞기도 하다.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써먹는 건 여기의 방식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새로움도 바로 이런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위에서 말한 드라마 – 게스와 비슷할 텐데 좀 더 일반화된 모습은 케이팝에서 볼 수 있다.
케이팝은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과 마찬가지로 딱히 근본이나 연원 없이 유행하는 새로운 것들을 마구 받아들이고 그걸 한꺼번에 뭉쳐 새로운 ‘뷰’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이 신은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모든 걸 섞어내고 있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뷰의 충격이 꽤나 크다.
사실 유행하는 스트리트 패션의 모습은 패션 위크의 캣워크보다 지드래곤이나 지코의 뮤직비디오가 더 큰 게 사실이다. 이건 여기만의 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칸예 웨스트와 리한나, 비욘세 같은 팝 스타 패션 아이콘이 주도하고 있다. 결국 2017년에 나올 새로운 스트리트 패션도 연예인과 연예 기획사의 아트 디렉터나 스타일리스트가 뭘 선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엔터테인먼트 업계뿐 아니라 패션 업계와 다른 라이벌들이 저 멀리 치고 나가고 있는 케이팝과 주도권 다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추키며 더욱 아낌없는 찬사나 맹렬한 비판을 보내는 거다. 이런 경쟁 속에서 브랜드들은 살 길을 찾으며 자기만의 세계를 더 튼튼하게 구축하게 될 테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파편이 패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 근사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최신기사
- 에디터
- GQ 피처팀
- 글
- 박세진('패션 vs 패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