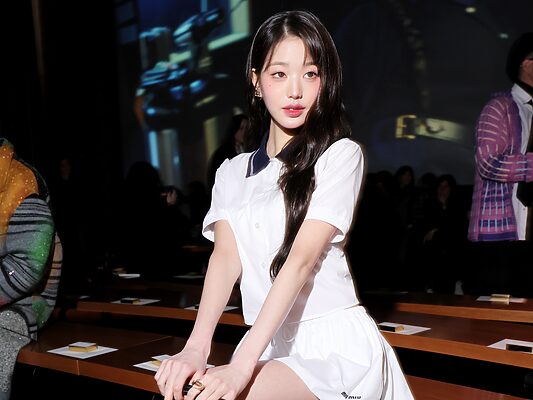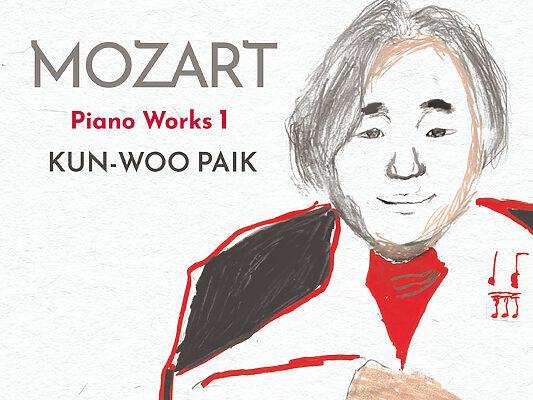창원에서 나고 자라, 제주에서 결혼해 살다가, 지금은 죽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남자.
“우리가 또 제주에 올까?” 제주를 떠나기 2주 전 늦은 오후, 빌린 자동차 안에서 아내에게 물었다. 연동 롯데시티호텔 앞 도로는 주말이라 꽤 막혔고, 하늘은 레드향 빛깔로 물들어 있었던 기억이 난다. 꼭 이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떠나기 한두 달 전부터 가끔 이 질문을 내뱉곤 했다. 답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건 서로 잘 알고 있었다. 한동안 관광객 입장으로 올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과 언젠가는 관광객으로라도 한 번은 와야 할 거라는 의무감에 대한 확인이었을 뿐. 그리고 가진 돈이 크게 늘지 않는 한 다시 제주 거주자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체념도 조금은 섞여 있었다. 분명한 건, 5년 전 서울 연남동과 청담동을 각자 떠날 때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학에 가기 위해 혼자 고향 창원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질문은 오직 제주를 떠나기 전에만 자주 튀어나왔다.
“우리가 제주에서 살고 있다니!” 제주에서 5년을 살았다. 그동안 제주에 대해 서로 가장 자주 했던 말이다. 역시 감탄의 의미만은 아니었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올 때 빼고는 제주에서 살고 있다는 자각을 거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던 곳은 제주시 노형동이었다. 아파트 단지와 학원이 빼곡하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있고 조금 더 걸어가면 식당가와 유흥가가 빼곡한, 한국 여느 신도시와 다를 바 없는 곳. 가끔 주말에 자동차를 빌려 바닷가라도 가지 않으면 제주에서 산다는 걸 잊곤 했다. 주민등록상 제주 도민이었지만 행적적으로라도 그걸 깨닫는 건 가끔 서울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며 도민 할인을 선택할 때 정도였다. 혹은 서울에서 돌아와 첫 공기를 마신 후거나. 제주시에 사는 건 제주에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귀포에 살았다면 제주 느낌이 났을까, 제주에 살면서도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새 제주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제주에서 사는 건 어때요?” 서울 사람들은 자주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똑같아요. 서핑이나 승마 같은 걸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내가 답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뭘 기대하는지 알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족을 꼭 달았다. “에이 설마, 그래도 좀 다른 게 있겠죠”, “음, 확실히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같은 정보값 없는 대화. 가끔은 잦은 미안함이 못된 마음으로 바뀌기도 했다. “현지인이 많이 가는 식당 좀 소개해주세요”, “집 부근에 있는 빕스요. 장담하는데 거긴 현지인들밖에 안 가요”, “이번에 제주시 쪽에 가는데 어느 호텔이 좋아요?”, “저 제주시에 있는 호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무슨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동네 호텔에서 자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5년을 살면서도 관광객보다 제주를 모를 때도 많았다. “한라산에 아직도 안 가봤다고요? 제주 한 번 간 저도 가봤는데?” 서울에 살면서 북한산에 한 번도 안 가본 게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나에겐 자연스러웠다.
제주는 서울 사람들이 유일하게 궁금해하는 서울 외 지역 같았다. 예를 들어 고향인 창원에 대해 궁금해하는 서울 사람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고향은 창원입니다”라고 하면 100퍼센트에 가깝게 “아, 제 이모가 거기 살아서 몇 번 가봤는데”라는 종류의 대답이 돌아온다. 이모가 아니면 고모나 삼촌이나 친구나 예전에 만났던 연인 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관계의 사람들이 창원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창원에서 사는 건 어때요?”라고 이제 와서 묻는다 해도 할 말은 없다. 그곳은 그냥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주에 가기 전까지 내가 알던 제주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 여덟 살 무렵에 살던 창원의 아파트 아래층에 살던 사람. 종종 제주에서 보내왔다며 귤을 줬고, 어머니는 진짜 제주 귤이라며 기뻐하셨다. “제주에서 온 사람이라서”라는 말에도 특별한 사람을 대하는 어감이 묻어 있었다. 어린 나에게 제주는 한국과 외국의 중간쯤 어딘가에 있었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관광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섬. 최근에는 도시를 떠난 ‘자유로운 영혼’들이 도시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섬. 창원에 사는 것처럼 제주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럴 거면 왜 제주에서 살아? 제주에 가서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걸 깨달았다. 제주를 떠날 때 까지도 나는 서울 사람이 기대하는 제주 사람이 되지 못했다. 가이드북과 블로그에 안 나오는 식당을 소개해줄 수 없는 제주 사람의 효용은 어느 정도일까?
반대로, 제주에서 나는 ‘육지 것’이면서 놀랍게도 서울 사람이었다. 정확하게는 서울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육지 것. “제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왔어요?” 제주에서는 고향이 어디냐가 첫 질문이 아니다. 제주에 온 첫 날 동료들은 물었다. “오늘 회사 끝나고 뭐 할 거예요?”, “백화점 가서 화장품 좀 사려고요.” 3초 후 폭소. “제주에 백화점 없어요.” 첫날부터 나는 뭘 모르는 서울 사람이었다. 홍대에 간 김에 폴앤폴리나에서 블랙 올리브빵을 샀다. 돌아와 함께 먹던 사람이 물었다. “이거 서울에서 사왔죠?”, “어떻게 알았어요?”, “서울 맛이 나서요.” 서울 맛이라니, 서울 사람들이 모두 웃을 만한 표현이다. 두 번째 집을 구할 때 만났던 부동산 중계인은 ‘복비’를 알아서 깎아주며 대신 의견을 좀 달라고 했다. 분명 고기국수는 맛있는 음식이고 관광객도 좋아하는데 왜 서울에서는 잘 안 되냐고. 서울에서 살았으면 잘 알지 않겠냐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질문이라 “이름이 너무 솔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돼지로 낸 국물을 낯설어하는 지역 사람도 많다는 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즉흥적으로 대답했다. 서울에 가서 고기국숫집을 하려는데 잘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부담스러워 대충 얼버무렸다. “저도 서울에서 10년밖에 안 살았어요.” 처음 느끼는 묘한 기분이었다. 평생 창원 사람이었던 나를 서울 사람처럼 대하다니. 열여덟 살에 지하철 타는 방법을 몰라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고 물었던 나에게 말이다. 하긴, 그때는 나도 거기 모든 사람을 서울 사람이라 생각했으니 10년이면 누군가에겐 서울 사람이고도 남으려나.
제주를 떠나 죽전에 온 지 1년 반이 됐다. 집 앞에는 제주시 노형동처럼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역시 조금 걸어나가면 품질 나쁜 식당가와 유흥가가 있다. “죽전에 사는 건 어때요?”라고 묻는다면 “공기가 안 좋은 것 빼면 제주와 별 차이 없어요”라고 말하겠지만, 아직 질문을 한 사람은 없다. 대신 여기선 “죽전 어때요?”라는 질문을 듣는다. 잠시 거쳐갈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다. 물론 나도 여러 번 했다. “런더너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요, 죽저너 어때요?” 평생 살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애착을 가지려 농담을 한다. 경기도 사람의 정체성은 뭘까도 생각한다. 하지만 주말에는 동네가 아니라 서울로 나간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죽전이 서울이라 생각 하지 않지만, 죽전에 사는 나는 중심부에서 조금 먼 서울에 살고 있다고 느낀다. 서울에 가까워진 만큼, 제주는 다시 먼 곳이 되었다.
‘그냥 살았던’ 나의 제주는 뭐였을까. 결혼식을 한 곳,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을 한 곳, 식물 키우는 재미를 알게 된 곳, 모두와 떨어져 둘이서만 지낼 수 있었던 곳. 특별하지만, 제주가 아니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심지어 한국이 아니라도 상관없겠다. 하지만 그때 제주에 살지 않았다면 저 중 하나라도 할 수 있었을지는 확신하기 힘들다. 좋아하던 곳도 많았다. 516 도로 중간쯤 하강이 시작되는 구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꼈을 때의 제주 마방 목지. 차 밖으로 나가기 힘들 정도로(그래서 안나가고 본다) 큰 파도가 칠 때의 월정리 지나 나오는 해안가 마을. 그 순간을 즐기러 여러 번 갔지만 그걸 보라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순 없었다. 10년간 홍대 부근을 떠돌며 살 때 좋아 하던 곳들을 홍대에 놀러 온 사람에게 소개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제주에 살 때는 홍대의 그곳들이 여전히 일상적인 장소처럼 떠올랐지만 지금 제주의 그곳들은 뭔가 특별한 장소가 됐다는 것이다.
서울로 돌아오면서 나는 다시 창원 사람이 됐다. 한국에서 어디 사람이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을 뜻한다는 걸 잘 안다. 유일하게 제주에 사는 동안만 세 지역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앞에 ‘제주에서 잠시 살다 온’ 같은 수식어가 붙을 수는 있겠다. 이제 누군가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지 않는 한 다시 제주 사람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첫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우리가 제주 관광객이 될 수 있을까?” 아직 관광객이 되어 제주에 가진 않았다.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제주에게 어떤 분류의 사람일까.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다. 고향과 여행지, 이제 막 다다른 곳과 언젠가 떠나온 곳, 잘 아는 동네와 두 번 다시 찾지 않은 고장. 우리는 거기서 겪은 시간으로부터 생각과 감정과 말들을 부려놓는다. 제주를, 송파를, 안동을, 충남을, 남원과 철원과 분당을… 여행자이자 관찰자이자 고향사람이자 외지인으로서 각각 들여다본다.
최신기사
- 에디터
- 글 / 문성원(회사원)
- 포토그래퍼
- 문성원